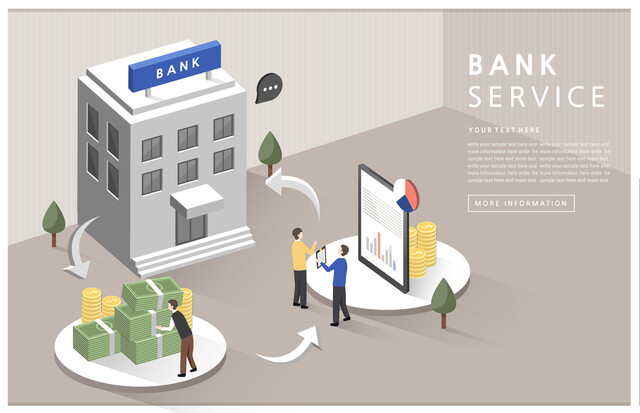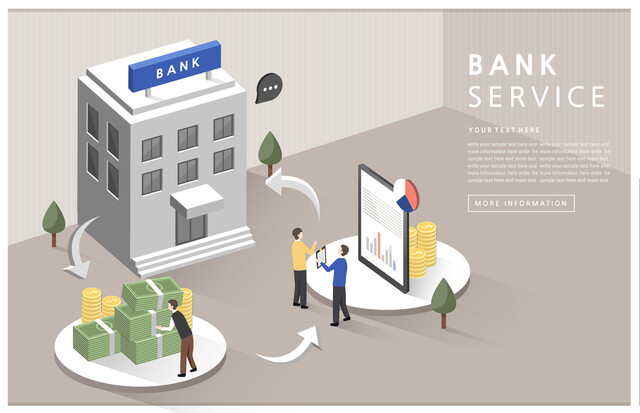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지역 공공은행 설립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지역 공공은행은 수익이 지역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지방재정에도 도움을 줄 여지가 있지만, 정치적 외풍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찬반이 팽팽하게 부딪치는 사안이다.
찬성하는 쪽은 지역 공공은행이 지방재정 독립을 촉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이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미국 노스다코타은행과 일본 도쿄도 공공은행이다. 노스다코타은행은 소유자가 주정부인데 1919년 설립 이후 지방 재정자금을 맡아 관리하고 대출 업무도 수행한다. 도쿄도는 기존 은행의 지점 한 곳을 인수해 공공은행을 설립한 경우다. 이상헌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연구원은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스다코타은행은 주의 세금과 수수료 등을 모두 예치하며, 주 정부에 일반 지방채 시장의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도 빌려줘 지역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했다.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은행 운영엔 전문성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전산 구축비, 직원 채용 등 초기 투자비가 만만치 않다”며 “지역 공공은행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경우 수익금의 사회적 재투자가 자치단체장 홍보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립 방식도 논쟁거리다. 인수위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 방안으로 광주시가 법인을 만들어 은행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 금고로 지정해 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여기엔 특정 기금 운영, 새마을금고 설립, 상호저축은행 설립 등 세 가지 방식이 포함되는데, 찬성 쪽 전문가들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는 것은 새마을금고 방식이다. 새마을금고 인가권자가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이다. 윤영선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대표(전남대 강사)는 “시가 출자한 새마을금고가 시의 재정을 예치해 관리하는 시 금고 역할을 하면서 국고채·지방채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제약도 있다. 지방회계법은 시 금고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맡도록 규정하는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만들어진 새마을금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선 7기 때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했던 인천시가 신용보증재단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시 경제창업실 쪽은 “지역 공공은행 설립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균형발전연구원, 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은 지난 6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은행 설립 토론회를 열었다.정대하 기자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