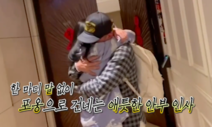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한겨레 Book] 정혜윤의 새벽세시 책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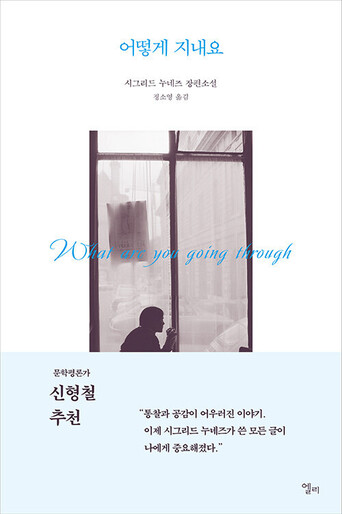
시그리드 누네즈 지음, 정소영 옮김 l 엘리(2021) 시그리드 누네즈에게 전 애인은 중요한 단어다. 그의 두 소설 <친구>와 <어떻게 지내요> 모두 전 애인(혹은 전 남자친구)이 그녀의 이야기를 만든다. <어떻게 지내요>의 화자 ‘나’는 ‘온스라’(onsra)라는 인도 북동부의 언어를 알게 된다. 온스라는 서로를 향한 감정이 지속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사무치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다. ‘나’는 생각한다. ‘마지막 사랑’은 마지막 애인이란 뜻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압도적인 사랑이라 이후로 결코 다른 사랑을 할 수 없음을 뜻하는 단어라고. <어떻게 지내요>에서 ‘나’의 전 애인은 저명한 언론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암에 걸린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전 애인의 강연을 듣는다. 그는 미래를 믿지 않는다. 그는 대략 이렇게 말한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양심이나 공감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의 손아귀에 지구가 들어가도록 내버려두었고 몇몇 테크기업들이 맘껏 이윤을 뽑아가도록 내버려두었다. 치명적 감염병, 극우정권의 발흥도 다 내버려두었다. 자유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우리 인류에게 무슨 선택지가 있는가? 우리 인류는 너무 미적대기만 하고 아무리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대멸종이 일어나도 최고의 엘리트라는 사람들도 나서서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적응하라, 평정을 유지하라, 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목표는 ‘자기 돌봄’, ‘스트레스 피하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한다. 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면의 평화도 아니고 서로의 처지에 대한 공감도 아니고 파멸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뿐이다. 전 애인의 강연을 들은 ‘나’의 생각은? 그의 늙어버린 얼굴을 보는 것이 괴로웠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일이다. 한편 나의 여자친구의 암은 전이되었다. 그녀는 품위있게 자신의 선택으로 죽고 싶어 한다. 죽음을 결심한 그녀와 보내는 며칠은 일상적인 행동이 특별한 의미를 띠는 시간이 되었다. 같이 오래된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일몰을 보고. 친구는 말한다. “내가 사라진 이후, 한없이 아름다운 세상이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견딜 수가 없어. 그마저 빼앗기면 위안이라고는 없는 거지.” 여자친구는 더 이상 자기애와 허망한 남녀관계와 추악한 이야기는 읽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읽을까? ‘사랑과 명예와 연민과 자부심과 공감과 희생으로 돌아가기’. 나는 이 글을 두 가지 시간 이야기로 읽었다. 하나는 직선적인 시간. 언젠가 우리 모두 결국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다. 암에 걸린 친구의 시간은 뚜벅뚜벅 흘러간다. 그리고 내 전 애인의 말 속에 드러난 시간.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 그는 인류가 바뀔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서도 계속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말한다.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당시엔 아무리 중요해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 하찮기만 한 일들에 내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에.” 시간의 물줄기 하나는 되돌릴 수 없는 것, 또 다른 물줄기 하나는 어쩌면 되돌릴 수도 있는 것. 책의 끝 문장은 이것이다. “어쨌든 나는 애를 썼다. 사랑과 명예와 연민과 자부심과 공감과 희생…” 이 단어들 없이는 우리의 이야기는 단 하루도 살아남지 못한다. <CBS>(시비에스) 피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9/53_17038134086514_202312285037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