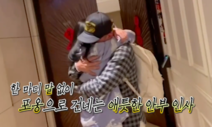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한겨레Book] 정혜윤의 새벽세시 책읽기

메리 올리버 지음, 민승남 옮김 l 마음산책(2019) 메리 올리버의 산문집 <긴 호흡> 첫 장의 소제목은 ‘힘과 시간에 대하여’다. 이 주제가 마음에 와닿았다. 내 인생을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스쳐 갔다. 나는 외로운가? 다른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할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을 만한 친구가 있을까? 나무들은 어떻게 새순을 만들고 꽃들은 어떻게 자기 모습을 만들어낼까?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한 질문들은 힘(에너지)과 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말을 걸면서 힘을 낼까? 내 시간을 누구에게 줄까? 유한한 시간 속에서 어디에 힘을 쏟아야 헛되지 않을까? 시간은 흘러가는데 대체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 메리 올리버는 힘과 시간을 세 개의 자아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낸다. 첫번째 자아는 어린아이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많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어린아이 자아는 가끔 강력하고 이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두번째는 세심한 사회적 자아다.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자아다.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출근을 하고 지하철역에 뛰어가고 약속을 지키고 쌀을 주문하고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도록 하는 자아다. 이 자아는 삶의 시간들을 돌아가게 하는 태엽 같은 존재다. 그렇게 또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똑딱똑딱 한 달이 간다. 이 자아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놀랄 일이 없기를, 하루가 평범하고 규칙적이기를 원한다.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는 이런 확실성의 세계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세번째 자아도 있다. 이 자아는 ‘세상이 돌아가도록 돕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우려는’ 존재다. 이 세번째 자아는 종종 멍하고 일상생활에 서툴거나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무모한 것처럼 보인다. 이 자아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준다. 메리 올리버의 표현에 따르면 ‘영원성’에. 나도 이 영원성이란 것이 세상에 있음을 믿는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좋은 것에 마음을 주고 살고 싶다. 그러나 이 자아는 고독하다.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꼭 필요한 뭔가를 찾아내려면 남몰래 집요하게 애써야 한다. 살아 있는 존재는 늘 뭔가를 기다리는 법이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번째 자아의 지배를 받는다. 그냥 태엽처럼 돌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이 평범한 일상 중 어느 것을 바꿨어야 했는가 계속 물을 때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실패들이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내 삶에서 어떤 것이 가능했고 가능하지 않았나 묻는 한 인간으로서, 어두운 마음으로 시작한 이 새해에 앞으로 나아가는 문제를 두고 씨름했다. 어떻게 해야 한 걸음이라도 떼어볼 수 있을까? 나 개인적으로는 메리 올리버의 시선집 <기러기>에 나오는 시 ‘기러기’의 한 구절에 큰 힘을 얻었다. “착하지 않아도 돼/ (…) 그저 너의 몸이라는 여린 동물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면 돼.” 나에게도 사랑하는 것이 없지 않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는 일. 이 말 속에 내 삶이 녹아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가 힘과 시간을 쓴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사는 것은 서툴러도 사랑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고 싶다. <CBS>(시비에스) 피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9/53_17038134086514_202312285037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