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이해관계
임현 지음 l 문학동네 l 1만4000원
임현의 두 번째 소설집 <그들의 이해관계>에는 쉽사리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넘실거린다. 책에 실린 아홉 단편은 표면적으로 상실과 원망, 회한을 담은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며 명쾌한 결론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지는 식이다.
표제작과 ‘나쁜 사마리안’은 연작으로 읽힌다. 표제작에서 화자의 아내였던 해주는 뜻밖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고, 그 여파는 ‘나쁜 사마리안’에서 화자가 새롭게 가정을 이룬 도경과의 관계에도 미친다. 사실은 사고가 있기 전에도 화자와 해주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고 삐걱거리던 참이었다. ‘나쁜 사마리안’에서 도경과의 관계가 완전한 파국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는 풍성하다. 표제작에서 “어쩌면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아닌가” 후회했던 화자가 ‘나쁜 사마리안’에서도 “함께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다음에는 꼭 그러겠다거나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라.
표제작의 화자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해주가 사고로 죽어야 했는지 거듭 질문하지만 그것은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이다. ‘해원’에서도 남편을 여의고 어린 아들 노아를 홀로 키우던 해원은 잠깐 방심한 사이에 노아에게 닥친 사고의 답을 끝내 찾을 수가 없다. ‘목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욕을 견디다가 자살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찾는 화자의 질문, ‘예정’의 화자가 던지는 질문 “다들 나한테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역시 답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 질문들은 인간의 역능과 이해 범위를 벗어난 사태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가해와 피해가 뒤섞이고 원인과 결과가 착종되는 상황의 복합성을 짐작하게 할 뿐이고, 작가는 섣부른 해석이나 조언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난감하고 모호한 이야기들로부터 우리가 무언가 교훈에 가까운 것을 끄집어 내고자 한다면 ‘거의 하나였던 두 세계’에 나오는 이런 대목이 그나마 그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다. 말하자면, 판단하고 주장하기 전에 부정되고 배제된 것들 쪽으로 마음을 열어 놓으라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려 들 때 필연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다른 관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자세는 의식적으로 무엇이 부정되었는가를 상상하는 일이라는 것.”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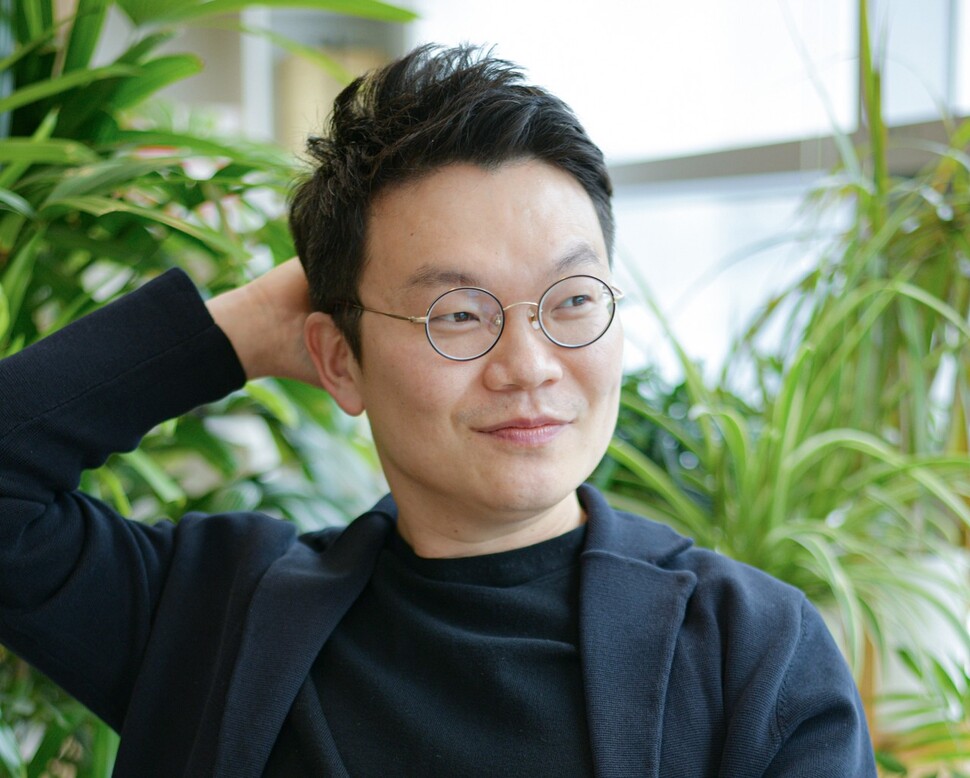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