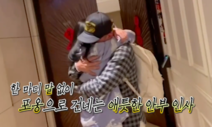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한겨레BOOK] 정혜윤의 새벽세시 책읽기

조르주 페렉 지음, 윤석헌 옮김 l 레모(2021) 프랑스의 작가 조르주 페렉은 ‘나는 태어났다’고 쓴 다음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쓰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는 1936년 3월7일에 태어났다’고 쓴다면? 이럴 경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은 조금 더 수월해 보인다. 이를테면 그 당시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든가, 그날 마침 히틀러가 어딘가로 침공했다든가. 그러나 페렉은 ‘나는 36년 3월7일에 태어났다’고 쓴 다음 그 뒤를 이어가는 것도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쓴 글들은 대체로 거짓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하나의 ‘방대한 자서전 세트’를 기획한다. 그중 하나는 이런 것이다. 우선 파리의 거리, 광장, 교차로, 카페 등 열두 곳을 선정한다. 그 장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나 순간들과 연결된 곳들이다. 선정한 다음에는 매달 이 장소 중 두 곳을 묘사한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장소에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아주 소소한 것일지라도 보이는 것에 충실하게(소방차, 상점에 들어가기 전에 개를 묶어두는 부인 등등) 묘사한다. 두 번째는 기억에 따라서 장소를 묘사한다. 그 장소와 관련된 사람들, 잊히지 않는 아련한 추억들이 글의 내용이 될 것이다. 쓴 다음에는 바로 봉투에 넣고 밀봉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신이 선정한 장소들을 두 번씩 묘사할 수 있게 된다. 한번은 추억의 방식으로, 한번은 실제 묘사로. 이 프로젝트는 12년 동안 계속된다. 다 끝나면 봉투는 288개가 된다. 12년 후 288개 봉투를 열어서 정성껏 읽어본다면? 분명한 것은 이 자서전은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함께 발 딛고 서 있는 땅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니까. 나는 어느 추운 날, 열두 개의 장소를 골라보려고 노력했다. 장소가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갈 수도 있을까? 이를테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무슨 일을 했어야 했나 같은 이해로? 내가 고른 장소 중에는 단 한 번밖에 가보지 않은 곳도 있다. 그곳은 꿈으로 탄생했고 오로지 꿈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고 싶은 곳이다. 천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낡은 벽을 철거하고 손수 타일을 붙이고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각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만든 곳이다. 5층짜리 건물에서 해마다 4천명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씻고 먹고 잠을 잤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 ‘꿀잠’이다. 2017년에 문을 열었으니 1만5천명이 넘는 지친 사람들이 꿀잠에서 잠시나마 짧은 쉼을 구할 수 있었다. 그 공간을 이용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공간에 얽힌 자신의 이야기,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자신들에게 결코 따뜻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돌보느라 분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러나 꿀잠은 현재 철거 위기에 빠져 있다. 재개발 때문이다. 서울의 가장 공동체적 공간인 꿀잠은 존치 가능할까? 나 개인적 기억으로 꿀잠을 쓴다면 2021년 끝자락에 누구와 함께 평생 기억에 남을 저녁을 먹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정확한 관찰로는 골목마다 즐비하던 부동산이 묘사될 것이다. 지키고 싶은 것은 꿀잠이면서 불완전한 우리가 서로 내미는 손이고 육체와 공동체의 기억과 이야기이고 공공성은 중요하다는 믿음이다. 심지어 재개발에서도. 정혜윤 <CBS>(시비에스) 피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9/53_17038134086514_202312285037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