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식물학자, ‘식물 국가’와 헌법 8개조 선포
식물 권리회복 넘어 식물 본성에서 인간이 배우길
식물 권리회복 넘어 식물 본성에서 인간이 배우길

미국 캘리포니아주 메타세쿼이아 국립공원에 자라고 있는 거대한 세쿼이아 나무들. 게티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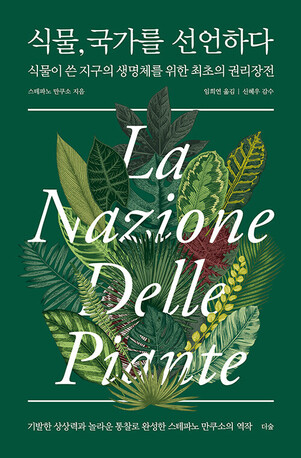
식물이 쓴 지구의 생명체를 위한 최초의 권리장전
스테파노 만쿠소 지음, 임희연 옮김, 신혜우 감수 l 더숲 l 1만8000원 “헤게모니는 꽃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헤게모니는 저 바람과 햇빛이/ 흐르는 물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현종 시인은 ‘헤게모니’라는 시를 이런 도발적인 물음으로 시작한다. 그런가 하면 안도현 시인은 “아침에 한 나무가 일어서서 하늘을 떠받치면/ 또 한 나무가 일어서고 그러면/ 또 한 나무가 따라 일어서서/ 하늘 지붕의 기둥이 되는/ 금강송의 나라”(‘울진 금강송을 노래함’)를 상상하기도 했다. 권력의지와 거리가 멀고 국가나 정부 같은 제도와 무관한 꽃과 나무를 권력 및 국가와 연결시키는 발상법이 과연 시인들답다 하겠다. 시인들의 상상이 전혀 엉뚱한 것만은 아니라고, 식물학자가 맞장구친다. 이탈리아의 식물생리학자 스테파노 만쿠소가 쓴 책 <식물, 국가를 선언하다>는 식물이 지구의 주인이 되어 인간에게 제시하는 8개의 헌법 조항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단순히 식물의 권리 회복 선언이 아니라, 식물의 본성과 행동 양태에서 인간이 배워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자신의 멸종과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멸망에서 벗어날 방도를 식물에게서 배우자는 절박함이 책의 바탕을 이룬다. ‘지구는 생명체의 공동주택으로 모든 생물이 그 주권을 가진다.’ 식물 국가 헌법 제1조는 인간의 오만한 착각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인간은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지능이 높다는 이유로 지구의 주인을 자처한다. 지구 안의 모든 자원을 제멋대로 끌어다 썼고, 그 결과 핵무기와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종말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탄소 함량을 기준으로 측정한 바에 따르면 지구 전체의 바이오매스(일정 지역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중량) 550기가톤 중 인간은 0.06기가톤으로 약 0.01퍼센트에 불과한 반면, 식물은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숫자로 따지면 지구의 주권은 식물의 것이어야 한다.” 호모 사피엔스가 자랑하는 지능은 눈부신 기술과 문명 발달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인간종 자신과 지구 전체의 종말을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모든 생명체의 궁극적 목표가 종의 생존이라면, 인간의 큰 두뇌는 “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진화론적 약점”임이 드러난 셈이다. 땅에 뿌리박고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을 무능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기기 쉽지만, 식물이 동물보다 우월한 지각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식물은 주변 환경의 빛, 온도, 중력, 화학적 기울기, 전기장, 감촉, 소리 등과 같은 여러 매개 변수를 인식할 정도로 매우 민감하다.” 게다가 “식물은 많이 움직인다. 단지 동물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이다.”(식물의 놀랍고도 다채로운 이동 능력은 지은이의 전작 <식물, 세계를 모험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물은 생명체들의 생존에 필요한 1차 에너지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태양과 지구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가 바로 식물이다. “태양 에너지 덕분에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고정시켜 고에너지 분자인 당을 생성하고 산소를 노폐물로 배출한다.” 식물이 생산한 화학 에너지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문제는 “동물체는 그 일부를 연료로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반면, 인간은 자신들이 개발한 에너지원처럼 이를 남용한다”는 데에 있다. 인간은 식물이 고정시킨 태양 에너지인 석탄과 석유를 마구잡이로 퍼내 써서 고갈시킨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써 온난화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켰다. 지난 1만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지만, 2019년 현재에는 그 농도가 410ppm까지 높아졌다. 이는 아마도 지난 2천만 년 동안 최고치일 수 있다고 지은이는 추정한다. 지은이는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2000~3000ppm에 이르렀던 4억5천만 년 전 상황을 상기시킨다. 그 무렵 육지에 출현한 최초의 유기체들은 “아주 높은 온도, 자외선, 강력한 폭풍우, 격렬한 대기 현상”처럼 적대적인 환경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데우스 엑스 마키나’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 생명체와 양립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여 주었다. 바로 나무숲이었다. “나무숲은 막대한 양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의 탄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생성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농도를 대략 10배 줄였다. 이는 지구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육상 동물들이 광범위하게 출현하도록 해주었다.”

<식물, 국가를 선언하다>의 지은이 스테파노 만쿠소. Courtesy Fondazione Palazzo Strozzi, Florence. Photo by Alessandro Mogg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