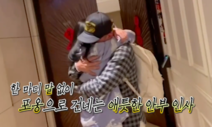비올레트, 묘지지기
발레리 페랭 지음, 장소미 옮김 l 엘리(2022)
아름다운 묘지를 본 적이 있는가?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상실과 슬픔의 공간이기 쉬운 묘지가 아름다운 건 비올레트 때문이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작은 마을 묘지지기 비올레트는 오래전에 잊힌 무덤의 묘석을 일일이 닦아주고 쓸쓸한 무덤 앞에는 화분을 가져다주며 사랑하는 이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틈틈이 함께 일하는 산역꾼과 장의사 동료를 알뜰히 챙기고 묘지에 함께 사는 개와 고양이까지 돌본다. 한마디로 비올레트는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동시에, 더불어 그들이 함께 깃든 묘지라는 중첩된 공간을 가꾸고 돌보는 사람이다.
비올레트에겐 옷장이 두 개다. 여름 옷장에는 자신을 위한 화사한 원색의 옷들이 있고 겨울 옷장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두운색 옷들이 있다. 그는 삶의 기쁨을 나타내는 분홍색 실크 원피스 위에 상처와 슬픔을 상징하는 검은색 울코트를 걸치고 죽은 자들 곁에서 정원을 가꾸고 꽃을 기른다. 이 판타지 같은 풍경에 어느 날 낯선 경찰이 찾아오면서 순식간에 긴장이 시작된다. 경찰은 몇 년 전 묻힌 어느 남자의 무덤 곁에 자기 어머니의 유골을 묻어달라고 부탁한다. 경찰의 어머니와 무덤의 주인은 각자 배우자와 자식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왔던 오랜 연인 사이였다. 그러나 옛사랑의 추억만 전달하고 사라질 것 같았던 이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오래전 실종된 비올레트 남편의 행방을 알려주고 더불어 비올레트가 숨겨왔던 과거의 참담한 고통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서사는 급격히 방향을 튼다. 우리는 처음부터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소질이 있어 보였던 비올레트가 지금의 생활을 일구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통과했는지 기억의 조각들을 전해 듣고 비올레트의 소역사라는 커다란 퍼즐을 맞춰나간다.
책의 각 장은 94개의 묘비명으로 시작한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한 날, 날이 몹시 좋았다.’처럼 애틋한 묘비명부터 ‘겨울이 다가올 무렵 제비가 날아가듯, 네 영혼, 돌아오리라는 희망 없이 날아가버렸네.’ 같이 서글픈 묘비명까지 각 장의 문패 같은 문장을 거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고아 비올레트가 살아온 내력을, 여성이자 엄마로서 겪었던 참혹한 고통의 원인을 서서히 알게 된다. 그 사연을 헤아리는 일은 이 책의 독서가 안겨주는 괴로움이면서 동시에 6백 쪽에 달하는 긴 이야기를 단숨에 읽게 하는 추동력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추리소설의 문제의식이 ‘누가 죽였는가’에서 ‘왜 죽였는가’로 발전했듯이 사건과 비밀과 추리와 폭로의 중첩으로 일면 추리소설의 문법을 빌려온 이 소설의 주제 의식은 ‘누가 살았는가’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로 이동한다.
가장 깊은 밤이 새벽을 불러오듯 고통이 회복을 낳고, 돌봄이 위로를 가져다주며, 죽음이 삶을 잉태한다는 진리를 비올레트의 전임자 사샤의 말로 대신할 수도 있겠다. “8월부터 나무에 새 가지들을 키워내는 가지들을 일컫는 말이야. 내 손에 보이는 것과 같은 갈색 반점들이 가지 위에 생겨나거든. 노화의 신호인데 그런 가지를 ‘8월의 가지’라고 불러. 새순을 키워내는 게 이 늙은 가지들이야. 자연의 신비란 놀랍지 않아?”
이주혜 소설가·번역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당신의 숄과 나의 숄은 달라요 [책&생각] 당신의 숄과 나의 숄은 달라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9/53_17038125640308_2023122850373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