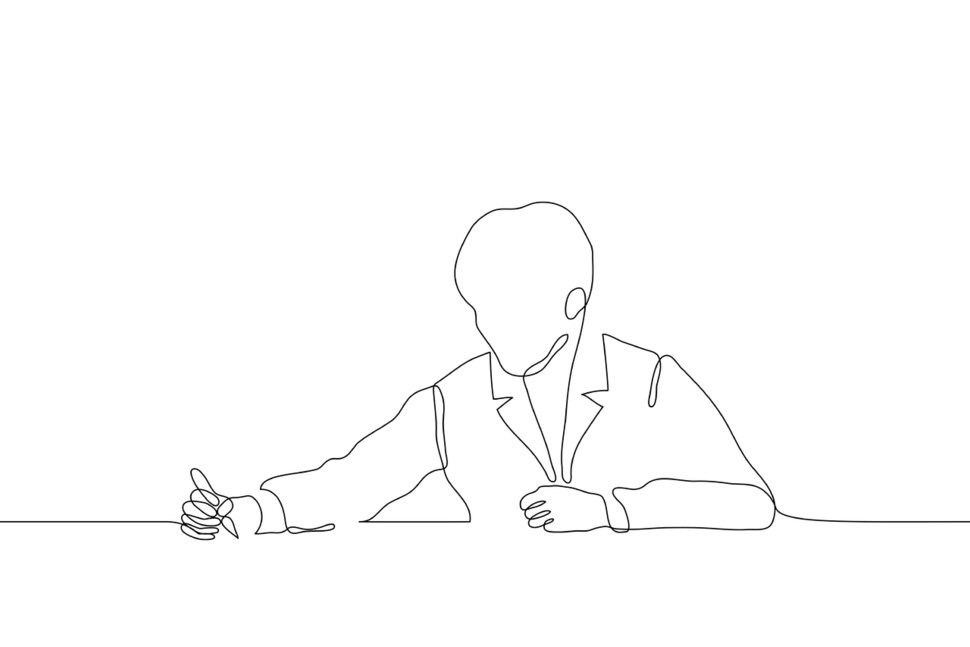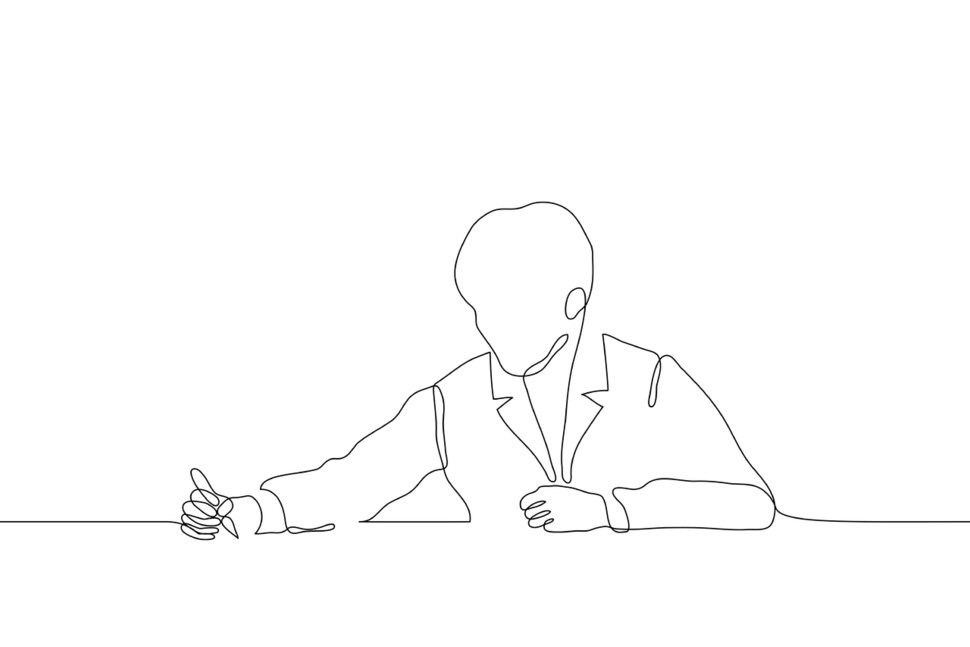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 생활에서 생기는 궁금한 점을 해소해주기 위해 ‘온라인 가나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 만지는 일이 업이라, 가끔 이곳을 열어볼 일이 생깁니다. 최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봤습니다. “공산전체주의의 뜻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립국어원은 이렇게 답합니다. “온라인 가나다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공산전체주의’는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아 의미를 안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그셔틀을 돌리다 라디오 주파수가 딱 맞았을 때처럼, 왠지 질문을 올린 사람이나 답변을 단 사람 모두가 느끼고 있을 당혹감 같은 게 제게도 정확하게 수신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그 당혹감이라는 게, 누군가 발신했던 낱말의 의미를 제대로 수신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은 참 역설적이었지만요. 위정자들과 그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폭포처럼 쏟아내는 ‘아무말’들이 곳곳에서 일으키는 파열음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홍범도 빨치산” 타령은 어느새 “이순신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 조선 사람”이란 지경까지 갔습니다.
인문학자 김경집은 ‘어른의 말글 감각’(김영사)에서 말과 글을 ‘만진다’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빨리감기’의 시대, 스스로 시간을 두고 낱말을 섬세하게 만지는 일은 우리에게 그동안 잃어버렸던 생각의 주도권을 되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충분히 만져진 뒤 나온 낱말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당혹감만 안겨주는 저 말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을까 궁금해집니다. 거기에는 ‘만지는’ 마음과는 다른, 도대체 어떤 마음이 스며 있을까요?
최원형 책지성팀장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