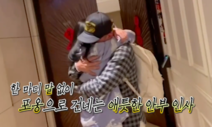영국 미술사학자의 ‘중세와 몸’ 탐구
신체기관 따라 중세 사고방식 여행
머리 없는 인간, 높으신 분들의 발…
“오늘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아야”
신체기관 따라 중세 사고방식 여행
머리 없는 인간, 높으신 분들의 발…
“오늘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아야”

머리가 없는 아프리카 부족 블렘미아이. 1260년께 잉글랜드에서 만든 삽화 장식 기도서 ‘러틀랜드 시편집’에 그려져 있다. 시공사 제공

몸을 통해 탐색한 중세의 삶과 죽음, 예술
잭 하트넬 지음, 장성주 옮김 l 시공사 l 3만2000원 중세, 하면 대개 ‘암흑’이나 ‘야만’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그도 그럴 것이 갖가지 마녀사냥이 횡행했고, “스멀거리는 어둠을 틈타 전쟁을 일으킬 궁리”가 가득한 시기였다. 하지만 영국의 미술사학자 잭 하트넬은 ‘중세 시대의 몸’에서 중세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에 “그것이 인체이든 시이든 회화 또는 연대기이든 간에,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한다. 놀랍게도 이유는 이렇다. “교양 있는 현대 사람처럼 보이려면 우리 자신과 노골적인 대비가 되어 줄 암울하고 무지한 과거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은이는 “단순히 스스로의 비위를 맞추고 싶다는 이유로 시간상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중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몸’에 대한 중세 시대 사람들의 인식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삶과 예술에 반영되었는지 추적한다. 중세 시대 사람들의 몸에 대한 인식을 살피기 전에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중세 시대의 생물학이나 의학에 대한 관념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예 부조리로 여겨질 만큼 오류”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없이 분명하고 논리적”인 이론들이었다. 중세 사람들은 세계의 맨 가장자리, 이를테면 아프리카 대륙의 동북쪽 끝자락에 ‘블렘미아이’(Blemmyae), 즉 “머리가 없는 인간들”이 산다고 믿었다. 이들은 얼굴 부분이 가슴 속으로 내려앉은, 하여 괴물처럼 보이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어떤 문헌에는 키가 2.4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체구를 지녔다고, 또 다른 문헌에는 “길 잃은 여행자를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적혀 있다. 흥미롭게도 지은이는 블렘미아이를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현대인의 상상과 연결한다. (외계인의 존재 여부는 차치하고) 현대인들이 “태양계 바깥에서 만나리라고 믿는 키 작은 초록색 외계인”은 과학적 진실이 아니라 “중세 시대의 괴물족을 빚은 것과 똑같은 인간적 충동이 만든 것”이다. “평범한 중세 사람의 상상과 열망, 환상, 두려움 따위”를 껴안고 있다는 점에서 중세와 오늘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파시쿨로 디 메디치나’(의학 자료집)라는 제목의 책에 실린 해부 장면 그림. 시공사 제공

다이어그램처럼 도식화된 뇌 속 구조를 고스란히 묘사한 사람의 머리. 13세기 중반 잉글랜드에서 세 가지 언어로 만든 백과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시공사 제공

16세기 초 서유럽에서 만들었으리라 추정되는 수술용 톱. 시공사 제공

11세기 말경 이탈리아에서 만든 음악 문헌에 수록된 음악가 귀도의 손. 시공사 제공

두초 디 부오닌세냐의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성모’. 1280년대에 그렸으리라 추정된다. 시공사 제공

중세의 가죽신 세 점. 맨 위 앞코가 기다란 풀랭은 14세기 잉글랜드에서 특히 유행했으리라 추정된다. 시공사 제공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