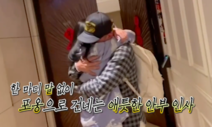생물의학 보안국가의 탄생
아론 케리아티 지음, 서경주 옮김 l 진지 l 2만8000원 2021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한 교수는 15년 동안 몸담았던 대학에서 해고됐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자연 면역을 얻은 사람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대학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접종을 거부하고 방역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뒤 받아든 결과였다. 이후 그는 록다운(봉쇄), 백신 접종 의무화 등 미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벌여왔다. 책은 정신과 의사이자 대학병원의 의료 윤리 책임자였던 저자의 ‘싸움의 기록’이다. 저자는 코로나19 시기 방역이라는 ‘대의’에 의료 윤리와 개인의 결정권 등이 하나씩 무너져간 현실이 과연 정당하냐고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그는 의료 윤리의 기본 원칙인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팬데믹 공포 앞에서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무너진 ‘새로운 비정상’ 사회를 그는 ‘생물의학 보안국가’라고 이름 붙인다. 코로나19가 권위주의,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감시와 통제, 공권력의 강화 등을 제어하던 브레이크를 제거해버렸다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 정부가 팬데믹을 이유로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개개인의 건강·금융 정보 등을 무분별하게 활용했는데, 제동을 걸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우려다. 바이러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러졌던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처에 대한 저자의 비판이 ‘원칙론’에 치우친 인상을 줄 때도 있다. 그러나 개인을 파괴하는 생물의학 보안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저자의 질문을 외면해서는 안 될 때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