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에 있는 ‘조넨알레’(Sonnenallee·태양의 거리). 1990년 독일 통일 때까지 길의 동서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분단의 상징이었다.
사상의 시대에서 ‘숫자’의 시대로…
베를린장벽 붕괴 전후 격변한 삶 그려
베를린장벽 붕괴 전후 격변한 삶 그려
〈새로운 인생 1·2〉 잉고 슐체 지음·노선정 옮김/문학과지성사·각 권 1만4000원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토마스 브루시히 지음·문항심 옮김/문학과지성사·2만2000 원 베를린장벽 붕괴 20돌을 맞아 격변의 경계를 톺아보는 소설 두 권이 나란히 번역·출간됐다. 독일의 ‘3세대 작가’로 일컬어지는 잉고 슐체(47)의 <새로운 인생>과 토마스 브루시히(44)의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이다. 옛 동독 출신의 두 작가는 모두 통일 이후에 문단에 나왔다. 한국 문단에서 1960년대에 등장한 ‘한글 세대’가 식민통치와 일본어의 굴레에서 벗어나 문학적 변혁을 꿈꾸고 시도하는 데 탄력을 보였듯, 이들이 통일 독일의 자본주의를 읽어내는 시선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마음의 빚’이 거의 없다는 데 입각한다. 이들이 보기에 동독 사람들이 맞닥뜨린 충격은 이런 것이었다. “우리는 언어가 숫자를 덮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가 이젠 숫자가 언어를 덮어버리는 세상에 와 있었습니다. 말은 의미를 잃고 계산하는 일만이 중요한 듯했죠.” 사상만이 중한 듯싶던 시대에서 날마다 지갑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그것이 통일 이후에 동독 사람들이 겪은 격변의 중심인 셈이다. 그 상전벽해의 풍경을 두 작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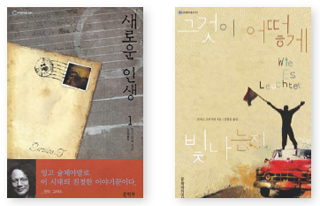 <새로운 인생>은 엔리코 튀르머가 90년 1월부터 7월까지 세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소설이다. 누이 베라, 친구 요한, 연인 니콜레타가 수령인이다. 엔리코는 최인훈이 <회색인>(1963~64)에서 그린 독고준처럼 이상향을 꿈꾸는 지식인이다. 반체제 작가가 되어 서독으로 망명하길 바라지만 동독의 정치체제는 그를 옭아매 절망에 빠뜨린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 요한의 당당한 언행일치에 감명받아 그를 모방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군생활을 문학적 도약의 기회로 삼았으나 이 또한 실패한다. 때는 80년대의 ‘끝’을 향하고 있었다. 동독인들의 반정부 시위와 연설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엔리코는 현실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지 못하고 책상머리에서 웅크리고 ‘언어’와 씨름할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길에서 그는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인식의 전환을 거쳐 신문사 창업에 뛰어든다. 그러나 정론지를 지향하는 신문이 경쟁력을 잃자 엔리코는 광고전문지를 창간하는 길로 회절(에돌이)한 뒤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어 큰 사업을 벌이지만 결국 실패한 뒤 도주하고 만다. 이 모든 곡절을 누이·친구·연인에게 시시콜콜 전하는 엔리코의 태도야말로 동독인의 삶을 압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에서 숫자로’. 베를린장벽 붕괴는 통일의 시작인 동시에 이상주의의 붕괴이기도 하다는 전언이 소설 전반에 깔려 있다. “우리 모두가 불확실한 물로 뛰어드는데 뭘,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잖아.” 통일이 가져다줄 ‘새로운 인생’이란 무엇인가. ‘새로운’(Neue)이라는 낱말이 담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거의 지운 뒤의 ‘새로운’ 삶이 동독 출신 사람들의 현재일지 모른다라는 전언은 분단시대를 사는 한국어 독자를 착잡하게 한다.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는 <새로운 인생>과 같은 시기를 다루되 10여명의 인물 군상을 등장시켜 통일 이후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소설이다. 폴란드 출신 이주자, 전문 사기꾼, 교활한 시인, 동독 비밀경찰의 프락치 변호사, 불치병을 앓는 저항 예술가, 출세에 눈먼 검사, 혼외정사를 즐기는 여인, 미천한 출신에서 입신양명한 호텔 지배인 등이 팔라스트 호텔을 중심으로 얽히고설키며 이른바 ‘통일 이후 풍경’을 그려낸다. 이들에게 통일은 발밑에 갑자기 툭 떨어진 낙엽처럼 사소한 것이기도 하고, 하늘을 가득 채운 먹구름처럼 어쩌지 못할 거대한 무엇이기도 하다. 성공한 저널리스트인 레오 라트케가 맹인인 자비네 부세에 대해 쓴 기사는 이를 가장 또렷하게 보여준다. 장애를 훌륭히 이겨내고 ‘잘 살던’ 부세는 개안수술 뒤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 버린다. 왜 그럴까. 개안수술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기는커녕 거의 불가해한 현실로 그를 떠밀어버린다. 온갖 화려한 세상이 눈에 보이지만 부세는 이것을 ‘시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30여년 넘게 적응된 다른 감각과 시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그는 어쩔 줄 몰라한다. 젖은 비누가 손에서 미끄러지는 듯한, 권투장갑을 끼고 젓가락질을 하는 듯한 삶으로 내몰린 그는 이렇게 소리친다. “난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몰랐어요.” 부세의 절규는 동독인들의 처지를, 그리고 불안한 일상에 속절없이 노출된 현대인을 겨눈 강력한 은유로 읽힌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새로운 인생>은 엔리코 튀르머가 90년 1월부터 7월까지 세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소설이다. 누이 베라, 친구 요한, 연인 니콜레타가 수령인이다. 엔리코는 최인훈이 <회색인>(1963~64)에서 그린 독고준처럼 이상향을 꿈꾸는 지식인이다. 반체제 작가가 되어 서독으로 망명하길 바라지만 동독의 정치체제는 그를 옭아매 절망에 빠뜨린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 요한의 당당한 언행일치에 감명받아 그를 모방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군생활을 문학적 도약의 기회로 삼았으나 이 또한 실패한다. 때는 80년대의 ‘끝’을 향하고 있었다. 동독인들의 반정부 시위와 연설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엔리코는 현실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지 못하고 책상머리에서 웅크리고 ‘언어’와 씨름할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길에서 그는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인식의 전환을 거쳐 신문사 창업에 뛰어든다. 그러나 정론지를 지향하는 신문이 경쟁력을 잃자 엔리코는 광고전문지를 창간하는 길로 회절(에돌이)한 뒤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어 큰 사업을 벌이지만 결국 실패한 뒤 도주하고 만다. 이 모든 곡절을 누이·친구·연인에게 시시콜콜 전하는 엔리코의 태도야말로 동독인의 삶을 압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에서 숫자로’. 베를린장벽 붕괴는 통일의 시작인 동시에 이상주의의 붕괴이기도 하다는 전언이 소설 전반에 깔려 있다. “우리 모두가 불확실한 물로 뛰어드는데 뭘,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잖아.” 통일이 가져다줄 ‘새로운 인생’이란 무엇인가. ‘새로운’(Neue)이라는 낱말이 담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거의 지운 뒤의 ‘새로운’ 삶이 동독 출신 사람들의 현재일지 모른다라는 전언은 분단시대를 사는 한국어 독자를 착잡하게 한다.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는 <새로운 인생>과 같은 시기를 다루되 10여명의 인물 군상을 등장시켜 통일 이후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소설이다. 폴란드 출신 이주자, 전문 사기꾼, 교활한 시인, 동독 비밀경찰의 프락치 변호사, 불치병을 앓는 저항 예술가, 출세에 눈먼 검사, 혼외정사를 즐기는 여인, 미천한 출신에서 입신양명한 호텔 지배인 등이 팔라스트 호텔을 중심으로 얽히고설키며 이른바 ‘통일 이후 풍경’을 그려낸다. 이들에게 통일은 발밑에 갑자기 툭 떨어진 낙엽처럼 사소한 것이기도 하고, 하늘을 가득 채운 먹구름처럼 어쩌지 못할 거대한 무엇이기도 하다. 성공한 저널리스트인 레오 라트케가 맹인인 자비네 부세에 대해 쓴 기사는 이를 가장 또렷하게 보여준다. 장애를 훌륭히 이겨내고 ‘잘 살던’ 부세는 개안수술 뒤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 버린다. 왜 그럴까. 개안수술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기는커녕 거의 불가해한 현실로 그를 떠밀어버린다. 온갖 화려한 세상이 눈에 보이지만 부세는 이것을 ‘시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30여년 넘게 적응된 다른 감각과 시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그는 어쩔 줄 몰라한다. 젖은 비누가 손에서 미끄러지는 듯한, 권투장갑을 끼고 젓가락질을 하는 듯한 삶으로 내몰린 그는 이렇게 소리친다. “난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몰랐어요.” 부세의 절규는 동독인들의 처지를, 그리고 불안한 일상에 속절없이 노출된 현대인을 겨눈 강력한 은유로 읽힌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토마스 브루시히 지음·문항심 옮김/문학과지성사·2만2000 원 베를린장벽 붕괴 20돌을 맞아 격변의 경계를 톺아보는 소설 두 권이 나란히 번역·출간됐다. 독일의 ‘3세대 작가’로 일컬어지는 잉고 슐체(47)의 <새로운 인생>과 토마스 브루시히(44)의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이다. 옛 동독 출신의 두 작가는 모두 통일 이후에 문단에 나왔다. 한국 문단에서 1960년대에 등장한 ‘한글 세대’가 식민통치와 일본어의 굴레에서 벗어나 문학적 변혁을 꿈꾸고 시도하는 데 탄력을 보였듯, 이들이 통일 독일의 자본주의를 읽어내는 시선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마음의 빚’이 거의 없다는 데 입각한다. 이들이 보기에 동독 사람들이 맞닥뜨린 충격은 이런 것이었다. “우리는 언어가 숫자를 덮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가 이젠 숫자가 언어를 덮어버리는 세상에 와 있었습니다. 말은 의미를 잃고 계산하는 일만이 중요한 듯했죠.” 사상만이 중한 듯싶던 시대에서 날마다 지갑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그것이 통일 이후에 동독 사람들이 겪은 격변의 중심인 셈이다. 그 상전벽해의 풍경을 두 작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한다.
〈새로운 인생 1·2〉,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