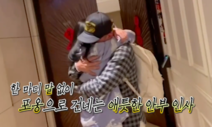정혜윤의 새벽세시 책읽기
위로하는 정신
슈테판 츠바이크 지음
안인희 옮김/유유·1만원 올봄 입학한 신입생 전원이 할머니인 학교가 있다. 61살부터 80살까지 일곱 명의 할머니가 하동의 한 초등학교 신입생이 된 것이다. 할머니들에게 손주뻘 되는 어린 학생들과 배우는 기분이 어떠냐고 여쭤보았다. 할머니들은 “엄청 긴장된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행동이 어린 학생들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애들이 우릴 보고 따라하면서 자랄 것 아니에요?” 이제 막 배움을 시작하는 시골 할머니의 입에서 ‘거울’이란 말을 듣는데 말할 수 없이 좋고 숙연해졌다. 그리고 이 말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누군가의 거울이 된다는 것. 비록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대표자란 생각을 하지 못하면 힘을 내기도 자신을 지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로도 되었다. 세상이 어떻든 자신을 지키면서 세상 또한 지키려는 사람이 존재함이 내게는 위로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츠바이크는 히틀러 침공 후 고향에서 추방당해 브라질로 망명을 간다. 그는 우리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하는, 이를테면 평등이니 자유니 인간의 존엄 같은 것은 다 사라져 버렸다고 느꼈다. 죽기 직전에 그가 연구했던 사람은 몽테뉴였다. 츠바이크는 몽테뉴의 <에세>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 몽테뉴에게는 자신의 삶을 다 바쳐 풀려고 열중했던 질문이 한 가지 있었다. “외부로부터 정해주는 척도를 따르는 태도들로부터 자유”롭게 “타인의 광증이나 이익을 위해서 희생당할 위험”에서 “나의 본래의 영혼과 오직 내게만 속한 물질인 내 몸, 내 건강,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몽테뉴가 풀어보고자 했던 질문이었던 것이다. 츠바이크는 만약 우리가 몽테뉴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까닭은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삶의 최고 기술, 바로 “자신을 지킨다는 가장 높은 기술”에 자신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몽테뉴는 “우리 인간의 부서지기 쉬운 속성, 우리 이해력의 불충분함, 우리 지도자들의 속좁음”에 대한 “나직한 슬픔”을 드러내지만 이내 미소를 짓는다. 츠바이크는 몽테뉴의 <에세>를 읽으면서 이런 목소리를 듣는다. “어째서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힘들게 받아들여? 그 모든 것은 너의 피부만을, 너의 외적인 삶만을 건드릴 뿐 진짜 내면의 자아는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런 외부의 힘은 네가 스스로 헷갈리지 않는 한 네게서 아무것도 뺏어가지 못해. 분별력이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 시대의 사건들은 네가 거기에 동참하길 거부하는 한 네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어. 너의 체험 중에서 가장 고약한 것들, 패배로 보이는 것들, 운명의 타격은 네가 그런 것들 앞에서 약해질 때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야. 그런 일들에 가치와 무게를 두고 그런 일에 즐거움이나 고통을 분배하는 사람이 네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냐? 너 자신 말고는 그 무엇도 너의 자아를 귀하거나 비천하게 만들지 못해.”
 츠바이크가 들은 이 목소리는 내게도 그대로 위로가 되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의무가 있다. 하나는 사회적 법에 순응할 의무. 또 하나는 자신을 지킬 의무. 이 두 가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순응하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따르면서도 바꿔나갈 수가 있다. 이 둘 중 하나의 의무만 존재하는 사회는 절망적이다.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살아!라고 하는 시대는 절망적이다. “우리 시대처럼 비인간적인 시대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을 강화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치유자이고 그것을 일깨워주는 책이 최고의 위로서이다. 나에게 할머니 초등학생들은 바로 츠바이크이자 몽테뉴였다. 자신이 아이들의 거울임을 알고 자신 안의 인간성을 지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자신으로부터 ‘인간’에 관해 배울 것을 알기 때문에.
정혜윤
츠바이크가 들은 이 목소리는 내게도 그대로 위로가 되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의무가 있다. 하나는 사회적 법에 순응할 의무. 또 하나는 자신을 지킬 의무. 이 두 가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순응하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따르면서도 바꿔나갈 수가 있다. 이 둘 중 하나의 의무만 존재하는 사회는 절망적이다.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살아!라고 하는 시대는 절망적이다. “우리 시대처럼 비인간적인 시대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을 강화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치유자이고 그것을 일깨워주는 책이 최고의 위로서이다. 나에게 할머니 초등학생들은 바로 츠바이크이자 몽테뉴였다. 자신이 아이들의 거울임을 알고 자신 안의 인간성을 지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자신으로부터 ‘인간’에 관해 배울 것을 알기 때문에.
정혜윤 피디
안인희 옮김/유유·1만원 올봄 입학한 신입생 전원이 할머니인 학교가 있다. 61살부터 80살까지 일곱 명의 할머니가 하동의 한 초등학교 신입생이 된 것이다. 할머니들에게 손주뻘 되는 어린 학생들과 배우는 기분이 어떠냐고 여쭤보았다. 할머니들은 “엄청 긴장된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행동이 어린 학생들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애들이 우릴 보고 따라하면서 자랄 것 아니에요?” 이제 막 배움을 시작하는 시골 할머니의 입에서 ‘거울’이란 말을 듣는데 말할 수 없이 좋고 숙연해졌다. 그리고 이 말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누군가의 거울이 된다는 것. 비록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대표자란 생각을 하지 못하면 힘을 내기도 자신을 지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로도 되었다. 세상이 어떻든 자신을 지키면서 세상 또한 지키려는 사람이 존재함이 내게는 위로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츠바이크는 히틀러 침공 후 고향에서 추방당해 브라질로 망명을 간다. 그는 우리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하는, 이를테면 평등이니 자유니 인간의 존엄 같은 것은 다 사라져 버렸다고 느꼈다. 죽기 직전에 그가 연구했던 사람은 몽테뉴였다. 츠바이크는 몽테뉴의 <에세>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 몽테뉴에게는 자신의 삶을 다 바쳐 풀려고 열중했던 질문이 한 가지 있었다. “외부로부터 정해주는 척도를 따르는 태도들로부터 자유”롭게 “타인의 광증이나 이익을 위해서 희생당할 위험”에서 “나의 본래의 영혼과 오직 내게만 속한 물질인 내 몸, 내 건강,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몽테뉴가 풀어보고자 했던 질문이었던 것이다. 츠바이크는 만약 우리가 몽테뉴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까닭은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삶의 최고 기술, 바로 “자신을 지킨다는 가장 높은 기술”에 자신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몽테뉴는 “우리 인간의 부서지기 쉬운 속성, 우리 이해력의 불충분함, 우리 지도자들의 속좁음”에 대한 “나직한 슬픔”을 드러내지만 이내 미소를 짓는다. 츠바이크는 몽테뉴의 <에세>를 읽으면서 이런 목소리를 듣는다. “어째서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힘들게 받아들여? 그 모든 것은 너의 피부만을, 너의 외적인 삶만을 건드릴 뿐 진짜 내면의 자아는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런 외부의 힘은 네가 스스로 헷갈리지 않는 한 네게서 아무것도 뺏어가지 못해. 분별력이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 시대의 사건들은 네가 거기에 동참하길 거부하는 한 네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어. 너의 체험 중에서 가장 고약한 것들, 패배로 보이는 것들, 운명의 타격은 네가 그런 것들 앞에서 약해질 때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야. 그런 일들에 가치와 무게를 두고 그런 일에 즐거움이나 고통을 분배하는 사람이 네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냐? 너 자신 말고는 그 무엇도 너의 자아를 귀하거나 비천하게 만들지 못해.”
정혜윤 피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9/53_17038134086514_202312285037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