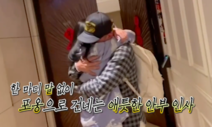정혜윤 <시비에스> 피디
정혜윤의 새벽세시 책읽기
제7일
위화 지음, 문현선 옮김
푸른숲·1만3000원
제7일
위화 지음, 문현선 옮김
푸른숲·1만3000원
위화의 신작 <제7일>은 집도 직장도 가족도 없는 마흔한살 난 한 남자가 화장터를 찾아가는 데서 시작된다. 그날은 그에게는 아주 중요했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가 죽은 뒤에 맞는 첫번째 날이니까. 그는 외톨이라서 아무도 애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검은 천을 찾아서 상장을 달고 화장터에 갔다. 그는 자신이 죽은 건 알겠는데 왜 죽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 같은 도시를 헤매기 시작한다. 둘째날 그는 너무나 아름다웠으나 너무나 야심만만했기 때문에 슬픔만 안겨준 아내를 만난다. 셋째날부터 그는 자신을 길러준, 세상에서 최고였던 아버지를 찾아다닌다. 아버지는 위중한 병이 들자 작별인사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내가 두려운 건 다시는 너를 못 보는 거야”였다.
이미 죽은 걸로 추정되는 아버지를 찾아다니다가 그는 죽어버린 뒤 제대로 애도받지 못한 채 떠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가난한 연인, 철거당해 집에 깔려 죽은 부부, 부정부패에 시달리다 죽은 사람들, 언론과 정부에 의해 조작된 죽음을 맞은 사람들. 다섯째날 그는 스스로 애도하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갔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다. 모두 떠나온 세계에서 기억하기 싫은, 가슴 아픈 일을 겪었고 모두 하나같이 외롭고 쓸쓸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애도하려 한자리에 모였지만 초록색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을 때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 우리가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무리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아버지는 자기도 죽었으면서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한다. 위화의 <제7일>은 기억으로부터 사라져 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사회에서 인간적인 가능성이 파괴된 채 죽어간 사람들에게 바치는 한판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애도 소설이다.
이 소설을 읽는 동안 문기주, 복기성 두 노동자와 함께 송전탑에 올랐던 쌍용자동차 한상균 전 지부장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송전탑에 올라가 있을 때 셋이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날이면, 송전탑으로 전기가 흘러가는 기분 나쁜 지지직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드센 날이면, 밤하늘의 검은 구름만이 어지러운 날이면, 이미 죽어간 쌍차 사람들의 영혼이 송전탑 위로 찾아와 끝없이 말을 거는 느낌이 들었다고, 마치 문을 열어달라고 끝없이 노크를 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우리 사회에도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죽음들이 있다. 죽었지만 이 세상에서 애도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모습을 위화는 이렇게 묘사했다. 심장 모양 나뭇잎이 손을 흔들고 바위가 미소짓고 강물이 안부를 묻고 가난도 없고 부유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원망도 원수도 없고 모두 죽었고 모두 평등한 곳. 위화는 만약 죽은 자들이 계속 살았다면 살고 싶었을 세상의 모습으로 그들을 애도했다.
그렇지만 이 소설은 너무나 슬프다. 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은 서로 지독히도 사랑했다. 부모는 자식을 찾아다니고 연인은 연인을 찾아다니고 죽어서도 그들이 사랑했던 기억을 끝없이 더듬고. 그러나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였어도 너무 슬펐다. 이제 그들이 막 떠나온 세상에서는 사랑했어도 너무 슬프고 추웠다. 사는 것은 눈발이 날리는 날 뿌연 안갯속을 더듬더듬 걷는 것만 같았다.
정혜윤 <시비에스> 피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9/53_17038134086514_202312285037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