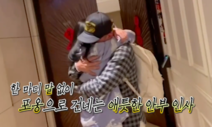정혜윤<시비에스>(CBS) 피디
정혜윤의 새벽세시 책읽기
2666(전5권)
로베르토 볼라뇨 지음, 송병선 옮김/열린책들(2013)
2666(전5권)
로베르토 볼라뇨 지음, 송병선 옮김/열린책들(2013)
그게 언제였을까? 칠레에 간 일이 있었는데 공항 서점, 시내에 있는 대형서점, 변두리에 있는 작은 서점, 어디서나 볼라뇨의 책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볼라뇨가 대체 누구일까? 그전에 나는 그의 작품 <칠레의 밤>을 읽었었고 그때도 종이 위에 썼다기보다는 차라리 거의 퍼부었다고 할 만한 말들의 속도감, 힘에 흥분했었다. <2666>은 2003년에 죽은 볼라뇨의 유작이다. 볼라뇨가 이 책을 쓴 이유, 책 속의 한 구절을 인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약사는 야간 당번 때마다 책을 읽는다. 약사는 <변신>이나 <필경사 바틀비>나 <크리스마스캐럴> 같은 것을 읽는다.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이라도 <소송>이 아니라 <변신>을, 허먼 멜빌의 작품이라도 <모비딕>이 아니라 <필경사 바틀비>를 읽는다는 것에 무슨 별스런 의미가 있을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위대하고 불완전하며 압도적인 작품들, 미지의 세계 속에서 길을 열어주는 작품들을 읽기 두려워해.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들의 완벽한 연습 작품만 읽고 있어. 그들은 위대한 스승들이 연습 경기하는 것을 보고 싶어해. 하지만 위대한 스승들이 무언가와 맞서 싸울 때 그러니까 피를 흘리며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악취를 풍기면서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것과 맞서 싸울 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2666>이 바로 그런 책이다.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것과 맞서’ 싸우는 ‘압도적인’ 책이다. 베노 폰 아르힘볼디라는 독일 작가가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자 노벨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른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아무도 베노 폰 아르힘볼디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누구인가, 혹은 살아 있기는 한 것인가는 철저한 미스터리 속에 있다. 그런데 아르힘볼디가 멕시코 북부 사막지대 산타테레사라는 도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다. 1권에서는 아르힘볼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산타테레사에 도착한다. 2권에서는 다른 사람이, 3권에서는 또다른 사람이 산타테레사에 도착한다. 이렇게 해서 산타테레사가 <2666> 다섯권을 모두 묶는다. 산타테레사는 어떤 도시일까?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도시, 그러나 그 도시에서는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살해되었다. 4권에서 볼라뇨는 100건이 넘는 살인을 묘사한다. 그런데 또 하나의 폭력이 있다. 아르힘볼디의 비밀스런 삶과 2차 세계대전이다. 책에서 범죄는 끝없이 반복된다. 이제 사회는 무질서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가, 그것도 아주 어두운 것이 반복되는 질서 속에 있는 것 같다.
볼라뇨는 악의 기원, 악의 승리, 악의 종말이 아니라 악의 반복을 썼다. 그는 뇌 속에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 그것도 어둠 속에서 결코 말해진 적이 없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누군가의 목소리를 받아 적는 사람처럼 글을 썼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찮아지지? 범죄자와 비겁한 사람은 어떻게 다르지? 우리는 어떻게 무력해지다가 어떻게 이 세계의 피조물로 악취를 풍기게 되지? 마침내 악은 어떻게 제자리를 굳건하게 잡아가게 되지? 그것이 <2666> 전체의 내용이다.
우리는 소득과 지출의 끈에 매달려 산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한 가지를 더 필요로 한다. 바로 마술이다. 즉 소득, 지출, 마술의 세 다리로 이뤄진 테이블이 우리 세계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했던 마술이 혹시 악이라면? 협잡, 기만, 가련한 자기변명, 폭력 등등의 악이 우리의 마술이라면?
정혜윤<시비에스>(CBS) 피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9/53_17038134086514_202312285037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