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프강 벨쉬 교수.
포스트휴머니스트로 변신한 철학자 ‘볼프강 벨슈’ 교수
인간-자연 나누는 근대철학 거부
인공지능·유전자 조작도 진화 산물
모든 존재 연관…자연에 존경심을
인간-자연 나누는 근대철학 거부
인공지능·유전자 조작도 진화 산물
모든 존재 연관…자연에 존경심을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천만에! 근대 이원론적 세계관을 넘어서라. 인류도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멸종할지 모른다.”
미학자이자 철학자인 독일 예나대학교 볼프강 벨쉬 명예교수가 28일 서울을 찾았다. 이날 그는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탈경계인문학 연구단이 29일까지 ‘트랜스,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의 지형’이라는 주제로 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포스트휴머니즘-진화인류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우리의 포스트모던적 모던>(1987)을 발간하면서 큰 명성을 얻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대가다.
벨쉬 교수는 지난 2000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년 프로젝트를 하면서 ‘포스트휴머니스트’로 변신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근대 철학의 대전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과 동물, 환경, 인공지능까지 서로 연관돼있다”고 말했다.
“이성은 인간만의 특권이 아니다. 침팬지와 보노보도 관계를 관리한다. 진화인류학적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나 유전자조작, 새로운 종의 출현이나 변형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신이 창조한대로 인간이 살아야한다는 건 넌센스 아닌가?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기독교 같은 창조론 관점에서는 기겁할 소리다. 특히 철학자로서 유전자 변형이나 인간 신체의 사이보그화 같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선뜻 밝히는 일은 많지 않다. 이에 그는 웃으며 “진실이란 원래 잔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인간을 창조한다는 말을 보자. 인간더러 세상을 지배하라는 게 아니라 환경과 지구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의 관점에서 이 말을 해석한다면 종교도 포스트휴머니즘에 호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다만 ‘인간이 무엇인가’를 철학적으로 질문하는 ‘포스트휴머니즘’과, 신기술을 동원해 인간을 개선하고 향상시키자는 ‘트랜스휴머니즘’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는 인간을 중심에 놓지 않고, 더 겸손한 입장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간의 교양 같은 휴머니즘은 살려야 하지만 인간만 중심이 되는 휴머니즘적 근대 정신은 자연에 대한 존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룡처럼 지구를 지배했던 99.9%의 종이 멸종했다. 인구과잉, 고기를 생산하려고 소비되는 곡물, 환경파괴, 식량문제 같은 위기 상황을 윤리적으로 대처할 장치가 전혀 없는 지금, 인류라는 종은 생각만큼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벨쉬 교수는 동양 사상의 불교와 도교 등의 전통이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에 어울릴 수 있다고 했다. “모든 존재가 연관돼있으며 경계가 없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한다는 전통은 진화론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불변은 없다.” 그는 단호했다.
29일 학술대회에서는 ‘사이보그와 그 자매들: 도나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수사학’ 등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사진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꽁트] 마지막 변신 [꽁트] 마지막 변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6/20250126502223.webp)
![‘믿음’이 당신을 구원, 아니 파멸케 하리라 [.txt] ‘믿음’이 당신을 구원, 아니 파멸케 하리라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3/20250123504340.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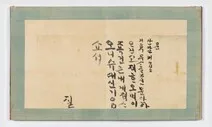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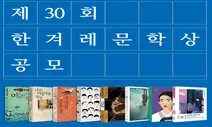
![그들은 ‘작은 것들’에 집착했다 [.txt] 그들은 ‘작은 것들’에 집착했다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4/2025012450309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