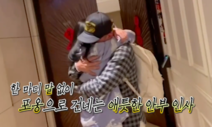정혜윤 <시비에스>(CBS) 피디
정혜윤의 새벽세시 책읽기
자기 앞의 생
에밀 아자르 지음, 용경식 옮김
문학동네 펴냄(2013)
자기 앞의 생
에밀 아자르 지음, 용경식 옮김
문학동네 펴냄(2013)
만약 우리 시대에 가장 흔히 쓰이는 말을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사는 것일까? 왜 이러고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일까? 혹은 ‘…이 불가능한 시대’라는 규정일까? 다른 질문도 던져 볼 수 있다. 어린 소년 소녀들에게 “너는 앞날이 창창하잖아. 앞날이 구만리 같잖아. 무슨 걱정이니?”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젊음이 무조건 탄탄대로이고 아름답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은 작가가 있다. 로맹 가리다. 로맹 가리는 에밀 아자르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열네살 꼬마 모모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내뱉게 한다.
“법이란 지켜야 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내게 제일 좋은 방법은 현실이 아닌 곳에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한 사람도 없으면 살이 찌기 시작한다.” “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늙고 더 이상 쓸모없는 창녀들만 모아서 포주 노릇을 할 것이다. 그들을 돌봐주고 평등하게 대해줄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경찰과 포주가 되어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칠층 아파트에 버려진 채 울고 있는 늙은 창녀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천진하고 구슬픈 유머, 그 유머 속에 도사린 통렬한 풍자와 늘 들고 다니는 우산 때문에 꼬마 찰리 채플린을 연상시키는 모모는 <자기 앞의 생>의 주인공이지만 모모 곁에 있는 것은 자기 ‘앞’의 생이 아니라 자기 ‘뒤’의 생을 돌아보는 로자 아주머니였다. 유대인 집단수용소에 있었던 로자. 수십년간 창녀였던 로자. 인류의 적은 남자의 성기라고 믿고 있는 로자. 엘리베이터도 없는 칠층 아파트에서 병들고 과거의 기억에 쫓겨가며 울고 있는 로자. 그러나 열다섯살에는 무척 아름다웠던 로자. 모모는 곧 죽게 될 아줌마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만 뒤로 돌려보고 싶어한다.
“거꾸로 된 세상. 이건 정말 나의 빌어먹을 인생 중에서 내가 본 가장 멋진 일이었다. 나는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 아줌마를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었다.”
모모는 생이 끝없이 로자 아주머니를 파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생이란 것을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노인들이 넌 어리다, 앞날이 창창하다, 하고 활짝 웃으며 말하는 것을 늘 보아왔다. 그런 말을 하면 그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모양이다.”
로맹 가리는 어린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것도 알고 싶어하지 않고 그저 옛날 사람 같아지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옛날 사람 같아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실 내게는 옛날 사람 같아진다는 것이 전혀 나쁜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서러운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모욕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 서로 돌보고 보호하는 인간의 본성에 악착같이 충실한 것이 모두 옛 전설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일까? 서러운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자신도 무시당하면서도) 서로서로 돌보는 인간의 본성에 끝까지 충실하고 싶어했던 한 어린아이가 자기 앞의 생이 창창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모모는 일단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정혜윤 <시비에스>(CBS) 피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9/53_17038134086514_202312285037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