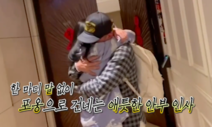정혜윤의 새벽세시 책읽기
작은 우주들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지음, 김운찬 옮김/문학동네(2017) 삶에서 한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사소하게 볼 일이 아니다. 특히 클라우디오 마그리스의 책이라면. ‘인생 참 뜻대로 안 되지? 씁쓸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클라우디오 마그리스의 책을 펼치면 마음은 다른 우주로 이동하게 된다. 인생 참 뜻대로 잘 되는 사람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 표현해본 사람도, 다 위로받은 사람도 유사 이래 한명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 파도가 해변의 발자국을 지우는 것을 슬퍼만 하고 있지 않듯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만큼 삶의 필연성(한때 성취했던 일들이 언젠가는 무효가 되고 덧없어지는 것과 늙는지도 모르게 늙어가는 것과 얼굴선이 점차 변하는 것, 육체가 서서히 망가지는 것과 결국에는 죽고 사라지는 잔인한 필연성) 속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표현해낸 작가는 최근에는 읽은 적이 없다. 그의 책은 현재 <다뉴브>와 <작은 우주들> 두권이 번역되었다. 두권 다 천천히 읽는 것이 좋다. 깊지 않은 문장이 한줄도 없다. 그는 모순 없는 삶은 없다고 생각했고 바로 그 모순을 우물 속에 비치는 별빛처럼 깊게 들여다봤다. 그는 삶을 소중하게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도의 기술임을 알고 있었고 삶을 즐겁게, 유쾌하게 사는 사람들조차 그것의 덧없음, 무의미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우주에서 가시에 찔려보지 않은 삶은 없다. 그러나 세파에 물들지 않고 삶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장난치듯이 견뎌내는 것, 쓰라린 실망 속에도 지치지 않고 삶을 사랑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작은 우주들>에서, <제노의 의식>을 쓴 작가 스베보에 대한 이런 표현. “스베보는 삶의 모호함과 공허함을 철저하게 탐색했기에 모든 것이 얼마나 비정상인지 보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계속 살았고 혼돈을 폭로하면서도 못 본 척했고 삶이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다지 애착을 가질 만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강렬하게 열망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작은 우주들>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글로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그려보고자 작정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지방, 왕국, 산, 만, 배, 물고기, 주거지, 도구, 별, 말, 사람들의 이미지로 한 공간을 채운다. 죽기 직전 그는 그 끈기있는 선들의 미로가 그려낸 것이 자기 얼굴의 이미지였음을 발견한다.” 우리의 일하는 손은 풍경의 윤곽선을 만들지만 풍경은 시간과 함께 우리의 얼굴에 주름을 새긴다. 우리가 어떤 얼굴을 사랑하여 잊지 못하는지, 하도 자주 떠올려서 끝내 닮아가는지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작은 우주인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좋은 비유다. 우리 안의 어둠은 얼마나 깊고 빛은 얼마나 반짝이고 그리고 서로 얼마나 닿을 수 없던지. 시간의 강물에서 작은 우주인 우리들의 얼굴이 물결처럼 스쳐 흐른다. 그 옆에 영원히 재생하는 초록의 바다, 숲, 하늘, 별, 이렇게 무한한 것이 매번 잊지 않고 찾아옴을 유한한 생명체로서 감사드리게 된다. 정혜윤 <시비에스>(CBS) 피디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지음, 김운찬 옮김/문학동네(2017) 삶에서 한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사소하게 볼 일이 아니다. 특히 클라우디오 마그리스의 책이라면. ‘인생 참 뜻대로 안 되지? 씁쓸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클라우디오 마그리스의 책을 펼치면 마음은 다른 우주로 이동하게 된다. 인생 참 뜻대로 잘 되는 사람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 표현해본 사람도, 다 위로받은 사람도 유사 이래 한명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 파도가 해변의 발자국을 지우는 것을 슬퍼만 하고 있지 않듯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만큼 삶의 필연성(한때 성취했던 일들이 언젠가는 무효가 되고 덧없어지는 것과 늙는지도 모르게 늙어가는 것과 얼굴선이 점차 변하는 것, 육체가 서서히 망가지는 것과 결국에는 죽고 사라지는 잔인한 필연성) 속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표현해낸 작가는 최근에는 읽은 적이 없다. 그의 책은 현재 <다뉴브>와 <작은 우주들> 두권이 번역되었다. 두권 다 천천히 읽는 것이 좋다. 깊지 않은 문장이 한줄도 없다. 그는 모순 없는 삶은 없다고 생각했고 바로 그 모순을 우물 속에 비치는 별빛처럼 깊게 들여다봤다. 그는 삶을 소중하게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도의 기술임을 알고 있었고 삶을 즐겁게, 유쾌하게 사는 사람들조차 그것의 덧없음, 무의미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우주에서 가시에 찔려보지 않은 삶은 없다. 그러나 세파에 물들지 않고 삶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장난치듯이 견뎌내는 것, 쓰라린 실망 속에도 지치지 않고 삶을 사랑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작은 우주들>에서, <제노의 의식>을 쓴 작가 스베보에 대한 이런 표현. “스베보는 삶의 모호함과 공허함을 철저하게 탐색했기에 모든 것이 얼마나 비정상인지 보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계속 살았고 혼돈을 폭로하면서도 못 본 척했고 삶이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다지 애착을 가질 만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강렬하게 열망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작은 우주들>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글로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그려보고자 작정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지방, 왕국, 산, 만, 배, 물고기, 주거지, 도구, 별, 말, 사람들의 이미지로 한 공간을 채운다. 죽기 직전 그는 그 끈기있는 선들의 미로가 그려낸 것이 자기 얼굴의 이미지였음을 발견한다.” 우리의 일하는 손은 풍경의 윤곽선을 만들지만 풍경은 시간과 함께 우리의 얼굴에 주름을 새긴다. 우리가 어떤 얼굴을 사랑하여 잊지 못하는지, 하도 자주 떠올려서 끝내 닮아가는지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작은 우주인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좋은 비유다. 우리 안의 어둠은 얼마나 깊고 빛은 얼마나 반짝이고 그리고 서로 얼마나 닿을 수 없던지. 시간의 강물에서 작은 우주인 우리들의 얼굴이 물결처럼 스쳐 흐른다. 그 옆에 영원히 재생하는 초록의 바다, 숲, 하늘, 별, 이렇게 무한한 것이 매번 잊지 않고 찾아옴을 유한한 생명체로서 감사드리게 된다. 정혜윤 <시비에스>(CBS) 피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9/53_17038134086514_202312285037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