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평전
한명기 지음/보리·3만3000원
소설과 영화 <남한산성>을 통해 인간 최명길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최명길 평전>을 읽어야 할 까닭이 있다면, 그건 이 책의 지은이 때문일 것이다. 한·중·일 사료를 두루 섭렵하며 두 번의 왜란과 두 번의 호란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로 통하는 한명기 명지대 사학과 교수. “끼어 있는 나라” 조선이 속절없이 휘말려 들어갔던 전쟁을 오래 연구해온 그는 왜 숱한 인물 가운데 최명길(1586~1647)에 주목했을까, 그가 본 최명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증이 이어진다.
한 교수는 병자호란 당시 목숨을 걸고 홀로 적진에 들어가 화친을 이끌어 냈던 최명길의 삶을 담담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되살려 낸다. “왜소하고 병약한 볼품 없는 외모”에 “나이 마흔도 되지 않아 이빨이 반이나 빠져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했던 최명길은 어떻게 당대의 주류 척화론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지행합일’을 강조한 양명학 영향을 받은 건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 교수는 최명길의 독특한 독서 경험을 추가한다. 어릴 때 집에 불이 나 역사책인 <좌전> 등 서너 권만 불에 그슬린 채 겨우 남아 있었고, 인조에게도 <서경> <춘추> 같은 역사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일화들이다. 광해군 조정에서 쫓겨나 가평 대성리에 은거할 때는 <주역>을 수천번이나 읽었다. 주자학 말고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들과 달리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띠게 된 배경이 드러난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최명길 역을 맡았던 배우 이병헌. 씨제이이앤엠 제공
적과의 화친을 강조했던 사람이니 늘 둥글게 살았을 것 같지만, 그는 인조반정의 주역이었다. 광해군을 ‘폐모살제’의 패륜아로 규정하고 일찌감치 역모를 논의했으며, <주역>에 통달한 역학자답게 점을 쳐서 거사일을 정할 정도로 깊이 간여했다. 반정에 성공한 뒤 김류와 이귀 등이 광해군 정권의 권세가 저택을 차지하는 등 제 잇속 차리기 바쁠 때 최명길은 광해군 정권의 평안도 관찰사 박엽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잔혹한 성품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박엽이지만 청나라와 통하는 유일한 외교관이었던 그를 살려두어야 한다고 봤던 것이다. 하지만 박엽은 끝내 처형되고 만다.
한 교수가 최명길을 묘사할 때 강조하는 덕목은 ‘용기, 책임감, 희생정신’이다. 남한산성에서의 활약에 앞서, 청나라 군대 선봉이 서울 한복판까지 들이닥쳤을 때 홀로 적진에 들어가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도 최명길이었다. “사신들의 목을 친 뒤 나라의 존망을 걸고 청과 싸우자고 외쳤던 척화신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최명길을 ‘진회보다 더한 만고의 간신’으로 깎아내린다. 진회는 남송을 금나라에 넘긴 희대의 간신이다. 반면, 명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인조까지도 옥쇄(玉碎, 공명이나 충절을 위해 깨끗하게 죽음)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낙향했던 김상헌은 ‘조선의 정사(正士)이자 영원한 사표’로 추앙받는다. 지은이는 이 기막힌 대비가 조선의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시각’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4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때 못지 않게 사납고 복잡하다. 임진왜란 때 망해가는 나라를 살려줬으니 후금을 치는 데 앞장서라고 강요했던 명나라와, 그런 명나라를 위해선 임금의 목숨도 바쳐야 한다던 척화신들의 모습에서 누군가는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을 떠올릴 수 있다. 또 누군가는 한국이 분수도 모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시도했다가 본전도 건지지 못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분명한 건,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점이다. 최명길의 실리주의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논쟁의 영역이지만, 명분과 의리를 앞세우며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자들의 말은 예나 지금이나 믿을 게 못 된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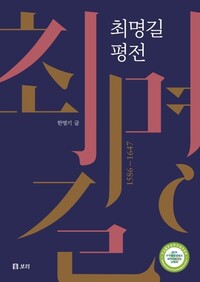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