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생각] 책거리
“내 영정을 들고/ 내가 걸어가네/ 석탄가루를 뒤집어쓰고/ 부르르, 주먹을 쥐었다 펴면/ 핏빛 햇살 한 줌/ …”
이 시를 곱씹으며 울렁이는 마음은 도저히 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성용 시인의 ‘청년 김용균’입니다. 처참한 죽음은 아직 멈추지 않았고, 우리의 애도는 이어져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섰지만, 우리사회의 김용균들은 여전히 주먹을 쥐지도 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햇살은 여전히 핏빛 한 줌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가닿을 말이, 또다른 누군가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울렁이는 가슴에 소주를 부어넣고 지하철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게워내는 그 마음을.
허태준이 교복 위에 허겁지겁 작업복을 겹쳐입을 때, 45년생 윤영자는 폐지를 줍고 있었겠지요. 젊은 시절부터 일흔이 넘기까지, 자식과 남편을 위해 아낌 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윤영자의 삶은 거리에서 리어카를 끄는 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마땅한 직업도 없이 살아온 윤영자에게 남은 것은, 아픈 곳투성이인 몸뚱어리 하나뿐입니다.
허태준의 글쓰기도, 윤영자를 추적한 소장학자 소준철의 기록도,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치부를 드러내어 햇빛 아래 내어놓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노력. 이런 노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혼까지 끌어다 부동산과 주식에 갖다 바치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메마르고 강퍅한 우리들에게. 다만 허태준의 글에서 희망을 얻습니다. “글은 내가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김진철 책지성팀장 nowhere@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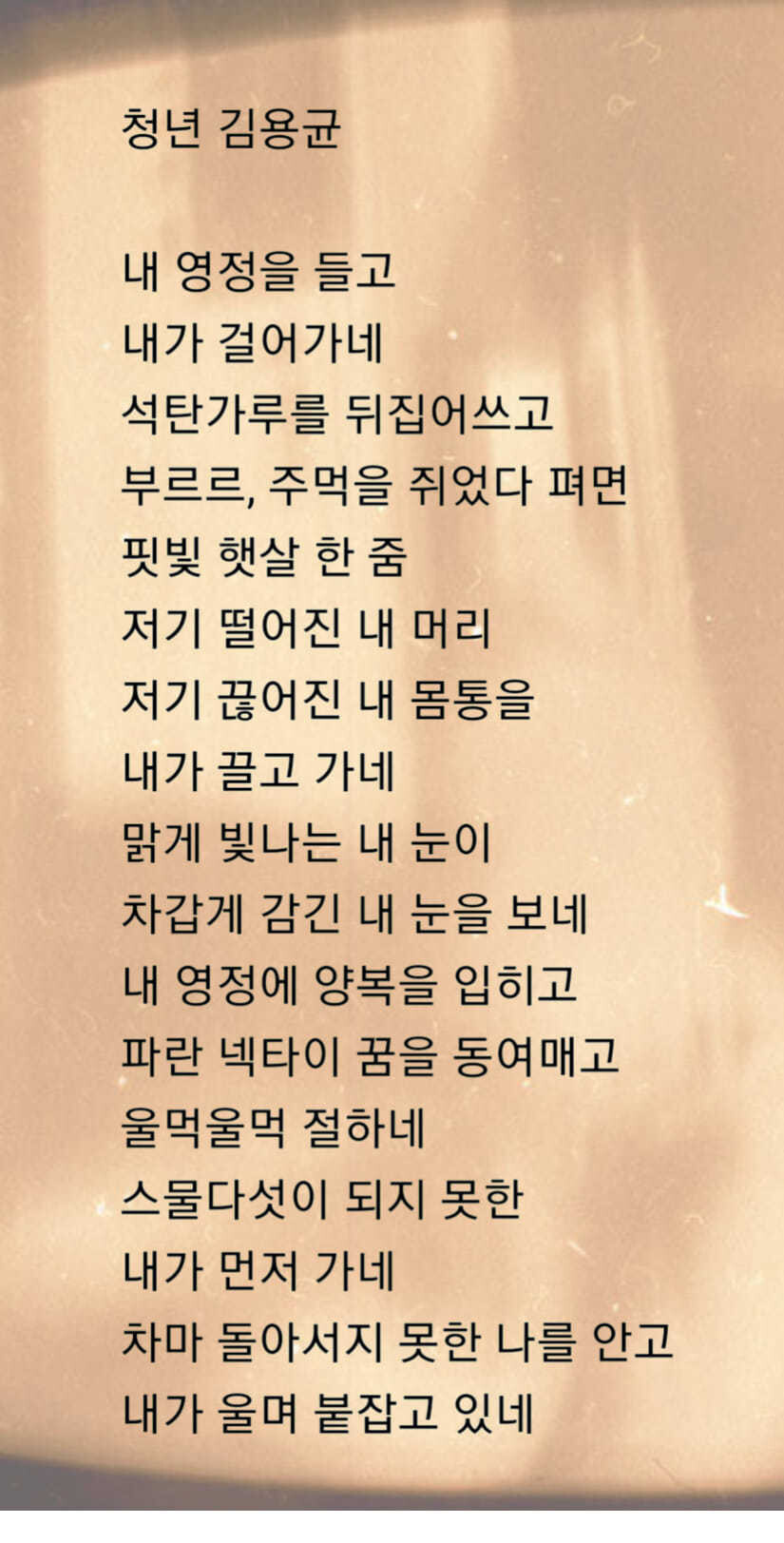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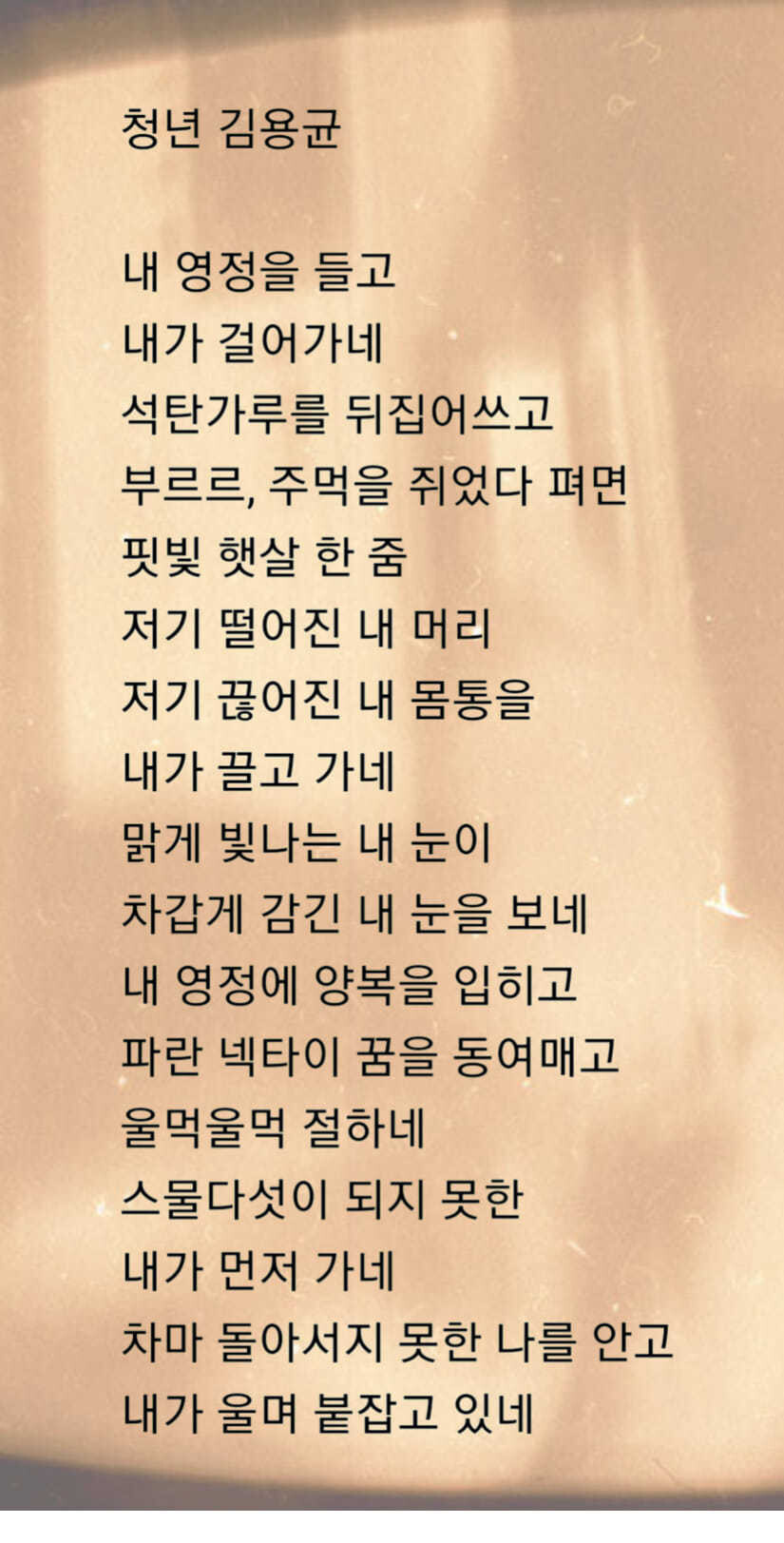
임성용 시인의 ‘청년 김용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연말의 빚 독촉 [책&생각] 연말의 빚 독촉](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9/53_17038095946068_202312295001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