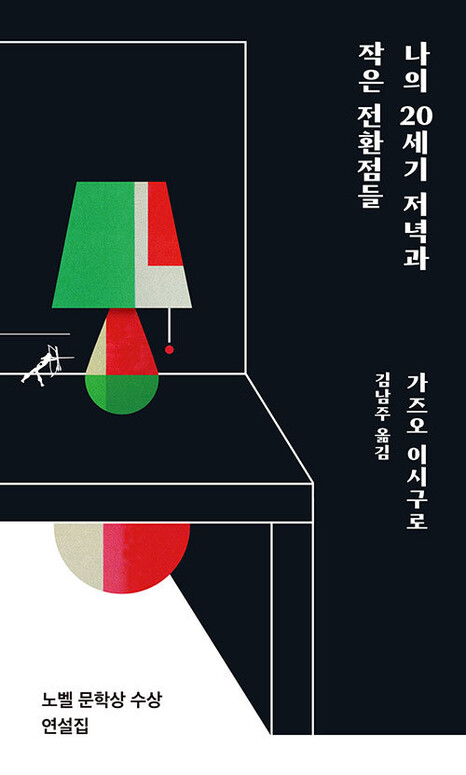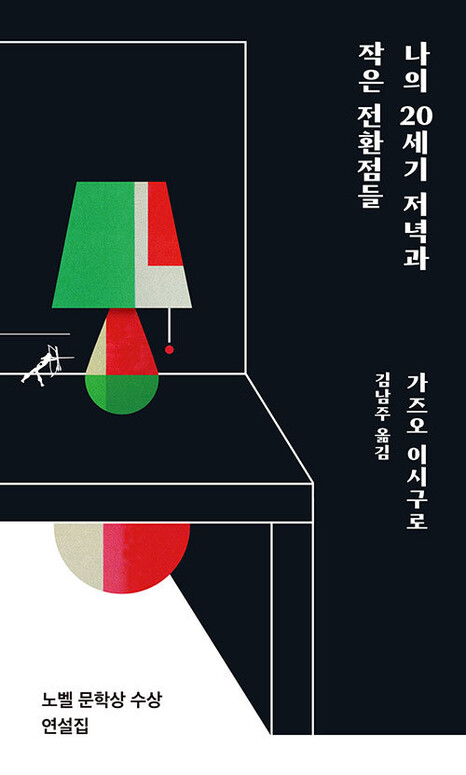가즈오 이시구로의 노벨문학상 수상연설집 <나의 20세기 저녁과 작은 전환점들>에는 그에게 글을 쓰게 만든 ‘특별한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왜 그는 글을 썼을까?
가즈오 이시구로는 1960년 4월 다섯 살 때 일본을 떠나 부모님과 함께 영국에 도착했다. 그는 그 뒤로 이십대 중반까지 단 한 번도 일본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님은 해마다 ‘내년에는 꼭 일본에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그가 일본에 돌아가는 즉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일본에 대한 상세한 추억들을 들려줬다. 이를테면 조부모님에 대한 추억, 그가 일본에서 살던 전통가옥, 그가 일본에 두고 온 좋아하던 장난감, 그가 다니던 유치원, 전차 정거장 다리 옆의 사나운 개, 어린 소년 전용 이발소 의자 등. 이 모든 세부사항들은 다 합해져서 한 소년의 마음속 ‘일본’이 되었고 그 일본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감에 대한 감각을 끌어내는 곳’이 되었다.
문제는 이시구로가 일본에 가본 적이 없으므로 그 일본은 한 아이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그 일본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마음속에만 있는 유일하고 특별한 곳이었다. 그러나 그 일본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마음속에서조차 흐릿해질 수 있었다. 그는 마음에 품고 있던 일본의 특별함을 종이 위에 기록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네, 저의 일본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존’하고 싶었다는 것이 그의 창조의 비밀이었다. 보존과 창조, 서로 반대되는 단어처럼 들린다. 그러나 자신에게만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아닐 것이다. 이시구로의 일본에 해당할 만한 단어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 우리도 “네 저의 소중한 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뭔가를 창조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지난주 오늘은 세월호 7주기였다. 그날 나는 세월호 7주기 토크 콘서트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기획했다. 음악을 좋아했던 아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생전에 영상으로 남겼다. 아이들이 사랑했던 노래를 뮤지션들이 다시 부르는 형식의 방송이었다. 그날 내 마음속 주제는 ‘꿈’이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었다. 손재주가 좋아서 혼자서 ‘벚꽃엔딩’과 ‘꽃송이가’의 기타 연주를 익힌 주현이의 마지막 모습은 구조를 기다리면서 기타를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기타는 돌아오지 못했다. 보컬학원에 다니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던 노력파 예은이가 일부러 시간을 일찍 맞춰놓은 손목시계 알람은 예은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성실하게 꼬박꼬박 울렸다.
아이들 중 아무도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세월이 흘렀어도 부모들은 아직도 이런 꿈을 꾼다. “엄마, 나 살아 있어. 나 안 죽었어. 놀랐지?” 깨고 싶지 않은 꿈이다. 올해 ‘416 생명안전공원’ 논의가 본격화된다. 나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꿈이 잘 ‘보존’되길 바란다. 거기서 수많은 좋은 이야기가 ‘창조’되고 우리의 꿈도 ‘창조’되기 바란다. 우리는 세월호를 겪은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그 말에 우리가 더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뉴스와 기후위기 뉴스들을 절박한 심정으로 듣게 되는 이유다. 지켜주고 싶다.
(시비에스)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