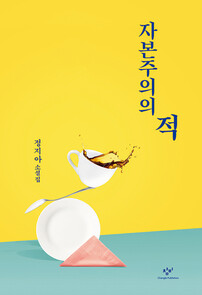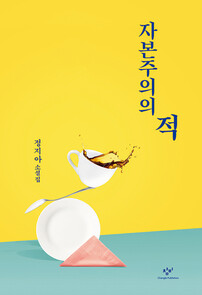자본주의의 적
정지아 지음/창비·1만4000원
“그저 빨치산의 딸을 벗고, 리얼리즘도 벗고, 가벼이 한없이 가벼이, 먼지처럼 바람처럼, 온 데 없이 갈 데 없이, 놀아보고 싶어서다.”
정지아(
사진)의 소설집 <자본주의의 적> 맨앞에 실린 표제작에서 화자는 이 소설을 쓰기로 작정한 까닭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정지아 자신의 육성이라 믿는 것은 순진한 독법이겠지만, 여기에 작가의 속내가 어느 정도 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아주 황당한 노릇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적’의 작의(作意)을 설명하는 이 대목은 이 소설집 전체에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법하다. 1990년 자전적 장편소설 <빨치산의 딸>을 내며 등단한 이래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빨치산의 딸’이라는 형용어가 떠나지 않았고, 생물학적·이념적 출신으로부터 그는 자유롭기 힘들었다.
‘자본주의의 적’이라는 제목은, 독자의 기대와는 달리, 이념이니 혁명이니 하는 것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화자의 대학 시절 친구인 방현남과 그의 가족은 “무엇이 되려 하지 않”고 “간절히 하고 싶은 것도, 죽도록 하기 싫은 것도 없”는 무욕과 무념무상의 인간들이다. “빨치산의 딸”인 화자조차도 “욕망으로 가득 찬, 자본주의적 인간”이 된 세상에서 방현남의 가족은 “자본주의의 동력 그 자체인 욕망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안티테제로 구실한다. “불운한 인류의 쉼표”와도 같은 이들 덕분에 “이 욕망덩어리의 세계도 폭발하지 않고 지속되는지 모른다”고, 화자는 크게 깨닫는다.
‘문학박사 정지아의 집’이라는 파격적인 제목을 지닌 작품과 ‘검은 방’ ‘우리는 어디까지 알까’ 등의 단편에도 작가를 연상시키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 작품들에서 정지아는 빨치산 출신(‘우리는 어디까지 알까’에서는 불분명)인 어머니가 있는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다. ‘문학박사…’가 순박한 이웃들과 인정을 나누며 사는 일상을 콩트적 구성에 담았다면, ‘검은 방’은 아흔아홉 살 나이에 이른 빨치산 출신 어머니가 기억과 현실을 오가며 삶을 결산하는 모습을 담았다. 산골에 어둠이 찾아올 때에야 비로소 기억들은 생생하게 살아나고, 검은 방은 카메라 옵스큐라(어두운 방)처럼 지난 시간들을 노인의 머릿속에 인화시킨다. 위암에 걸린 상태에서도 술을 끊지 못하는 사촌동생 택이는 같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등진 제 아비처럼 “사방이 시커먼 허방”인 것이 두려워 술에 기댄다는데, 택이 부자의 시커먼 허방과 빨치산 어머니의 검은 방은 다르면서도 같은 것처럼 보인다.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