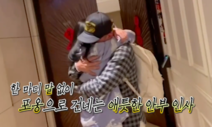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책&생각] 정아은의 책들 사이로
심장에 수놓은 이야기
구병모 지음/아르테(2020)
살면서 받는 상처는 어디로 갈까. 육체적 상처는 치료되지만, 정신적 상처는 남는다. 상처 받은 이의 내부에 남아 독이 되어 소용돌이치다가 조금씩 몸을 빠져나간다. 많거나 적은 양이, 가깝거나 먼 이들에게, 다양한 양태로 건너간다. 흘러다니는 독에 색깔을 입혀 눈에 보이게 한다면 사람들은 차마 지금처럼 서로에게 상처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독의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오늘 만난 이에게 치명적인 독을 불어넣고, 내일 만나는 이에게서 대량의 독을 주입받는다.
사회학과 심리학은 이 투명한 독에 색깔을 입히는 학문이다. 전자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후자는 개개인의 차원에서 오가는 독을 파헤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원의 일을 합쳐서 해내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다. 공동체적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을 함께 버무려 구체적인 삶의 단면으로 형상화해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소설이다. 소설은 인간이라는 질료를 통해, 개개인이 매순간 살아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생의 단면을, 생의 구석구석에서 오가는 독성 어린 기류의 흐름을 또렷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비로소 알게 된다. 내가 과거에 어떤 독을 뿌리고 다녔는지, 누군가가 내게 어떤 독을 흘려넣고 떠났는지.
인간들이 주고받는 독을 그리는 소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독을 주고받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방식이고, 하나는 독의 교환과정을 그린 뒤 그에 대한 대안 혹은 바람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독자에게 ‘자기성찰’의 기회를 주고, 후자는 독자에게 훈훈함과 감동을 준다. 나는 전자의 소설을 선호하는 편이다. 결국 타인이 말이나 글로써 해줄 수 있는 최대치는 자기성찰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장에 수놓은 이야기>는 후자에 속하는 소설이다. 추리소설 분위기를 풍기며 전개되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 불쑥 판타지의 세계로 넘어간다. 길지 않은 분량의 책을 단숨에 읽어 내린 뒤, 나는 의아함에 휩싸였다.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바람 제시’과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켜켜이 쌓인 상처의 일부분이 작가가 창조해낸 환상적인 요소에 녹아들어 일순간 연소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현상을 ‘카타르시스’라 하는 걸까. 이 소설을 통과하며 알았다.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소설인가, ‘대안제시’형인가 하는 분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작가의 깊고 따뜻한 세계관이 들어가고 공들인 묘사가 있으면 그것이 곧 좋은 소설일지니. 그리고 좋은 소설은, 판타지니, 추리소설이니, 순문학이니, 대중문학이니 하는 경계선을 훌쩍 넘어가버린다. 어느 장르에도 속할 수 있고 또한 어느 장르에도 갇히지 않는, 좋은 소설 본연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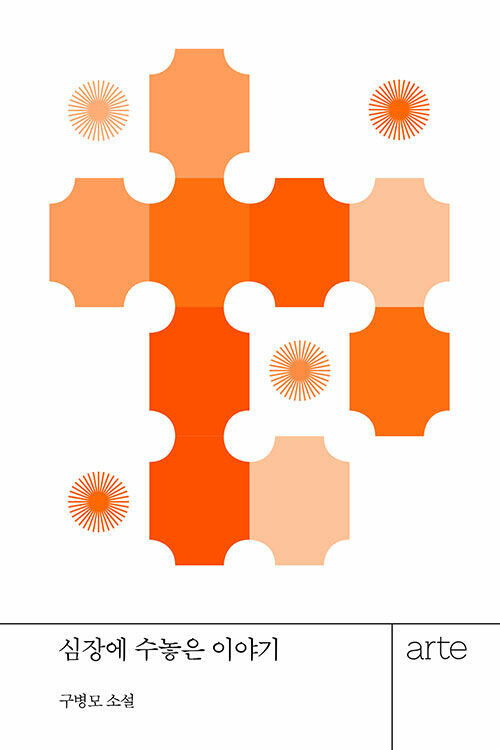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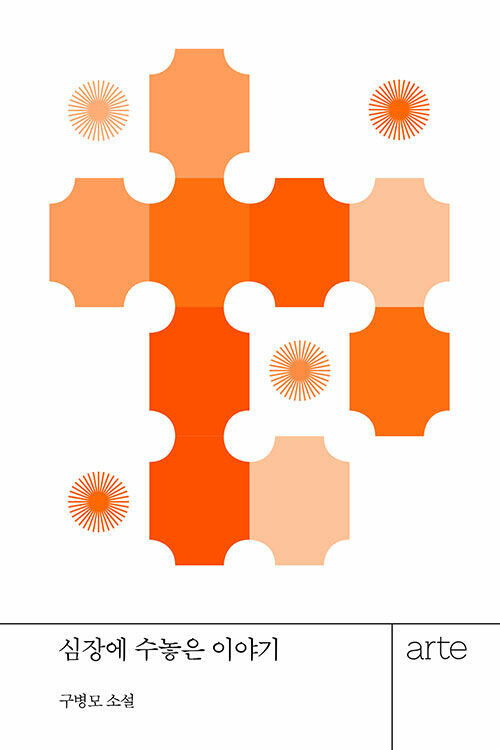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이별의 원칙은 이다지도 가혹하여 당신은 버둥대리라 [책&생각] 이별의 원칙은 이다지도 가혹하여 당신은 버둥대리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2/53_17032075519796_2023122150396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