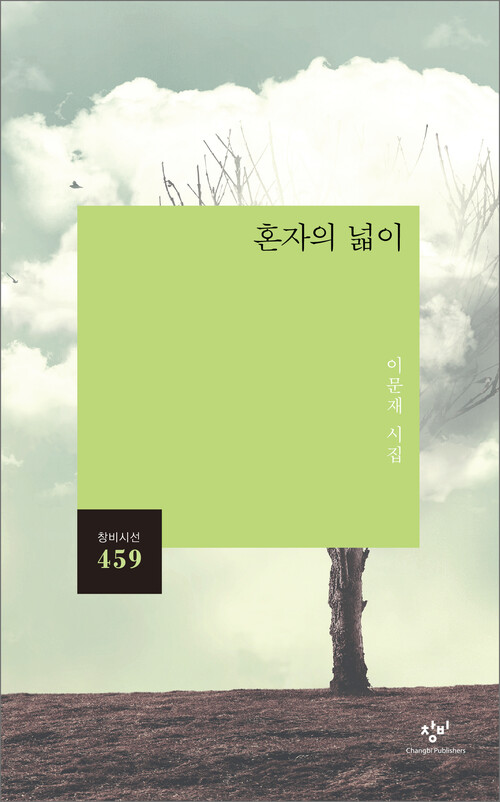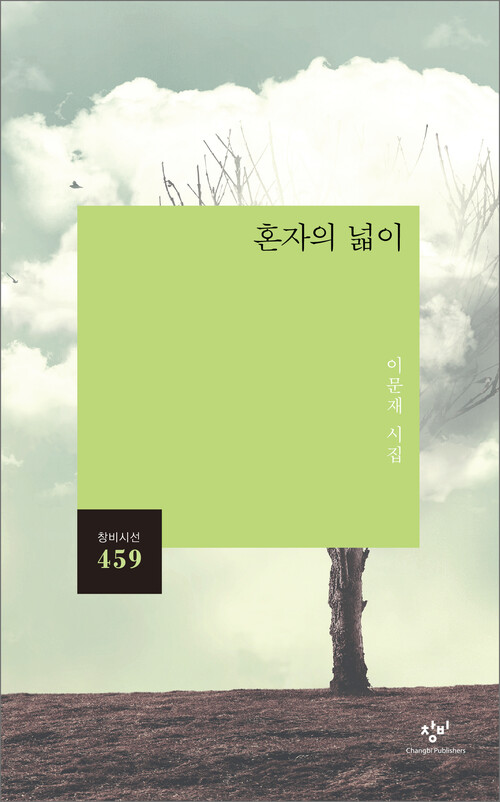시력 40년을 맞아 여섯 번째 시집 <혼자의 넓이>를 펴낸 이문재 시인. “나만의 생일/ 혼자만의 생일은 없다/ (…) / 누군가의 생일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생일이다”(‘생일 생각’)라고 썼다. 훤강 제공
혼자의 넓이
이문재 지음/창비·9000원
이문재 시인은 1982년 동인지 <시운동>에 작품을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해 올해로 시력(詩歷) 40년을 맞았다. 지난 시집 <지금 여기가 맨 앞> 이후 7년 만에 내놓은 <혼자의 넓이>는 그 40년 동안 그가 펴낸 여섯 번째 시집. 평균 7년에 한 권꼴이니 과작인 셈이다.
몽상, 편력, 산책, 부사(副詞), 느림, 농업, 오지, 제국…. 이문재 시의 40년을 돌이켜보면 이런 몇 개의 열쇳말이 떠오른다. 젊은 몽상가이자 방랑자에서 초로의 교수로 신분이 바뀌는 동안 그의 시 세계에도 적지 않은 변모와 진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알짬이 있다면 생태적 상상력이 그것이라 하겠다. 2019년에 한 어느 대담에서 그는 “저는 식량, 에너지, 땅, 지구, 이런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거니와, 그의 생태적 관심은 호가 나 있다.
그가 지난해 6월25일 숨진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을 좇으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 한다는 사실 역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시집에도 김종철을 추모하는 시 ‘남녘 사십구재’가 실려 있고, 이 작품에서 그는 김종철을 계승하되 “김종철과 더불어 김종철을 넘어서려는 ‘자기만의 김종철’”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한다.
앞서 언급한 2019년 대담에서 이문재는 자신이 “시적 완성도냐 시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냐”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요즘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 장르를 활용해 경고 시그널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난화와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사태의 심각성이 그로 하여금 미학적 고민을 할 마음의 여유를 지니지 못하게 한다는 것. 군사독재의 엄혹한 80년대를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맞섰던 그가 뒤늦게(?) ‘참여문학’을 표방하는 형국이다. 이번 시집에서도 생태적 문제의식을 담은 작품들은 그답지 않게 직설적이고 노골적이어서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고 음미할 여지를 거의 주지 않는다.
“소가 제 꼬리를 휘둘러 쇠파리를 쫓는다// 물에서 나온 개가 부르르 몸서리치며 물방울을 털어낸다// 아토피에 걸린 어린아이가 밤새도록 제 살을 긁는다// 지구가 무서운 속도로 자전하는 까닭을 알겠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광욕하는 이유를 알겠다// 피부병이 도져서 그러는 것이다// 제 살갗에 들러붙은 것들을 떼어버리려는 것이다// 태양광의 힘으로 소독하려는 것이다”(‘지구 생각’ 전문)
“모든 아버지가 아들딸의 미래를 끊임없이 훔쳐온 것이다/ (…) / 아버지가 가진 것은 죄다 불법이다 죄다 장물이다/ 아버지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죄의 목록이 길어지고/ 아버지가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진다// 미래를 미래에게 돌려줘야 한다”(‘삼대-미래를 미래에게’ 부분)
제목에서부터 ‘혼자’를 내세운 이번 시집에는 혼자를 다룬 시들이 여럿 실렸다. “우리 혼자도 서편 하늘이 붉어질 때면/ 누군가의 안쪽으로 스며들고 싶어한다”(‘혼자의 넓이’), “혼자는 바쁩니다/ 외롭거나 쓸쓸할 겨를이 없습니다”(‘우리의 혼자’), “혼자가 연락했다/ 혼자가 먼저 신호를 보내왔다”(‘혼자가 연락했다’) 등이 몇 예다. 시인은 왜 혼자에 주목하는 걸까. 시집 말미에 실린 ‘시인의 말’조차 그는 ‘혼자의 팬데믹’이라는 시로 대신하는데, 이 작품에서 그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혼자 살아본 적 없는/ 혼자가 혼자 살고 있다// (…) // 혼자가 혼자들 틈에서 저 혼자/ 혼자들을 두고 혼자가 자기 혼자// (…) // 이 낯선 처음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정 새로운 처음인지/ 혼자서는 깨닫기 힘든 혼자의 팬데믹이다”
이 글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쓴 것이지만, 혼자를 다룬 시집 속의 작품들이 모두 최근 1, 2년 사이의 것은 아닐 테다. 팬데믹 이전에도 시인은 ‘혼자’가 부각되는 현상과 그것이 알려주는 바를 깊이 궁구했다는 뜻이겠다. 그가 생각하는 혼자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독거가 곳곳에 있다 가족과 함께 살든, 학교에 다니든/ 군대에 갔다 왔든, 지금 군대에 있든, 가야 하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미혼이든 비혼이든/ 아니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도처에 독거청년이 있다”(‘활발한 독거들의 사회’ 부분)
혼자의 한자 표현이라 할 ‘독거’가 반드시 가족이나 친지 없이 혼자 사는 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결혼을 했고 가족이 있는 이도 독거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 가정의 안과 밖에서 저마다 독거를 하다 보니 “독거와 독거가 거대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활발한 독거들의 사회’)는 것이 시인의 관찰이다. 식탁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저마다 코를 박고 있는 스마트폰이 그런 독거의 원인이자 결과로 지목되기도 한다. 스마트폰은 자족적인 독거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 독거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이기도 하다. 그런데 삶이란 결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 시인의 생각이다.
“혼자 살아보니/ 혼자가 아니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시끄러웠다/ 없는 사람 없던 사람/ 매번 곁에 와 있었다/ 혼자 마시는 술도 시끌벅적// (…) // 혼자 있어보니/ 혼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나는 나 아닌 것으로 나였다”(‘혼자와 그 적들’ 부분)
오해하지 말 일이다. 그가 개인에 비해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그 역시 누구 못지 않게 혼자를 중시하고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그가 생각하는 혼자는 다른 혼자 역시 챙기고 존중하는 혼자, 말하자면 더불어 사는 혼자다. ‘화이부동 존이구동’(和而不同 存異求同)으로 요약될 혼자의 넓이와 깊이가 시력 40년 이문재가 도달한 결론이라 하겠다.
“저마다 혼자 울어도/ 지금 어디선가 울고 있을 누군가/ 어디선가 지금 울음 그쳤을 누군가/ 어디에선가 이쪽 하늘을 향해 홀로 서 있을/ 그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혼자 있음이 넓고 깊어질 수 있도록”(‘혼자 울 수 있도록-오래된 기도 3’ 부분)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