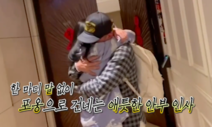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모바일게임 점점 레드오션으로
차승원이 커다란 칼을 휘두르고 유인나가 메탈 부츠를 신는다. 이병헌은 땅에서 쌍칼을 뽑아낸다. 이정재는 천둥 치는 바위 위에 서서 악마들이 올라오는 것을 쳐다보다 전투에 나선다. <반지의 제왕>의 ‘레골라스’ 올랜도 블룸도 합세한다. 철갑을 입은 그가 있는 곳도 이 세상은 아닌 것 같다. 영화배우들이 현실에 없는 세상을 배회하고 있다. 모두 게임 광고들이다.
차승원과 유인나는 넷마블 ‘레이븐 위드 네이버’의 광고 모델로 나섰고, 이정재는 로켓모바일의 ‘고스트’ 광고에서 악을 응징하는 존재로 내세워졌다. 이병헌은 자신의 부활을 게임 광고 넷마블의 ‘이데아’를 통해서 알렸다. 올랜도 블룸은 ‘네시삼십삼분’(4:33)의 ‘로스트 킹덤’을 위해 칼을 들었다(2016년 1분기 출시 예정). 정우성, 하정우, 황정민, 장동건, 김남길, 이범수, 조재현, 공승연, 서인국, 유해진, 최민수, 박보영, 박성웅, 마동석, 류승룡에 목소리 출연한 이선균, 코미디언 장도연, 유상무, <무한도전><런닝맨><비정상회담>의 멤버들까지, 올 한 해 게임 없었으면 어떻게 광고 시장이 움직였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이 몰려왔다’. 어느새 우리 주변을 온통 뒤덮고 있는 게임 광고를 통해 게임 산업의 변화를 들여다봤다.
앱 이용자 비중 하향세 뚜렷한데
차승원·이병헌·이정재 등 내세워
TV·지하철 등 곳곳서 ‘광고 전쟁’ 초반 점유율이 업체 운명 좌우
순위따라 하루 매출 수억원 차이
넘쳐나는 게임수도 경쟁 부추겨 게임시간·다운로드·방문 횟수 등
상위권 업체는 데이터 분석 공세
소규모 업체는 힘겹게 뒤쫓아가 ■ 맛없는 액션, 남성적 시선 톱스타들이 나섰지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광고는 비슷비슷하다. 황정민이 나오는 광고의 슬로모션은 식은 죽처럼 맛없고(‘애스커’), 장동건은 일껏 나와선 게임 화면에 집중해 있다가 “함께 하자” 말한다(‘뮤오리진’). 하정우도 방에 앉아서 “말처럼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는 게임은 드물다”며 액션 없이 ‘말’을 한다(‘크로노블레이드 위드 네이버’). 여성의 비현실적인 곡선을 탐하는 게임의 ‘남성적 시선’은 광고에서도 그대로다. ‘레이븐 위드 네이버’에서 차승원은 집에서 만든 칼을 들고 전투에 나선다. 부츠를 신은 유인나는 톱모델처럼 걷고 카메라는 음미하듯이 몸을 훑는다. ‘갓오브하이스쿨’의 박보영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저기… 해봤어요. 왜 말을 못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말해요. 남자가 뭐야, 하고 싶은 때 하는 거지”라고 말한다. ‘히트’는 잔인한 묘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처분(11월11일자)을 받기도 했다. 광고는 흰옷을 입은 백인 소녀가 잔인한 폭력 현장을 목격하는 스토리다. 이 광고는 “게임 내 스토리·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했다”는 제작 의도를 밝힌 바 있다. 2014년의 게임업계의 최대 화제는 ‘클래시 오브 클랜’의 대대적인 광고 공세였다. 핀란드의 모바일게임 회사 슈퍼셀이 2013년 내놓은 이 게임은 전세계 게임 시장을 석권했고,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한 달 100억원을 들인 광고 물량 공세를 벌여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1위 왕좌를 6개월간 더 수성했고 이후에도 상위권을 지켰다. ‘클래시 오브 클랜’의 이런 전략은 업계의 ‘게임의 법칙’을 바꿨다. 한국 게임업계도 앞다퉈 톱스타를 기용해 ‘물량공세’에 나섰다. ■ 게임, 나 빼고 다 하는 걸까 카카오톡을 주요 기반으로 한 퍼즐게임 ‘애니팡’은 한밤중에 울리는 도움 요청, 민폐가 되어버린 ‘하트’까지 일상을 흔드는 ‘실체’였다. 하지만 톱스타를 앞세워 대량 물량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액션 아르피지(Role-Playing Game, 롤플레잉 게임)의 ‘플레이 붐’을 실감하게 하는 현상은 정작 찾아보기 힘들다. “도대체 누가 한다고 저렇게 광고를 하지?” 나 빼고 다 하는 걸까? 코리안클릭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애니팡’으로 90%까지 올랐던 게임 도달률(스마트폰 소지자 표본집단 중 게임 앱 이용자 비율)은 게임 광고 전쟁이 시작된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4년 1월 81%, 7월 77%였고 2015년 1월 73%, 7월 66%로 점점 낮아졌다. 11월에는 68% 수준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애니팡’ 시절에는 30~40대 여성이 새롭게 모바일 시장으로 영입되었지만, 롤플레잉 광고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은 게임하는 사람이 크게 늘지 않았다”며 “게임 광고를 하게 되면 비슷한 게임을 하던 사람이 광고하는 게임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게임평론가는 기존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광고 효과의 큰 부분이라고 말한다. “유저(게임 사용자)들이 돈을 쓸 때 꺼리는 부분이 해당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다. 게임 광고가 대대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정도 투자하니 오래 서비스를 하겠구나’ 하며 신뢰하게 된다. 광고는 돈을 써서 유저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우성이 ‘난투 위드 네이버’ 광고에서 하는 말대로다. “강한 자가 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탑을 차지하는 자가 강한 것이다.” 강한 자가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하는 자가 강하다.
■ 초반 점유율이 운명을 좌우한다 ‘1위’가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이다. 게임 수익은 구글플레이 스토어 기준 10위 안에 들면 하루 매출 1억원, 5위 안이면 5억원 이상, 1위는 10억원이 넘는다. 한 게임 개발업체의 개발자는 “모든 앱들이 비슷하지만 게임은 특히 명확한 롱테일 그래프(초반에 올랐다가 끝 부분으로 가면 줄어드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 초반 점유율이 그 게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초반에 기세를 잡으면 게임 매출의 스케일이 달라진다.
액션 아르피지 게임에서는 그 특성이 더 강화된다. “액션 아르피지는 전통적으로 몰입 유저들이 많다. 게임에는 ‘학습효과’가 있다. 현재 대세인 게임을 유저들이 학습하고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이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게임 종류가 늘면서 경쟁도 심해진다.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데는 아무리 짧아도 1년이 걸리지만 모바일게임의 경우에는 몇 명이 3개월 걸려 뚝딱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전에는 하나의 온라인게임에 사력을 기울이던 게임회사들은 이제 비슷한 아르피지 게임들을 2~3개씩 보유하고 있다.
경쟁이 심해지니 말이 거칠어지기도 한다. <몬스터 길들이기>가 게임 캐릭터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무렵, 경쟁업체가 내세운 게임은 <몬스터 길들이기>의 캐릭터 이름을 빗대 이벤트를 비난하는 문구를 지하철에 광고하기도 했다.
■ 목표는 당신이 아닌, ‘충성도’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시즌 직전이 게임 시장의 성수기였다. 방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콘솔(플레이스테이션 등의 게임기) 등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고 겨울방학 동안 게임을 하게 유도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신혼여행 가서도 게임 접속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게임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한 정보기술(IT)업체 개발자의 말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게임 등의 등장으로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게임에 몰입하게 되면서, 충성도 높은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나면 수익은 어떻게든 발생한다.
<2015 게임백서>(콘텐츠진흥원)를 보면, ‘한 달간 모바일게임 구입 총 비용’(302명 조사)을 물은 결과 5000원 미만은 응답자의 29.1%, 5000~1만원 22.5%, 1만~3만원 36.4%, 3만원 이상 12.0%에 이른다. 비용을 게임 내 결제로 좁혀도 1만~3만원이 31.8%, 3만원 이상 7.6%에 이른다.
한 게임평론가는 “게임업계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정교하게 집적해왔다. 게임은 다운로드, 게임시간, 방문 수, 이벤트별 결제율 등 세세한 기록이 가능하고, 현재 대대적인 광고는 그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비용 대비 수익에 대한 데이터에 맞춰 광고 물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게임업계도 양극화되어 있다. 소규모 게임업체들은 이미 막대한 광고 물량을 쏟아붓고 있는 대규모 업체들을 힘겹게 뒤쫓아간다. 한 게임평론가는 “상위의 서너개 회사를 제외하면,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 어려운 중소업체들도 많다. 선두에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하는 중급의 회사들이 많이 늘었다”고 말한다. 지난달 <화이트데이>라는 게임을 14년 만에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한 중견업체 로이게임즈의 직원은 “텔레비전 광고 같은 ‘고가’의 광고 플랫폼 말고는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애니팡’ 시절에는 30~40대 여성이 새롭게 모바일 시장으로 영입되었지만, 롤플레잉 광고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은 게임하는 사람이 크게 늘지 않았다”며 “게임 광고를 하게 되면 비슷한 게임을 하던 사람이 광고하는 게임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게임평론가는 기존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광고 효과의 큰 부분이라고 말한다. “유저(게임 사용자)들이 돈을 쓸 때 꺼리는 부분이 해당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다. 게임 광고가 대대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정도 투자하니 오래 서비스를 하겠구나’ 하며 신뢰하게 된다. 광고는 돈을 써서 유저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우성이 ‘난투 위드 네이버’ 광고에서 하는 말대로다. “강한 자가 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탑을 차지하는 자가 강한 것이다.” 강한 자가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하는 자가 강하다.
■ 초반 점유율이 운명을 좌우한다 ‘1위’가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이다. 게임 수익은 구글플레이 스토어 기준 10위 안에 들면 하루 매출 1억원, 5위 안이면 5억원 이상, 1위는 10억원이 넘는다. 한 게임 개발업체의 개발자는 “모든 앱들이 비슷하지만 게임은 특히 명확한 롱테일 그래프(초반에 올랐다가 끝 부분으로 가면 줄어드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 초반 점유율이 그 게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초반에 기세를 잡으면 게임 매출의 스케일이 달라진다.
액션 아르피지 게임에서는 그 특성이 더 강화된다. “액션 아르피지는 전통적으로 몰입 유저들이 많다. 게임에는 ‘학습효과’가 있다. 현재 대세인 게임을 유저들이 학습하고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이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게임 종류가 늘면서 경쟁도 심해진다.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데는 아무리 짧아도 1년이 걸리지만 모바일게임의 경우에는 몇 명이 3개월 걸려 뚝딱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전에는 하나의 온라인게임에 사력을 기울이던 게임회사들은 이제 비슷한 아르피지 게임들을 2~3개씩 보유하고 있다.
경쟁이 심해지니 말이 거칠어지기도 한다. <몬스터 길들이기>가 게임 캐릭터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무렵, 경쟁업체가 내세운 게임은 <몬스터 길들이기>의 캐릭터 이름을 빗대 이벤트를 비난하는 문구를 지하철에 광고하기도 했다.
■ 목표는 당신이 아닌, ‘충성도’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시즌 직전이 게임 시장의 성수기였다. 방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콘솔(플레이스테이션 등의 게임기) 등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고 겨울방학 동안 게임을 하게 유도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신혼여행 가서도 게임 접속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게임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한 정보기술(IT)업체 개발자의 말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게임 등의 등장으로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게임에 몰입하게 되면서, 충성도 높은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나면 수익은 어떻게든 발생한다.
<2015 게임백서>(콘텐츠진흥원)를 보면, ‘한 달간 모바일게임 구입 총 비용’(302명 조사)을 물은 결과 5000원 미만은 응답자의 29.1%, 5000~1만원 22.5%, 1만~3만원 36.4%, 3만원 이상 12.0%에 이른다. 비용을 게임 내 결제로 좁혀도 1만~3만원이 31.8%, 3만원 이상 7.6%에 이른다.
한 게임평론가는 “게임업계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정교하게 집적해왔다. 게임은 다운로드, 게임시간, 방문 수, 이벤트별 결제율 등 세세한 기록이 가능하고, 현재 대대적인 광고는 그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비용 대비 수익에 대한 데이터에 맞춰 광고 물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게임업계도 양극화되어 있다. 소규모 게임업체들은 이미 막대한 광고 물량을 쏟아붓고 있는 대규모 업체들을 힘겹게 뒤쫓아간다. 한 게임평론가는 “상위의 서너개 회사를 제외하면,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 어려운 중소업체들도 많다. 선두에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하는 중급의 회사들이 많이 늘었다”고 말한다. 지난달 <화이트데이>라는 게임을 14년 만에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한 중견업체 로이게임즈의 직원은 “텔레비전 광고 같은 ‘고가’의 광고 플랫폼 말고는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차승원·이병헌·이정재 등 내세워
TV·지하철 등 곳곳서 ‘광고 전쟁’ 초반 점유율이 업체 운명 좌우
순위따라 하루 매출 수억원 차이
넘쳐나는 게임수도 경쟁 부추겨 게임시간·다운로드·방문 횟수 등
상위권 업체는 데이터 분석 공세
소규모 업체는 힘겹게 뒤쫓아가 ■ 맛없는 액션, 남성적 시선 톱스타들이 나섰지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광고는 비슷비슷하다. 황정민이 나오는 광고의 슬로모션은 식은 죽처럼 맛없고(‘애스커’), 장동건은 일껏 나와선 게임 화면에 집중해 있다가 “함께 하자” 말한다(‘뮤오리진’). 하정우도 방에 앉아서 “말처럼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는 게임은 드물다”며 액션 없이 ‘말’을 한다(‘크로노블레이드 위드 네이버’). 여성의 비현실적인 곡선을 탐하는 게임의 ‘남성적 시선’은 광고에서도 그대로다. ‘레이븐 위드 네이버’에서 차승원은 집에서 만든 칼을 들고 전투에 나선다. 부츠를 신은 유인나는 톱모델처럼 걷고 카메라는 음미하듯이 몸을 훑는다. ‘갓오브하이스쿨’의 박보영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저기… 해봤어요. 왜 말을 못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말해요. 남자가 뭐야, 하고 싶은 때 하는 거지”라고 말한다. ‘히트’는 잔인한 묘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처분(11월11일자)을 받기도 했다. 광고는 흰옷을 입은 백인 소녀가 잔인한 폭력 현장을 목격하는 스토리다. 이 광고는 “게임 내 스토리·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했다”는 제작 의도를 밝힌 바 있다. 2014년의 게임업계의 최대 화제는 ‘클래시 오브 클랜’의 대대적인 광고 공세였다. 핀란드의 모바일게임 회사 슈퍼셀이 2013년 내놓은 이 게임은 전세계 게임 시장을 석권했고,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한 달 100억원을 들인 광고 물량 공세를 벌여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1위 왕좌를 6개월간 더 수성했고 이후에도 상위권을 지켰다. ‘클래시 오브 클랜’의 이런 전략은 업계의 ‘게임의 법칙’을 바꿨다. 한국 게임업계도 앞다퉈 톱스타를 기용해 ‘물량공세’에 나섰다. ■ 게임, 나 빼고 다 하는 걸까 카카오톡을 주요 기반으로 한 퍼즐게임 ‘애니팡’은 한밤중에 울리는 도움 요청, 민폐가 되어버린 ‘하트’까지 일상을 흔드는 ‘실체’였다. 하지만 톱스타를 앞세워 대량 물량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액션 아르피지(Role-Playing Game, 롤플레잉 게임)의 ‘플레이 붐’을 실감하게 하는 현상은 정작 찾아보기 힘들다. “도대체 누가 한다고 저렇게 광고를 하지?” 나 빼고 다 하는 걸까? 코리안클릭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애니팡’으로 90%까지 올랐던 게임 도달률(스마트폰 소지자 표본집단 중 게임 앱 이용자 비율)은 게임 광고 전쟁이 시작된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4년 1월 81%, 7월 77%였고 2015년 1월 73%, 7월 66%로 점점 낮아졌다. 11월에는 68% 수준이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