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싱글벙글 뒤에선 아등바등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원고를 계속 써오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날카로운 풍자로 청취자들에게서 한결같이 사랑을 받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문화방송 라디오(표준FM 95.9Mhz) 프로그램 <싱글벙글쇼>(매일 낮 12시25분·연출 김승월·진행 강석 김혜영) 원고를 지난 1986년부터 집필해온 박경덕(47) 작가는 라디오 작가계의 전설로 불린다.
1973년 첫 방송을 시작해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진행자들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의 청취율 조사에서 줄곧 3위 이내를 지켜온 <싱글벙글쇼>. 그 뒤에는 바로 방송작가계의 대부 박경덕 작가가 있었다.
86년부터 갈비뼈 금간 하루 빼고
등에 칼을 꽂은 기분으로 작품 써
졸곧 청취율 3위안 지키고
라디오 작가계 전설로 남았다 “혼자서 17년 동안 <싱글벙글쇼> 원고를 모두 써오다 지금은 ‘시사스포츠’ ‘양심보감’ ‘돌도사’ 등 5꼭지만 쓰고 있어요. 특히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양심보감’과 87년 전파를 타기 시작한 장수코너 ‘돌도사’에 남다른 애착이 갑니다.” <싱글벙글쇼> 외에 누구나 알 만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전파견문록> <코미디하우스>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 같은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역시 그의 손끝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그는 글쓰기를 농사짓는 것에 비유했다. “농삿일은 1년을 하건 20년을 하건 항상 힘들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면서 엄청난 정보가 매일 쏟아져 나와요. 그걸 선별하는 것만도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박 작가는 기획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매일 여러 신문을 꼼꼼히 읽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아이템을 정리합니다. 인터넷이 도입되기 전에는 정기구독하는 신문만 10개가 넘었어요.”
매일같이 생방송 원고를 쓴다는 건 ‘피를 말리는’ 일일 텐데, 어떻게 20년이나 할 수 있었을까? “원고를 쓰려면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첫 꼭지는 꼭 생방송 1시간 전부터 쓰기 시작하죠. 벼랑 끝에 몰리면 집중이 잘 되거든요. 당나라 때의 명문가인 왕유가 ‘쫓기지 않으면 명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 말을 실감합니다.” 어떨 때는 생방송 중에 원고를 써서 스튜디오 부스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단다. 그는 “마치 등에 칼을 꽂은 채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20년 동안 원고를 쓰지 못한 건 갈비뼈에 금이 가서 팔을 움직이기 힘들었을 때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싱글벙글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진행자 강석과 김혜영과의 관계는 어떨까? “친하다기보다는 한 식구죠. 누군가와 친해졌을 때 친구라고는 해도 식구라고는 잘 안하잖아요? 식구라는 건 영혼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예요.” 박 작가는 “거의 20년을 팀웍 안 깨뜨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데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며, “그 두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하지는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사람이 <싱글벙글쇼>의 색깔을 만들어준 당사자들”이라고 덧붙였다. 20년 가까이 함께 방송한 만큼 에피소드도 많다. 제주에서 결혼하게 된 김혜영 때문에 결혼식장과 현지 스튜디오에서 이원방송을 한 적이 있고, 교통체증으로 스튜디오에 도착하지 못한 강석과는 원효대교와 스튜디오를 잇는 이원방송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 같은 다매체 시대에 라디오는 외로운 사람이나 아쉬운 게 많은 이들이 주로 듣는 ‘정(情)’의 매체라고 규정했다. “라디오는 혼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매체지요. 텔레비전은 모여서 같이 봐도 라디오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혼자 듣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정(情)’을 가진 매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급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좋은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신을 돌아보고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는 것이 그의 방송작가관. 그는 유홍준씨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문에 옛 문인의 말을 인용해서 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이 전과 같지 않더라”라는 구절을 늘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글벙글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으로 남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왔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원고를 씁니다.” 글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사진 강재훈 기자 khan@hani.co.kr
등에 칼을 꽂은 기분으로 작품 써
졸곧 청취율 3위안 지키고
라디오 작가계 전설로 남았다 “혼자서 17년 동안 <싱글벙글쇼> 원고를 모두 써오다 지금은 ‘시사스포츠’ ‘양심보감’ ‘돌도사’ 등 5꼭지만 쓰고 있어요. 특히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양심보감’과 87년 전파를 타기 시작한 장수코너 ‘돌도사’에 남다른 애착이 갑니다.” <싱글벙글쇼> 외에 누구나 알 만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전파견문록> <코미디하우스>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 같은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역시 그의 손끝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그는 글쓰기를 농사짓는 것에 비유했다. “농삿일은 1년을 하건 20년을 하건 항상 힘들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면서 엄청난 정보가 매일 쏟아져 나와요. 그걸 선별하는 것만도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박 작가는 기획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매일 여러 신문을 꼼꼼히 읽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아이템을 정리합니다. 인터넷이 도입되기 전에는 정기구독하는 신문만 10개가 넘었어요.”
매일같이 생방송 원고를 쓴다는 건 ‘피를 말리는’ 일일 텐데, 어떻게 20년이나 할 수 있었을까? “원고를 쓰려면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첫 꼭지는 꼭 생방송 1시간 전부터 쓰기 시작하죠. 벼랑 끝에 몰리면 집중이 잘 되거든요. 당나라 때의 명문가인 왕유가 ‘쫓기지 않으면 명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 말을 실감합니다.” 어떨 때는 생방송 중에 원고를 써서 스튜디오 부스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단다. 그는 “마치 등에 칼을 꽂은 채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20년 동안 원고를 쓰지 못한 건 갈비뼈에 금이 가서 팔을 움직이기 힘들었을 때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싱글벙글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진행자 강석과 김혜영과의 관계는 어떨까? “친하다기보다는 한 식구죠. 누군가와 친해졌을 때 친구라고는 해도 식구라고는 잘 안하잖아요? 식구라는 건 영혼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예요.” 박 작가는 “거의 20년을 팀웍 안 깨뜨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데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며, “그 두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하지는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사람이 <싱글벙글쇼>의 색깔을 만들어준 당사자들”이라고 덧붙였다. 20년 가까이 함께 방송한 만큼 에피소드도 많다. 제주에서 결혼하게 된 김혜영 때문에 결혼식장과 현지 스튜디오에서 이원방송을 한 적이 있고, 교통체증으로 스튜디오에 도착하지 못한 강석과는 원효대교와 스튜디오를 잇는 이원방송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 같은 다매체 시대에 라디오는 외로운 사람이나 아쉬운 게 많은 이들이 주로 듣는 ‘정(情)’의 매체라고 규정했다. “라디오는 혼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매체지요. 텔레비전은 모여서 같이 봐도 라디오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혼자 듣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정(情)’을 가진 매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급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좋은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신을 돌아보고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는 것이 그의 방송작가관. 그는 유홍준씨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문에 옛 문인의 말을 인용해서 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이 전과 같지 않더라”라는 구절을 늘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글벙글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으로 남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왔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원고를 씁니다.” 글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사진 강재훈 기자 k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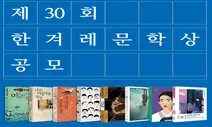


![‘믿음’이 당신을 구원, 아니 파멸케 하리라 [.txt] ‘믿음’이 당신을 구원, 아니 파멸케 하리라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3/20250123504340.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