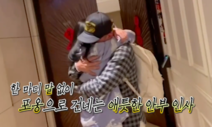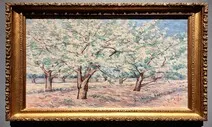벨기에 토이 감독, 이창동을 만나다
토이감독 부천영화제 출품작
종이에 쓴 ‘이창동’ 장면 화제
종이에 쓴 ‘이창동’ 장면 화제
지금 경기도 부천에서는 13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16~26일)가 열리고 있다. 판타지, 에스에프, 호러 등 장르 영화들의 향연인 이 영화제에서, 장르 영화와는 거리가 먼 한국의 이창동 감독에게 오마주를 바치는 영화가 있어 화제다. ‘오프 더 판타스틱 부문’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는 벨기에의 젊은 여성 감독 파트리스 토이의 <노웨어 맨>이다.
토이 “영화는 현실 비추는 각성제”
이창동 “탈시공 영화는 독약같은 것”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던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은 죽음을 가장하고 머나먼 섬나라로 떠난다. 세월이 흘러 옛날이 그리워진 그는 다시 아내 곁으로 돌아오지만 아내에게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겼다. 노숙자 신세로 공항에서 선잠을 자던 그는 꿈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다. 한글로 ‘이창동’이라고 적힌 종이를 든 이 여자가 “당신이 이창동이냐”고 묻자, 그는 “아무렴 어때”라며 여자를 쫓아간다. 부천에서 만난 두 감독과의 대화는 이 장면으로부터 출발했다. -영화에서 ‘이창동’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뭔가?
(토이) “이 영화는 과거를 잊으려는 남자의 얘기다. 그는 이름을 세번이나 바꾸면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다. 완벽한 자유를 추구하지만 자유로워질 수 없고, 과거를 잊고 싶지만 잊어버릴 수 없는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인 남자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현명한 사람의 이름과 대조시키고 싶었다.” 이 감독과 토이 감독은 2006년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 각각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처음 만났다. 타이거상(대상) 수상자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토이 감독이 이 감독 편을 들어줘 뜻을 관철할 수 있었다고 한다. 토이 감독은 “심사위원장일 때 이 감독님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내게 여러 시간을 생각하게 했다”며 “감독님의 <오아시스>를 보고 존경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토이
“매맞고 학살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무관심” -지금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영화감독으로서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다. (토이) “벨기에와 한국의 상황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질병을 앓고 있다. 유럽이라는 높은 장벽에 갇혀 다른 세계에 철저히 무관심하다. 주먹으로 맞거나 학살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무관심이다. 불법체류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한다.” (이) “토이가 지적한 것처럼 정말 심각한 것은 무관심이다. 자기 일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권리,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무관심이 문제다. 지금 정치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다. 개인들이 자각하고 있다면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시대에 당신들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 (토이) “영화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거울처럼 비춰 사람들을 자각하게 해주는 매개체다. 영화가 많은 것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나는 노력할 것이다.” (이) “영화가 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내가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타성에 젖어 질문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영화를 그만두어야 할 때다. 요즘엔 그런 질문을 가진 영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이 영화 산업이 점점 죽어가는 이유다. 더 많은 관객, 더 많은 돈을 위해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게 오히려 영화라는 매체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근래 한국에서도 탈시공의 영화들이 많다. 가짜 현실을 자꾸 영화 속에 반영한다. 관객에게 강력한 진통제 같은 독약을 주입하고 있다. 점점 더 강한 것을 써야 하는.” 이창동
“개인들이 자각하고 있다면
표현의 자유 위축 못시킬 것” -영화 산업이 100년을 맞이했던 1995년에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연출가인 수전 손태그는 “위대한 영화의 시대는 갔다”고 선언했다. 두 분은 여기에 동의하나? (토이) “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대학생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짧은 영상들을 보면 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바로 수전 손태그의 삶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나 피의 청소가 이뤄지고 있을 때, 그는 사라예보에 가서 연극 공연을 했다. <고도를 기다리며>였다. 난리 통에 전기가 끊어져 촛불을 켜놓고 했다. 그런 끔찍한 인종 청소가 이뤄지고 있는데, 한편의 연극이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촛불을 켜놓고서라도 그걸 한다는 거다. 영화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영화 한편이 이 막강한 현실의 쓰나미 같은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중요한 건 그래도 한다는 것이다.” 글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사진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창동 “탈시공 영화는 독약같은 것”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던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은 죽음을 가장하고 머나먼 섬나라로 떠난다. 세월이 흘러 옛날이 그리워진 그는 다시 아내 곁으로 돌아오지만 아내에게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겼다. 노숙자 신세로 공항에서 선잠을 자던 그는 꿈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다. 한글로 ‘이창동’이라고 적힌 종이를 든 이 여자가 “당신이 이창동이냐”고 묻자, 그는 “아무렴 어때”라며 여자를 쫓아간다. 부천에서 만난 두 감독과의 대화는 이 장면으로부터 출발했다. -영화에서 ‘이창동’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뭔가?
(토이) “이 영화는 과거를 잊으려는 남자의 얘기다. 그는 이름을 세번이나 바꾸면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다. 완벽한 자유를 추구하지만 자유로워질 수 없고, 과거를 잊고 싶지만 잊어버릴 수 없는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인 남자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현명한 사람의 이름과 대조시키고 싶었다.” 이 감독과 토이 감독은 2006년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 각각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처음 만났다. 타이거상(대상) 수상자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토이 감독이 이 감독 편을 들어줘 뜻을 관철할 수 있었다고 한다. 토이 감독은 “심사위원장일 때 이 감독님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내게 여러 시간을 생각하게 했다”며 “감독님의 <오아시스>를 보고 존경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토이
“매맞고 학살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무관심” -지금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영화감독으로서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다. (토이) “벨기에와 한국의 상황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질병을 앓고 있다. 유럽이라는 높은 장벽에 갇혀 다른 세계에 철저히 무관심하다. 주먹으로 맞거나 학살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무관심이다. 불법체류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한다.” (이) “토이가 지적한 것처럼 정말 심각한 것은 무관심이다. 자기 일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권리,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무관심이 문제다. 지금 정치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다. 개인들이 자각하고 있다면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시대에 당신들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 (토이) “영화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거울처럼 비춰 사람들을 자각하게 해주는 매개체다. 영화가 많은 것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나는 노력할 것이다.” (이) “영화가 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내가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타성에 젖어 질문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영화를 그만두어야 할 때다. 요즘엔 그런 질문을 가진 영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이 영화 산업이 점점 죽어가는 이유다. 더 많은 관객, 더 많은 돈을 위해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게 오히려 영화라는 매체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근래 한국에서도 탈시공의 영화들이 많다. 가짜 현실을 자꾸 영화 속에 반영한다. 관객에게 강력한 진통제 같은 독약을 주입하고 있다. 점점 더 강한 것을 써야 하는.” 이창동
“개인들이 자각하고 있다면
표현의 자유 위축 못시킬 것” -영화 산업이 100년을 맞이했던 1995년에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연출가인 수전 손태그는 “위대한 영화의 시대는 갔다”고 선언했다. 두 분은 여기에 동의하나? (토이) “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대학생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짧은 영상들을 보면 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바로 수전 손태그의 삶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나 피의 청소가 이뤄지고 있을 때, 그는 사라예보에 가서 연극 공연을 했다. <고도를 기다리며>였다. 난리 통에 전기가 끊어져 촛불을 켜놓고 했다. 그런 끔찍한 인종 청소가 이뤄지고 있는데, 한편의 연극이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촛불을 켜놓고서라도 그걸 한다는 거다. 영화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영화 한편이 이 막강한 현실의 쓰나미 같은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중요한 건 그래도 한다는 것이다.” 글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사진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