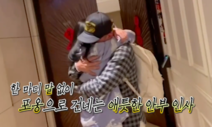영화 '이민자'의 한 장면.
영화 ‘이민자’ 3일 개봉
1920년대 뉴욕으로 몰린 사람들
꿈과 현실 사이 위태로운 몸부림
구원을 향한 갈망 그려
자본의 욕망이 모인 그곳에 성스러움은 있었을까
1920년대 뉴욕으로 몰린 사람들
꿈과 현실 사이 위태로운 몸부림
구원을 향한 갈망 그려
자본의 욕망이 모인 그곳에 성스러움은 있었을까
1905년부터 1914년 사이 인구 8300만명에 불과하던 미국에 1000만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들어왔다. 1920년대엔 이민자가 동부 주요 도시 인구 4분의 3을 차지했다. 3만개 공장이 몰려 있는 뉴욕엔 외국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당시 미국 고층빌딩 5000개 중 절반이 뉴욕에 있었다. 지금 뉴욕을 상징하는 고층건물과 스카이라인 대부분은 1920년대에 형성됐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 뉴욕은 대부분 극도로 소외된 환경을 의미했다. 주가는 현기증 나도록 올랐지만 일당을 받지 못한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 당시 뉴욕이다. 금주령이 실시될 동안 되레 은밀히 주류를 거래하는 술집이 이전보다 더 많이 문을 열었고, 공권력의 기세는 높았지만 폭탄 테러 같은 극악한 범죄들이 출현했다. 용의자들은 하나같이 이민자 출신 ‘파괴분자’였다. <위대한 개츠비>,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등 1920년대 뉴욕 영화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활기와 우울 사이에서 그토록 분열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이유는 ‘그때 뉴욕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영화 <이민자>의 주인공들도 꿈과 현실 사이에서 위태롭다. 영화는 아메리칸드림을 좇아온 이민자들이 처음 밟았던 미국 땅, 이민국이 있었던 뉴욕의 엘리스섬에서 시작한다. 이민자들은 <대부2>와 <아메리카 아메리카>에서 묘사했던 바로 그 길고 싸늘한 줄에 선다. 폴란드 여성 에바(마리옹 코티야르)는 전쟁을 피해 동생의 손을 붙잡고 미국에 도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동생을 엘리스섬에 남겨두게 된다. 당시 입국심사는 하위직 노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나 지능 등을 검사하는 것이었다. 제임스 그레이 감독은 엘리스섬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에게 입국심사를 받다가 여동생과 헤어지게 된 사연을 듣고 이 영화의 줄거리를 썼다고 한다.
실제 이민자들이 마주했을 자유의 여신상은 엘리스섬 근처에서 바라보는 듯한 옆얼굴부터 정면, 뒷모습 등 여러 각도로 등장하지만 그럴수록 아메리칸드림은 더욱 공허해진다. 에바가 자유의 여신상으로 분장하고 무대에 서는 장면은 영화 <대부2>에서 돈을 휘감은 그리스도상이 뉴욕 거리를 행진하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순진하지만 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에바는 성스럽지 않다. 포주에 어릿광대인 브루노(호와킨 피닉스)를 타락하고 비열한 사람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훔치거나 몸을 팔고, 남을 위협하거나 속이면서 생존을 도모하지만 이민자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태어난 고향에서 짊어지고 온 구시대적 감정이 있다. 남에게 떠밀리는 것 같기만 하던 에바는 고해성사실을 찾아 부끄러움과 죄의식, 열망과 불안을 털어놓는데, 이런 감정들로 그는 자신이 능동적이고 숭고한 존재라는 점을 자각하게 된다. 영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본질적인 사색으로 달려간다. 렘브란트 그림 속 인물처럼 어두운 화면에서 에바의 얼굴만 성스럽고 환하게 비추는 감독의 의도는 명백하다. 브루노가 에바에게 자신을 지배해온 감정을 처음으로 고백하며 몸부림치는 장면은 마치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의 소냐에게 감화받은 라스콜니코프와도 비슷하다.
자본주의가 욕망의 얼굴로 모이던 그곳에 정말 이런 성스러움이 있었을까? 감독이 구원을 바란 것은 확실하다. 제임스 그레이 감독은 제작 노트에 “에바는 고전적 의미의 영웅이며 우리는 여주인공을 통해 숭고한 감정에 이를 수 있다”고 적었다. 3일 개봉.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사진 씨네룩스 제공
영화 <이민자>의 주인공들도 꿈과 현실 사이에서 위태롭다. 영화는 아메리칸드림을 좇아온 이민자들이 처음 밟았던 미국 땅, 이민국이 있었던 뉴욕의 엘리스섬에서 시작한다. 이민자들은 <대부2>와 <아메리카 아메리카>에서 묘사했던 바로 그 길고 싸늘한 줄에 선다. 폴란드 여성 에바(마리옹 코티야르)는 전쟁을 피해 동생의 손을 붙잡고 미국에 도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동생을 엘리스섬에 남겨두게 된다. 당시 입국심사는 하위직 노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나 지능 등을 검사하는 것이었다. 제임스 그레이 감독은 엘리스섬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에게 입국심사를 받다가 여동생과 헤어지게 된 사연을 듣고 이 영화의 줄거리를 썼다고 한다.
실제 이민자들이 마주했을 자유의 여신상은 엘리스섬 근처에서 바라보는 듯한 옆얼굴부터 정면, 뒷모습 등 여러 각도로 등장하지만 그럴수록 아메리칸드림은 더욱 공허해진다. 에바가 자유의 여신상으로 분장하고 무대에 서는 장면은 영화 <대부2>에서 돈을 휘감은 그리스도상이 뉴욕 거리를 행진하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순진하지만 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에바는 성스럽지 않다. 포주에 어릿광대인 브루노(호와킨 피닉스)를 타락하고 비열한 사람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훔치거나 몸을 팔고, 남을 위협하거나 속이면서 생존을 도모하지만 이민자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태어난 고향에서 짊어지고 온 구시대적 감정이 있다. 남에게 떠밀리는 것 같기만 하던 에바는 고해성사실을 찾아 부끄러움과 죄의식, 열망과 불안을 털어놓는데, 이런 감정들로 그는 자신이 능동적이고 숭고한 존재라는 점을 자각하게 된다. 영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본질적인 사색으로 달려간다. 렘브란트 그림 속 인물처럼 어두운 화면에서 에바의 얼굴만 성스럽고 환하게 비추는 감독의 의도는 명백하다. 브루노가 에바에게 자신을 지배해온 감정을 처음으로 고백하며 몸부림치는 장면은 마치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의 소냐에게 감화받은 라스콜니코프와도 비슷하다.
자본주의가 욕망의 얼굴로 모이던 그곳에 정말 이런 성스러움이 있었을까? 감독이 구원을 바란 것은 확실하다. 제임스 그레이 감독은 제작 노트에 “에바는 고전적 의미의 영웅이며 우리는 여주인공을 통해 숭고한 감정에 이를 수 있다”고 적었다. 3일 개봉.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사진 씨네룩스 제공
영화 '이민자'의 폴란드 여성 에바(마리옹 코티야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