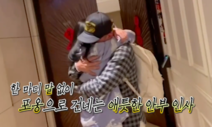사진 각 영화사 제공
실화·실존인물 다룬 영화 3편 들여다보니
영화 <빅쇼트>와 <스티브 잡스>가 개봉한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시지브이에선 한 증권사 투자모임이 <빅 쇼트>를, 청소년 관객들이 <스티브 잡스>를 단체 관람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각각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했던 월가 매니저들과 미 애플사의 혁신을 주도했던 스티브 잡스를 다룬 영화다. 28일엔 미국 체스 천재 바비 피셔의 이야기를 그린 <세기의 매치>가 개봉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맞힐 수 없는 과녁을 맞히고, 천재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과녁을 맞힌다”고 했다. 주인공들의 천재성을 내세우는 3편의 영화는 우리가 천재성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출발하지만 지금껏 알지 못했던 과녁을 비춘다.
■ 상식을 지키는 능력 <빅쇼트>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진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르는 것은 자본주의가 고안해낸 새로운 재능 분류법이다. <빅쇼트>주인공들은 천재라기보다는 좀 별난 사람들이다.
캐피탈회사 대표 마이클 버리(크리스찬 베일)가 숫자를 분석해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천재적 유형에 가깝다. 버리가 책상 앞에 앉아 미국 부동산 담보 대출인 모기지론의 엄청난 부실 비율을 발견했다면 펀드 매니저 마크 바움(스티브 카렐)은 현장을 다니며 비어가는 주택들을 목격하고 부동산 거품이 터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그들이 별난 이유는 월가의 상식을 거스르며, 시민의 상식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전직 주식 중개인 벤 리커트(브래드 피트)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대체하는 이런 시스템은 망할 것이라고 믿으며, 영화의 서사를 끌어가는 대형 은행 트레이더 자렛 베네드(라이언 고슬링)는 은행가에선 왕따같은 처지다.
복잡한 경제 용어로 가득한 영화지만, 시종일관 긴장이 넘친다. 과연 지금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일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하는 불안과 위기의식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자본의 도덕적 해이와 정치권의 책임 방기가 필연적으로 이런 비극을 초래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곧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이미 ‘환란’을 경험한 한국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공포물이기도 하다. 위기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화에서 제시하는 것은 ‘상식’이다. <빅쇼트>주인공들은 흔들릴 때마다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부도덕한지를 깨닫는 순간 상식을 지켜야 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 불안한 자기 도취 <스티브 잡스> 영화가 비추는 잡스의 인간성은 한마디로 ‘쓰레기’다. 어린 딸의 기대를 쉽사리 짓밟고 동료를 협박하며 현실을 왜곡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주장하는 인간이다. 잡스의 불안한 자기 도취는 양날의 검과 같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예술가와도 같은 정체성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잡스와 함께 애플 컴퓨터를 설립한 스티브 워즈니악은 이 영화는 지극히 사실적이라고 했다. 대사나 에피소드가 정확해서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결핍 덕분에 무언가를 이루어냈고 또 그 때문에 불행했다는 영화의 주제가 진실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 여전히 수수께끼 <세기의 매치> 1972년 미국과 러시아 체스 천재들의 대결을 소재로 한 <세기의 매치>의 주인공 바비 피셔(토비 맥과이어)도 재능만을 갖춘 인물이다. 15살에 최연소 그랜드 마스터 타이틀을 획득한 그는 자신의 성취 밖에는 관심이 없고 상대를 짓누르고 경멸하기 위해 체스를 둔다.
영화는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진 소년의 암울한 내면을 그리며, 피셔의 기행이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냉전시대의 정신적 증세일 수도 있다는 암시를 던진다. 그를 스타로 만든 것은 미-러 대결이었다. 대결에 열광하는 그는 파멸의 길을 걷는다. 재능의 끝엔 슬픔만이 남는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