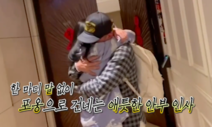영화 ‘사울의 아들’. 사진 그린나래미디어 제공
25일 개봉하는 영화 ‘사울의 아들’
죽음 앞둔 가스실 작업반원 사울
아들 주검 ‘유대 장례’ 치르려 집착
‘죽음의 공장’ 다큐처럼 재연
작년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죽음 앞둔 가스실 작업반원 사울
아들 주검 ‘유대 장례’ 치르려 집착
‘죽음의 공장’ 다큐처럼 재연
작년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심장이 고동친다. 영화 <사울의 아들>에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있는 가스실로 걸어들어가는 장면은 관객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을 가스실에 넣은 뒤 주검이 나오면 운반하고 소각하는 영화 속 가스실 작업반원들의 표정은 무미건조할 뿐이다. 이들은 인간의 죽은 육신이 산처럼 쌓인 현장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피와 기름을 닦아낸다. 나치는 학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들 작업반원들조차 4개월마다 한번씩 가스실로 보냈고, 이들은 자신들도 곧 다른 이의 손에 의해 고깃덩어리처럼 처리될 운명임을 안다.
전직 시계수리공이었으며 헝가리 출신 유대인인 사울도 한가지 얼굴만을 가지고 있다. 그날도 가스실의 문이 열리고 주검들을 치우는데 아직 숨지지 않은 한 소년이 발견된다. 군의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기도를 눌러 소년의 남은 숨을 끊을 때도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옆에 서 있을 뿐이다. 독일군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구석에서야 그는 그 소년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힌다. 영화가 시작한 지 15분 만에 주인공의 아들이 살해당하지만 아버지가 통곡하지 않으므로 관객들도 슬퍼할 틈을 놓친다. 아버지는 대신 소년의 시체를 빼내 유대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는 생각에만 집착한다. 유대법에선 화장을 금지하고 장례식엔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읽어줄 랍비가 있어야 한다.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한 생존자 문학은 설령 허무한 결론에 이른다고 해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묻곤 한다. 다른 인간이 겪은 고통을 듣는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 영화에선 그런 질문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영화는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단 한번의 무장봉기 사건을 소재로 한다. 사울은 동료들이 반란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자신의 아들을 묻어주겠다며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가장 인간적인 행위라 할 장례 의식을 치러주겠다며, 실제 살아있는 동족 몇몇이 죽어도 개의치 않으면서 오직 아들을 묻을 땅, 장례식을 집전할 랍비만을 찾아다니는 이 아버지는 어떤 존재란 말인가. 영화는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 문화와 광기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오간다.
이 사실적인 기록물은 반드시 극장에서 볼 것을 권한다. 35㎜ 필름 카메라로 주인공의 시야만을 쫓으며 촬영한 화면은 극장 스크린에서 볼 때 사울이 외면하곤 하던 시체와 죽음들을 생생히 느끼게 한다. 또 독일어와 8개 나라말로 속삭이거나 부르짖는 유대인들의 목소리, 가스실 철문 뒤에서 들려오는 문 두드리는 소리 등은 영화를 ‘듣는’ 체험을 갖게 한다. 라슬로 네메시 감독과 사울을 연기한 배우 게저 뢰흐리그, 촬영감독 마차시스 에르데이는 모두 홀로코스트 피해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비극적이고 참혹한 과거를 신화로 재생산하려는 듯한 홀로코스트 영화를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다”는 네메시 감독은 “구체적이고 실재적으로 ‘죽음의 공장’을 그리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 38살의 감독은 자신의 첫 장편인 이 영화로 68회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25일 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