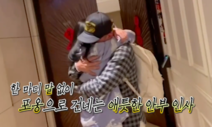영화 <우리들>. 사진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윤가은 감독 데뷔작 ‘우리들’
놀기 바빠 뭘 모르던 1, 2학년 지나
처음 맞닥뜨린 친구 만들기와 왕따
그날그날 촬영 내용 알려주면
또래 언어와 감성으로 바꿔 연기
서로 밀어내는 눈빛, 엇갈리는 시선
속내 감추려 어깨 으쓱하기 등 섬세
놀기 바빠 뭘 모르던 1, 2학년 지나
처음 맞닥뜨린 친구 만들기와 왕따
그날그날 촬영 내용 알려주면
또래 언어와 감성으로 바꿔 연기
서로 밀어내는 눈빛, 엇갈리는 시선
속내 감추려 어깨 으쓱하기 등 섬세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들의 세계를 그린 <우리들>은 어린이들의, 어린이들에 의한, 그러나 어른들을 위한 영화다. 윤가은 감독이 그날그날 촬영 내용을 알려주면 아역배우들은 이를 자신의 언어와 감성으로 바꿔가며 연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다. 평균 연령 13.5살의 이 어린 연기자들은 “생애 처음으로 격렬한 인간관계의 감정을 경험하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른들도 관계의 어려움, 친구라는 이상한 존재,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감독의 바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6일 한겨레신문사 사옥을 찾은 그들에게 영화라는 낯선 세계를 경험하고 온 이야기를 들었다.
“제 첫 촬영은 육교에서 지아와 선이가 우연히 만나는 장면이었는데 정말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했죠. 영화 뒤로 갈수록 처음보단 잘했어요. 다시 돌아가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지아 역을 맡았던 설혜인은 아직도 그날이 아쉬워서 주먹을 꼭 쥐었다.
“저는 보라가 혼자 학원에서 우는 장면에서 가장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스크린으로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보라 역을 맡았던 이서연은 중학교 1학년, 다른 두 배우보다 한 살 많은 덕인지 한결 어른스럽다.
선이 역을 맡은 최수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은 혜인이와 몸싸움을 벌이던 장면이다. “지아와 선이가 교실에서 뒹굴며 싸우는 장면을 찍던 날 아침 엄마가 머리를 해주시다가 고데기로 제 귀를 집었어요. 귀에 물집이 크게 잡혔는데 혜인이와 뒹굴다가 물집이 터져서 피가 흘렀죠. 지아가 미안해서 울었어요. 저는 그게 미안해서 또 크게 울고.”
<우리들>은 눈물과 수다로 만들어진 영화다. 2014년 가을부터 배우들을 찾아다녔다는 윤가은 감독은 2015년 봄 캐스팅을 확정하고 세 달 동안 리허설에 들어갔다. 감독은 물론 스태프까지 툭하면 여자들 7~8명이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를 고치고 또 고쳤다고 한다. “정말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영문도 모른 채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헤어지고 각자 속한 친구 그룹의 갈등, 교실 내 계급적 차이로 학교생활의 위기를 맞았죠.”
윤 감독이 영화 속 선이와도 비슷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영화를 만들었듯, 여자라면 누구나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우정, 인기 쟁탈, 미시정치의 세계를 안다.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초1, 2학년 때는 놀기 바빠서 모르고, 4학년쯤 되면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으려다 왕따가 시작된다고 했다. 혜인은 “연기한다고 하니까 ‘너 연예인이냐’고 하면서 친구들이 어딘지 불편하게 대하더라”는 경험을 털어놓았다. 서연도 “친했던 친구와 멀어진 뒤 그 아이가 다른 친구와 내 얘기를 안 좋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상처를 많이 받았던” 아픈 기억을 꺼냈다. “서로 상처를 주면서도 ‘나는 친구를 가능한 한 많이 사귀고 싶다’는 영화 속 아이들의 그 마음이 공감됐다”는 서연의 말은 또래 배우들에게 다시 뜨거운 공감을 받았다. “어떤 때는 부모님보다 믿을 수 있고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수인)
영화 속 서로를 밀어내는 눈빛, 상처를 감추기 위해 축 처진 어깨를 끌어올리는 동작, 불안하게 엇갈리는 시선들은 이렇게 아이들의 삶과 마음속에서 나왔다. 이선 역을 맡은 수인이는 이 영화로 지난 3일 체코에서 열린 즐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서 어린이배우 주연상을 받았고 다음달 11일 열리는 상하이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로도 올랐다.
아역 연기자들 입장에선 1학기 땐 방과후 수업처럼 리허설을 하고 7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영화 캠프’라며 배우들을 모아 촬영을 시작한 이런 영화는 앞으론 못 만날지 모른다. 수인이는 4학년 때 모델대회에 나가 상을 타면서 연기를 시작했다. 어릴 때 길거리 캐스팅을 여럿 받다가 “혼자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엄마의 허락을 받아 연기학원에 다니며 오디션을 여러번 보았다는 서연이는 “이전까지는 단역으로 출연했을 뿐이라, 어린이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을 대신 표현해주는 배우라는 직업,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앞으로 배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겠어요”라는 혜인이의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다. 연기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울고, 지아가 너무 불쌍해서 울고, 기왕 이렇게 울었는데 제대로 해보자고 촬영장에 돌아오곤 했던 혜인이는 이미 이보다 더 진지할 수는 없는 배우였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 보통내기가 아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