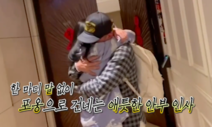넷플릭스의 한국 진출로 국내에서도 영화 개인추천 시대가 시작됐다. 사진은 넷플릭스 초기화면(왼쪽)과 추천 화면(오른쪽). 넷플릭스 코리아 제공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는 내게 ‘남은주님을 위한 우울한 동영상’을 추천했다. 그동안 넷플릭스에서 <나르코스> <하우스 오브 카드> <블러드라인> 같은 무거운 분위기의 드라마를 주로 보았더니, 나를 어둡고 무거운 영화를 선호하는 관객으로 분류한 것이다.
개봉이나 방영 시기를 놓쳐서 보지 못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곤 했던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 왓챠 앱에선 나를 “편식 없이 골고루 영화를 보는 균형파”로 분류했다. 내가 영화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드라마와 긴장감 같은 요소라는 사실도 알려줬다.
넷플릭스와 왓챠 등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등 개인 단말기로 영화를 보는 시대가 열렸다. 이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해 ‘내’ 영화 취향을 찾아주는 개인형 추천 서비스를 앞세워 모바일 시대 관객들을 파고들고 있다.
■ 온라인 영화관은 취향 수집중 “우리는 지금 한국 시청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다. 가입자가 어느 규모 이상 모이면 우리의 추천 시스템이 제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지난 6월 넷플릭스 최고콘텐츠책임자 테드 서랜도스가 한 말이다. 한국 진출 6개월이 지났음에도 가입형 주문형비디오(SVOD) 시장에선 4위에 머무르는 상황에 대해 묻자, 나온 대답이다. 한국 시청자들의 관람 형태에 대한 빅데이터를 쌓아 추천 서비스가 제 기능을 발휘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가입자의 75%가 추천 메뉴가 권하는 대로 영화를 보는 것으로 추산하는 넷플릭스에 동영상 추천 시스템은 경쟁력의 핵심이다. 매달 정액을 내면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의 성격상, 개인별 정확한 추천 알고리즘을 갖추는 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호감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제 넷플릭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80%를 넘는다는 결과는 주로 ‘시네 매치’라는 개인추천 시스템 덕분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정액제 동영상 서비스 왓챠플레이 앱을 출시한 기업 프로그램스엔 사용자들이 쌓아온 평점이 빅데이터 역할을 한다. 2011년부터 영화를 보고 난 뒤 별점을 주도록 하는 앱 왓챠를 운영해왔는데, 5년 동안 쌓인 사용자들의 영화 평점은 2억7천만개에 이른다. 회원 1인당 평균 130~140개의 별점을 준 것으로 추산된다. 이 앱은 어떤 영화를 선택하면 내가 이미 다른 영화에 준 별점을 기본으로 영화 장르, 감독, 배우 등과 사용자 취향의 연관성을 분석해 그 영화에 대한 ‘예상 별점’을 보여준다. 왓챠 추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강윤섭 아르앤디팀장은 “<클레멘타인> <디 워>처럼 이미 악평이 많은 영화는 개인화된 예상 별점이 큰 의미가 없지만 새로운 영화를 고를 때는 예상 별점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사용자들 영화 취향을 키워드 수십만개로 나눠 새로운 영화를 추천하는 주문형 동영상 서비스들은 추천 알고리즘으로 경쟁한다. 왓챠에서 분 석한 성별과 키워드에 따라 많이 본 영화들(왼쪽)과 취향 분석 화면(오른쪽). 프로그램스 제공
■ 확장되는 추천 알고리즘 왓챠는 영화평론가 이동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김도훈 편집장 등 영화비평가들을 가입자로 초대해 그들을 팔로하면 그들의 영화에 대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스타 평론가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도와 친밀감을 활용해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범위를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이동진 평론가는 영화 3305편에 별점을, 1341건의 짧은 평을 남겼고 그는 “영화를 남들보다 진지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지성파”이며 “현실성·인생·부모·죽음” 등의 요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팔로어 6210명이 있는 김도훈 편집장도 ‘지성파’로 분류되지만 스릴러와 에스에프, 판타지 등의 요소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달랐다.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 모두 사용자가 주로 봐온 장르뿐 아니라 다른 장르 영화도 추천작에 올린다. 기자의 경우 넷플릭스는 <헝거게임>이나 <마스터 오브 제로>를, 왓챠플레이는 <애정수성료>와 <동화 2분의 1> 같은 중국 멜로물을 권했다. 이들 서비스는 보통 첫 화면에서 추천작 세 편을 보여주는데 한 편 정도는 기존에 봐온 영화와 비슷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두 편은 장르조차 낯선 영화다.
이들 서비스가 낯선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첫째로 확장성을 위해서다. 본인도 미처 알지 못한 취향을 일깨워 영상 시청의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다. 때로는 본인의 코드 중 하위권에 있는 요소를 앞세우는 등의 기법을 통해 뜻밖의 영화를 사용자의 추천 리스트에 올리기도 한다. 왓챠 강윤섭 팀장은 “추천 알고리즘은 수십만개의 감춰진 키워드 중 하나를 사용자에게 내밀고 마지막 결론은 사람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한다. 내가 당신의 취향을 알고 있고 분석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영화와 사람을 수없이 많은 키워드로 잘게 쪼개고 있으며 알고리즘을 검증하면서 새롭거나 돌발적인 변수를 넣기도 한다고 했다. 그 결과 ‘세렌디피티’(우연한 발견)라고 부르는 뜻밖의 영화가 당신의 추천 리스트에 나타난다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넷플릭스의 경우 영화에 대한 평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이후 평점을 포기하고 시청자가 어떤 단어를 검색하고 언제 어떻게 영화를 봤는지까지 계산 요소로 넣는 ‘에코 알고리즘’으로 이동했다. 최근엔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추천을 중시하는 추천 커뮤니티를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영화 추천 알고리즘은 진화하고 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