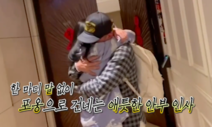데뷔 50주년을 맞은 윤여정이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여성 캐릭터에 도전했다. 씨지브이 아트하우스 제공
10월6일 개봉하는 영화 <죽여주는 여자>를 만들 때 이재용 감독은 ‘박카스 할머니’의 일상이 궁금했던 게 아니라 배우 윤여정이 그러한 처지에 놓인다면 어떻게 됐을지를 상상해서 시나리오를 썼다고 했다. 그러니 영화가 청재킷에 예쁘게 앞머리 내리고 도시 밑바닥에서 홀로 죽음을 향해 타박타박 걸어가는 어떤 여자 노인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윤여정 덕분이다.
“나이 들면 어지간한 일은 다 경험했다고 믿고 흉측한 세상일은 피하려 든다. 이 나이에 그걸 안다고 누굴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영화를 찍으면서 몰라도 될 세상을 알고 우울증에 빠졌다. 어차피 인생은 불공정하다는 걸 알았지만 실제로 그런 장면을 맞닥뜨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만난 윤여정은 영화를 찍으면서 빠지게 된 깊은 동굴에 대해 우울기 하나 없는 어조로 조근조근 이야기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종로 탑골공원에서 성을 팔아 하루벌이로 살아가던 소영이 다른 사람의 남은 생을 연민하고 편안한 죽음을 돕는 진짜 ‘죽여주는 여자’가 되었을 때 찾아왔다. “원래 내 미션은 영화마다 빨리 잘 찍고 후다닥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 너무 고민했다. 감독은 촬영 일주일 앞두고 이 영화를 못 찍을 것 같아 엎으려고 했단다. 내 친구 중엔 ‘그런 영화를 왜 찍어. 제목도 더럽잖아’ 하고 말리는 친구도 있었다.” 그러나 윤여정은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에 품위를 부여한다.
영화 <죽여주는 여자>의 한 장면. 씨지브이 아트하우스 제공
“어떡해, 어떡해.” 남자들은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할 때와 비슷한 어조로 여자를 찾아와 죽고 싶다고 털어놓는다. 여자는 싫다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피하지는 않는다. “이 여자는 오래전에 죽고 싶었는데 못 죽었을 것 같다.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상태로 꾸역꾸역 연명했는데 나를 죽이는 심정으로 그들을 죽였을 것이다.” 나이든 여자는 감정조차 굳어 화석이 되었을 거라 짐작하지만 윤여정은 메마른 각질 속 눈물이 흥건한 속내를 보여준다.
그러나 윤여정의 눈물은 결코 신파가 되지 않는다. 지난 5월 개봉한 <계춘할망>에서 그가 손주를 안타깝게 찾아나서는 배역을 맡았을 때도 그는 핏줄 이상의 것을 헤아리는 할머니 역에 더없이 잘 어울렸다. <돈의 맛>의 회장 부인, <고령화 가족>의 엄마, 어떤 역을 맡아도 전형에 포함되지 않는 그는 1966년 티비시 방송사 3기 공채로 연기를 시작해 올해로 연기 인생 50주년을 맞았다.
9월29일부터 서울 씨지브이 압구정에선 1972년 <충녀>부터 <죽여주는 여자>까지 그가 출연했던 주요 작품들을 상영하는 윤여정 특별전도 열고 있지만, 정작 그는 “결혼 50주년도 아닌데 뭘 그걸 세고 있냐”며 남사스러워했다. “요번 작품 때문만이 아니고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할 때구나 하는 생각을 쭉 하고 있던 참인데, 그래도 배우로 살아온 세월이 50년인데 연기를 그만두면 내 자존감도 하루아침에 사그라들지 않을까 해결나지 않는 고민을 자꾸 하고 있다”고 했다.
그게 언제일지, 그런 날이 올진 몰라도 그때까진 꾸준히 연기에 매진할 것 같다. 65살에 <돈의 맛>에서 젊은 남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찍고 난 뒤 임상수 감독은 윤여정을 만날 때마다 고개를 조아렸다고 한다. 5년 뒤 <죽여주는 여자>에선 아예 성매매 여성이 되어야 했다. 그는 “설마 이재용 감독이 내게 그런 연기를 시키겠냐고 생각했더니만 베드신도 모자라 맞는 장면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감독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을 에너지 삼아 영화를 찍었다”며 웃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