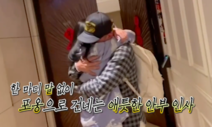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별을 쫓는 그림자들’ 전시장. 빛송이를 품은 그림자 요정들이 벽면에 빛으로 틔운 창문과 과일나무를 배경으로 생명의 물고기들이 휙휙 지나가는 동영상이 펼쳐진다. 왼쪽의 관객은 등롱 모양의 트래커를 비추면서 눈앞에 생동하는 영상 속에서 입체적인 감상체험을 누린다. 노형석 기자
소담한 빛송이들이 세상을 구원한다.
촛불이나 전등불이 아니다. 프로그래밍된 디지털 프로젝터에서 나온 빛과 관객이 든 전자기기에서 나온 빛이 어우러져 전시장을 반딧불이처럼 떠돌아다닌다. 벽에 갇혀있다가 이 인공 빛송이들을 받은 덕분에 벽을 뚫고 열린 공간으로 튀어나온 그림자 요정들은 떼춤을 추며 벽면 곳곳에 생명을 일으킨다. 우중충한 벽에 빛살을 쪼여 우주로 통하는 문을 틔우고 빛발을 뿌려 열매 나무들을 키우고 황금빛 물고기를 날아다니게 한다. 차갑기만 했던 미디어 아트의 디지털 빛살은 이 암울한 시대에 사람들 마음에 숨은 희망과 사랑을 품으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워진다.
‘별을 쫓는 그림자들’이란 제목으로 차린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41)씨의 전시회 풍경은 차가운 디지털아트의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 별을 표상한 빛송이와 그림자 요정들이 관객과 교감하며 펼치는 생명의 스펙터클 무대가 차려졌다. 우주와 세계를 가꾸어나가는 그림자 요정의 검은빛 군상들이 관객이 품은 희망과 사랑을 나누며 막힌 공간을 열린 세상으로 바꾸는 환상극이 15분 동안 이어진다.
아이 관객이 등롱 모양의 트래커 불빛을 벽면의 그림자 요정에게 비추면서 빛송이를 전하고 있다. 벽면에서 빛송이를 달라고 손짓하는 그림자 요정들 앞으로 관객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빛송이를 나누며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독특한 인터랙티브 기법이 활용됐다. 노형석 기자
지난 9일부터 광주시립미술관 산하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전시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실감콘텐츠 전시회는 문 작가가 10여년간 계속 실험하며 개발해온 이른바 ‘증강현실’ 기법이 높이 5m를 넘는 국내 유일의 전용 미디어아트 공간에서 가장 적절하게 연출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관객들은 문 작가가 개발한 등롱 모양의 트래커를 비추면서 빛송이를 품은 그림자 요정들의 율동과 그들이 벽면에 빛으로 틔운 창문과 과일나무를 배경으로 생명의 물고기들이 휙휙 지나가는 동영상 속에 휩싸여 그 공간의 일부가 된 듯한 감상체험을 누리게 된다.
스스로를 예술가이자 기술가라고 명명한 문 작가는 기술과 예술을 융합해 영상 인터페이스 환경에 생명을 꾸리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특수 제작한 등롱형 트래커를 들게 하는 방식으로 관객의 위치를 감지하고 관객이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물체의 실재 그림자에 가상 그림자를 매핑하는 방식을 실현해냈다. 문 작가는 미국 파슨스스쿨에서 수학하고 증강현실, 텐저블 인터페이스, 사운드 시각화 등의 실험미디어와 컴퓨테이션을 활용해 작업해온 실력파다.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 린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등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관련 기관에서 초대 전시를 열었고, 지난해엔 대만 가오슝, 중국 샌드박스, 부천 등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작품을 상영했다.
전시장에서 만난 문준용 작가. 지금까지 했던 전시들 가운데 가장 큰 공간에서 직접 프로로젝터를 설치하며 작업환경을 만들고 작품을 펼칠 수 있어 기뻤다고 털어놓았다. 노형석 기자
‘별을 쫓는 그림자들’의 전시장. 벽면에서 그림자 요정들이 나무를 키워 열매를 맺게 하고 별을 집어 들고 있는 장면을 문준용 작가와 관객이 지켜보고 있다. 노형석 기자
부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직 기간 군소화랑 전시까지 정쟁거리가 되는 등 작업에 큰 제약을 받았지만 부친 퇴임 뒤에 모처럼 작업에 집중하면서 첫 공공미술관 전시라는 성취를 이루었다. 9일 개막현장에서 만난 문 작가는 “지금까지 했던 전시들 가운데 가장 큰 공간에서 직접 프로젝터를 설치해 작업환경을 만들고 작품을 펼칠 수 있어 기뻤다”며 “게임이나 영화 같은 대중적 영상장르와 융합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구성방식들을 찾는 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7월30일까지.
광주/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