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위아래사람들
회사원 김문성(34)씨의 직업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사연구팀 조사관이다. 언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 피같은 결혼비용 2천만원 털어
김옥심 명창 추모공연 등 열어
경서도 소리 연구 논문까지 발표 그는 또한 ‘지독한’ 국악매니아다. 국악계에서는 경서도 소리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틈만 나면 고전 국악음반과 자료를 수집한다. 올해도 1910~60년에 녹음된 유성기판(SP)·레코드판(LP) 등 국악 고전음반 1천여장을 사들였다. 오케이 레코드, 밀리온 레코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발매한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대구아리랑>을 비롯해 김난홍의 <서도 농부가> 등 말로만 듣던 희귀 음반들도 여럿 포함돼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에 건너가 최초의 애국가 음반을 찾아내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 오류1동 그의 자취방과 전북 임실군 오수면 시골집에는 유성기판 1700여장, 레코드판 1400여장, 시디 및 카세트 3000여장, 국악관련 희귀 서적, 국악 채록 릴테이프, 팜프렛 등 3만여점의 자료로 가득하다. 그의 말대로 “직장생활 10년을 국악에 다 쏟아부은 셈”이다. 고려대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던 그가 국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다. 1990년 대학 1학년 때 답사 동아리 활동으로 진도에 갔다가 우연히 죽은 어부의 넋을 위로하는 ‘진씻김’굿을 보았다. “평소 굿이 무섭고 미신이 강한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날 본 씻김굿은 너무 강렬했어요. 서사적인 구조가 뛰어나고 가무악이 잘 조화된 한판의 종합예술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96년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간 뒤 어느날 황학동 고물상가의 음반가게에서 우연히 ‘정선아리랑’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애절하면서 고운 목소리는 처음이었어요. 애절하면 곱지 않고, 고우면 애절하지 못한 법인데 두 영역인 ‘한’과 ‘흥’을 오가는 절묘한 목소리였죠.” 시쳇말로 ‘필이 팍 꽂혔다’고 한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50~60년대 경서도 소리의 최고 명창 고 김옥심이었다. 김 명창의 자취를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의 진로가 결정됐다. “국악계 어른들이 ‘1백년에 한번 날까 말까한 대명창’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국악사적 업적을 회피하려고 하더군요.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김 명창의 자취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는 그 과정에서 김 명창이 ‘재야 인간문화재’로 첫손에 꼽히면서도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제도의 최대 희생양이 되어 만인의 기억 속에서 추방당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를 복원하기로 결심했다. 경기소리와 서도소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재야명창들을 찾아다니며 발굴했다. 그 첫 결실은 2000년 11월 국립국악원에서 자비를 털어 연 김옥심 명창 추모공연으로 시작되었다. 4년 동안 모아두었던 결혼비용 2천만원을 털었다. 스폰서로 나서겠다는 후원자도 있었으나 순수한 정신을 지키기 위해 거절했다. 그뒤 2004년 3월에는 삼성동 문화재보호전수회관에서 꼬마 명창 김희영(14·국립국악중3)의 발표회를 열었다. 여류 소리꾼으로서는 처음으로 경기잡가 중 ‘휘모리 잡가’를 1시간30분간 완창한 무대였다. 그는 그동안 발로 뛰고 귀로 들으면서 채록한 자료를 토대로 2003년 ‘경서도 여류명창의 생애와 12잡가 음반연구’를 시작으로 한국전통음악학회, 국립국악원, 경기도국악당 등에 본격적으로 논문을 발표해 국악계를 긴장시켰다.
“민요는 고급 음악장르가 아닌 서민들의 당시 밑바닥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으면 편하고 고향같은 분위기와 순수한 느낌을 받지요. 국악마니아에 머물지 않고 연구까지 손댄 까닭은 그 민요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서도 소리 대명창들인 고 김옥심과 고 이진홍의 소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사단법인 서울소리보존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국악방송>에서 금요일 오후 4시30분마다 ‘김문성의 신민요 80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그는 “사라져 가는 우리의 소리들을 정리하고 보존 전승하는 일이 아마 나의 평생의 숙제일 것같다”고 털어놓았다. 정상영 기자 chung@hani.co.kr 사진 강재훈 기자 khan@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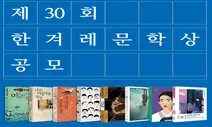


![‘믿음’이 당신을 구원, 아니 파멸케 하리라 [.txt] ‘믿음’이 당신을 구원, 아니 파멸케 하리라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3/20250123504340.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