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대중음악 아이콘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 자료사진
기고 l ‘응사’로 돌아본 1990년대
요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티브이엔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응사)의 다음 편을 기다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1990년대를 이토록 매력적으로 ‘들려준’ 작업이 일찍이 또 있었던가?
이 드라마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복고 로맨스이면서 한편으론 나 같은 이들이 망설여온 ‘기억으로 써 내려간 인기 음악의 발자취’에 대한 작업을 대신해 준 한편의 음악 에세이 같은 느낌도 준다. 하지만 음악 드라마로서 <응사>의 이례적인 성공은 애초 그 배경이 1994년, 즉 90년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복고라는 열쇳말만으로는 왠지 부족한, 풍요로운 정서의 산실이자 한국 대중음악의 르네상스였던 1990년대의 음악들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것은 분명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야말로 새로운 물결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흡사 뮤직비디오처럼 촘촘히 엮인 삽입곡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한국 대중음악임을 알 수 있다. 90년대는 가요가 양과 질 모두 폭발하며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렬히 촉발된 시기였다. 쉽게 말해 좋은 가요만을 즐기기에도 벅찼던 10년이었다. 80년대까지 청년문화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영미 팝음악의 아성을 가요가 무너뜨리게 되기까지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류와 비주류를 아우르며 그 어느 때보다도 양질의 음악을 양산해내던 신진 작가군의 역할을 짚어야만 한다.
신해철·공일오비·이승환부터
서태지와 아이들까지 대거 활동
고전음악 출신 작곡가 유입
양질의 음악 쏟아졌던 10년
가요는 촌스럽다는 관념 깨
세련된 감수성 세대넘어 ‘호출’ 동아기획과 하나음악으로 대표되던 ‘언더그라운드’의 적자들인 김현철, 봄여름가을겨울, 조규찬. 이들은 80년대 말 들국화, 어떤날, 유재하가 이룩해낸 유산을 이어받아 제도권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했다. 신해철, 공일오비(015B), 전람회처럼 가수이면서 음악감독이었던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100만장 가수’였던 신승훈, 김건모, 이승환,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서태지와 아이들(사진)과 듀스가 공히 아이돌 스타이기 이전에 스스로의 음악에 전권을 갖는 ‘작가’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90년대는 가요계를 장악한 아이돌 댄스 음악의 위세 속에서도 이런 작가군의 음악이 동시대의 모든 대중에게 부담 없이 받아들여져 장르적 균형을 이룬 사실상 유일한 시기였다. 한편 유재하의 등장에 자극을 받은 고전음악 작곡과 출신들의 가요계 대거 유입은 대중가요의 미학을 근본적으로 바꾼 계기가 됐다. 신재홍, 김형석, 유희열 등은 클래식과 재즈에서 익힌 세련된 화성 운용과 작곡법을 앞세워 선배들이 미처 성취하지 못했던 현대적 한국 팝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시에 서태지, 윤상, 공일오비 등 이른바 ‘신세대’ 뮤지션들이 정통적인 작곡법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활용한 전자음악에 탐닉하며 표현 지경을 넓히기도 했다. 흔히 ‘뽕끼’를 극복했다고 평가받는 90년대식 한국 팝은 외국 음악만 듣고 자란 이들에게도 즉각적 공감을 얻어냈고, 촌스럽다고만 생각되던 가요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게 만든 계기가 됐다. 최근 이 드라마를 통해 90년대 음악을 새롭게 알게 된 지금의 10대와 20대 청취자들이 그 시절 노래들에서 크게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20년 전 곡을 리메이크한 성시경의 ‘너에게’(서태지와 아이들), 하이니의 ‘가질 수 없는 너’(뱅크), 김예림의 ‘행복한 나를’(에코)의 성공은 90년대 음악이 가진 ‘현대성’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90년대 음악의 모든 순간이 늘 아름답기만 했다고는 말할 순 없다. 세련미에 대한 경쟁적 추종 속에 민중가요는 위축됐고 포크와 헤비메탈의 설 자리도 좁아졌다. 댄스 위주의 가요계를 우려하는 기성세대의 목소리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촌스러우면서도 정감 있는 <응사>의 캐릭터들처럼 아날로그적 감수성이 아직은 남아 있던 90년대의 음악들, 무엇보다 지금 대중들에게도 매력적으로 전달되는 그 시절 가요의 세련된 감수성과 정서적 ‘호환성’은 당시 음악들이 단순한 복고를 넘어 현재화된 대중음악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호출되리라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다. <응사>가 소환해낸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 그 새로운 물결의 작은 역사는 이렇게 뜻밖의 방식으로 새롭게 쓰여지는 중이다.
90년대 음악의 모든 순간이 늘 아름답기만 했다고는 말할 순 없다. 세련미에 대한 경쟁적 추종 속에 민중가요는 위축됐고 포크와 헤비메탈의 설 자리도 좁아졌다. 댄스 위주의 가요계를 우려하는 기성세대의 목소리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촌스러우면서도 정감 있는 <응사>의 캐릭터들처럼 아날로그적 감수성이 아직은 남아 있던 90년대의 음악들, 무엇보다 지금 대중들에게도 매력적으로 전달되는 그 시절 가요의 세련된 감수성과 정서적 ‘호환성’은 당시 음악들이 단순한 복고를 넘어 현재화된 대중음악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호출되리라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다. <응사>가 소환해낸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 그 새로운 물결의 작은 역사는 이렇게 뜻밖의 방식으로 새롭게 쓰여지는 중이다.
김영대 /대중음악평론가 <90년대를 빛낸 명반 50> 지은이
사진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서태지와 아이들까지 대거 활동
고전음악 출신 작곡가 유입
양질의 음악 쏟아졌던 10년
가요는 촌스럽다는 관념 깨
세련된 감수성 세대넘어 ‘호출’ 동아기획과 하나음악으로 대표되던 ‘언더그라운드’의 적자들인 김현철, 봄여름가을겨울, 조규찬. 이들은 80년대 말 들국화, 어떤날, 유재하가 이룩해낸 유산을 이어받아 제도권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했다. 신해철, 공일오비(015B), 전람회처럼 가수이면서 음악감독이었던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100만장 가수’였던 신승훈, 김건모, 이승환,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서태지와 아이들(사진)과 듀스가 공히 아이돌 스타이기 이전에 스스로의 음악에 전권을 갖는 ‘작가’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90년대는 가요계를 장악한 아이돌 댄스 음악의 위세 속에서도 이런 작가군의 음악이 동시대의 모든 대중에게 부담 없이 받아들여져 장르적 균형을 이룬 사실상 유일한 시기였다. 한편 유재하의 등장에 자극을 받은 고전음악 작곡과 출신들의 가요계 대거 유입은 대중가요의 미학을 근본적으로 바꾼 계기가 됐다. 신재홍, 김형석, 유희열 등은 클래식과 재즈에서 익힌 세련된 화성 운용과 작곡법을 앞세워 선배들이 미처 성취하지 못했던 현대적 한국 팝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시에 서태지, 윤상, 공일오비 등 이른바 ‘신세대’ 뮤지션들이 정통적인 작곡법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활용한 전자음악에 탐닉하며 표현 지경을 넓히기도 했다. 흔히 ‘뽕끼’를 극복했다고 평가받는 90년대식 한국 팝은 외국 음악만 듣고 자란 이들에게도 즉각적 공감을 얻어냈고, 촌스럽다고만 생각되던 가요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게 만든 계기가 됐다. 최근 이 드라마를 통해 90년대 음악을 새롭게 알게 된 지금의 10대와 20대 청취자들이 그 시절 노래들에서 크게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20년 전 곡을 리메이크한 성시경의 ‘너에게’(서태지와 아이들), 하이니의 ‘가질 수 없는 너’(뱅크), 김예림의 ‘행복한 나를’(에코)의 성공은 90년대 음악이 가진 ‘현대성’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김영대
김영대 /대중음악평론가 <90년대를 빛낸 명반 50> 지은이
사진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꽁트] 마지막 변신 [꽁트] 마지막 변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6/20250126502223.webp)
![‘믿음’이 당신을 구원, 아니 파멸케 하리라 [.txt] ‘믿음’이 당신을 구원, 아니 파멸케 하리라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3/20250123504340.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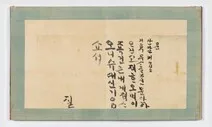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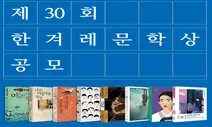
![그들은 ‘작은 것들’에 집착했다 [.txt] 그들은 ‘작은 것들’에 집착했다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4/2025012450309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