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월 초, 어찌어찌 하여 일본인 가족의 한국 여행을 안내하게 되었다. 제대로 안 되는 일본어 실력인지라 손짓,발짓, 그리고 눈짓으로 여행 가이드(?) 역을 해내기란 정말 힘에 겨웠다. 추억담이 될지, 악몽이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알겠지만, 잠시 적어 보기로 한다.
첫 만남은 종로 코리아나 호텔 근처였다. 이 일본인은 한국에 자주 왔다고 한다. 저녁에 만나서 어떻게 식사 대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앞장서서 종로의 고기집에 들어간다. 그 음식점은 일본인 관광객 자주 상대하는 듯, 종업원들의 일어 솜씨가 놀라웠다.
H(이제 부터 한국 관광객 일본인을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는 '맥주 주세요'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에 자주 관광오는 편이고, 그때마다 거의 먹고, 즐기는 관광을 하는 편이라서 식당용 한국어는 자신있지만, 비지니스 한국어는 영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1인분에 5만원이 넘는 고기를 겁도 없이 시키는데, 3인분을 시키니 종업원이 '사람 수대로 시켜야 한다'며 5인분부터 주문을 받는단다. 속으로는 식당측의 요구 사항이 맘에 안들었지만, 일본인을 앞에 두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일단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그날 계산은 H씨가 했는데, 3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그러면서 H는 말한다. 그 식당이 관광 안내지에 소개된 집이며, 턱없이 비싼 금액은 일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식당을 나오면서 이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하는지, 어째야 하는지 속에서 시끄럽게 고민이 되었지만, 결국 아무말도 못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의 관광 사업이 부진할 수 밖에 없음을 절감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오전 10시 반까지 시청 근처 코리아나 호텔로 부랴부랴 달려갔다. 버스를 눈 앞에 두고도 어이없이 놓치는 바람에 호텔에 전화해서 약속 시간을 10시 반으로 변경하였다. 호텔 들어가기 전에 전철표를 미리 구매하였다. 그들을 만나서 아침 식사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식사 전이라 했다.
서울역에 도착하여 그 전날 밤에 예매했던 KTX표를 확인하고, 커피와 샌드위치를 샀다. 내 몫의 샌드위치는 사지 않았는데도 2만원을 초과하는 계산이 나왔다. 동반석 자리에 앉아 녹차라떼를 비우는 사이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참느라 고생했다. 일본의 신칸센과 KTX를 비교하면서 창밖의 풍경을 보노라니, 드디어 천안 아산역에 도착. 한명의 일행이 합류하여 기사 노릇을 했다. 첫 목적지는 예산의 수덕사. 수덕사로 가는 도중 졸음을 참지 못하고 난 잠깐 졸았다. 점심 식사를 위해 산채비빔밥을 먹겠다고 식당에 들어갔다. 예의 H의 '아줌마, 맥주 주세요'란 소리가 영낙없는 한국인 남성이다. 식당 아줌마도 나중에야 일본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음식이 매운 것을 걱정했다. 실제로 H를 비롯한 일본인들은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은 음식은 거의 손에 대지 못했고, 그나마 된장찌개에 위안을 삼으며 돼지고기만 열심히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수덕사로 향했다. 우리가 약이라고 마시는 절 앞의 샘물을 이들은 손을 씻는데 사용했다. 조그만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어 들어가 보았다. 나름의 자부심과 역사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일어로 된 안내책자를 요구하였더니, 박물관을 지키고 있던 한 관계자가 하는 말. "그런 것 없어요. 말로 잘 설명해 주세요." 여지없이 외국인에게 관광 뿐만이 아닌, 올바른 인식 심어주는 것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는 아직도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말았다. 더구나 H일행들은 박물관 관람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지, 휭하니 사라져 버린다. 그도 그럴것이 소장된 물건들에는 일어 표기도 없지만, 영어와 한글의 간단한 이름명만 있을 뿐,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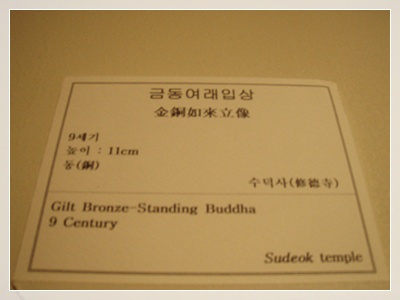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음을 절감하고 수덕사를 뒤로 하고, 한국의 바다를 보여주기 위해 서해로 향했다. 간월암에 도착하여 밀물 시기여서 조그만 나룻배를 타보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안면도 꽂지로 향했다.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음을 절감하고 수덕사를 뒤로 하고, 한국의 바다를 보여주기 위해 서해로 향했다. 간월암에 도착하여 밀물 시기여서 조그만 나룻배를 타보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안면도 꽂지로 향했다.
 온천욕을 즐기는 사람들이라서 안면도 롯데 오션캐슬 해수욕을 즐기고 호텔내에 있는 곳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네들의 입맛에 맛는 것이 없었는지, H의 아홉살 난 딸아이가 커리라이스가 안된다고 심통을 부리고, H 부부는 고심끝에 메뉴를 고르긴 했다. 난 즐거운 식사가 되었는지는 묻고 싶지 않았다.
온천욕을 즐기는 사람들이라서 안면도 롯데 오션캐슬 해수욕을 즐기고 호텔내에 있는 곳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네들의 입맛에 맛는 것이 없었는지, H의 아홉살 난 딸아이가 커리라이스가 안된다고 심통을 부리고, H 부부는 고심끝에 메뉴를 고르긴 했다. 난 즐거운 식사가 되었는지는 묻고 싶지 않았다.
 안면도에서 종로의 코리아나 호텔까지 바래다 주니, 밤 11시이다. 피곤에 절게 된 시간.
여행이 즐거웠는지, 유익했는지를 형식적으로 물을 수 밖에 없었다. ‘혼내’(속내)와 ‘다테마에’(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원칙이라고 해석하던….)를 일인들 스스로도 인정한 마당에 즐거웠다고 말해도 너무나 피곤한지라….
피곤했던 여행 안내를 마치고, 나의 미숙한 가이드도 한몫을 했겠지만, 외국인 관광 안내가 체계를 잡지 못하고, 국민의식이 부족함을 인식하게 된 계기였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본의 관광 상품과 체계는 무서울 정도란 생각이 들게 한다. 자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일인들에게 놀랄만한 여행을 안내하고 싶었던 욕심만 컸던 것인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여행이었다.
안면도에서 종로의 코리아나 호텔까지 바래다 주니, 밤 11시이다. 피곤에 절게 된 시간.
여행이 즐거웠는지, 유익했는지를 형식적으로 물을 수 밖에 없었다. ‘혼내’(속내)와 ‘다테마에’(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원칙이라고 해석하던….)를 일인들 스스로도 인정한 마당에 즐거웠다고 말해도 너무나 피곤한지라….
피곤했던 여행 안내를 마치고, 나의 미숙한 가이드도 한몫을 했겠지만, 외국인 관광 안내가 체계를 잡지 못하고, 국민의식이 부족함을 인식하게 된 계기였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본의 관광 상품과 체계는 무서울 정도란 생각이 들게 한다. 자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일인들에게 놀랄만한 여행을 안내하고 싶었던 욕심만 컸던 것인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여행이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여 그 전날 밤에 예매했던 KTX표를 확인하고, 커피와 샌드위치를 샀다. 내 몫의 샌드위치는 사지 않았는데도 2만원을 초과하는 계산이 나왔다. 동반석 자리에 앉아 녹차라떼를 비우는 사이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참느라 고생했다. 일본의 신칸센과 KTX를 비교하면서 창밖의 풍경을 보노라니, 드디어 천안 아산역에 도착. 한명의 일행이 합류하여 기사 노릇을 했다. 첫 목적지는 예산의 수덕사. 수덕사로 가는 도중 졸음을 참지 못하고 난 잠깐 졸았다. 점심 식사를 위해 산채비빔밥을 먹겠다고 식당에 들어갔다. 예의 H의 '아줌마, 맥주 주세요'란 소리가 영낙없는 한국인 남성이다. 식당 아줌마도 나중에야 일본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음식이 매운 것을 걱정했다. 실제로 H를 비롯한 일본인들은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은 음식은 거의 손에 대지 못했고, 그나마 된장찌개에 위안을 삼으며 돼지고기만 열심히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수덕사로 향했다. 우리가 약이라고 마시는 절 앞의 샘물을 이들은 손을 씻는데 사용했다. 조그만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어 들어가 보았다. 나름의 자부심과 역사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일어로 된 안내책자를 요구하였더니, 박물관을 지키고 있던 한 관계자가 하는 말. "그런 것 없어요. 말로 잘 설명해 주세요." 여지없이 외국인에게 관광 뿐만이 아닌, 올바른 인식 심어주는 것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는 아직도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말았다. 더구나 H일행들은 박물관 관람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지, 휭하니 사라져 버린다. 그도 그럴것이 소장된 물건들에는 일어 표기도 없지만, 영어와 한글의 간단한 이름명만 있을 뿐,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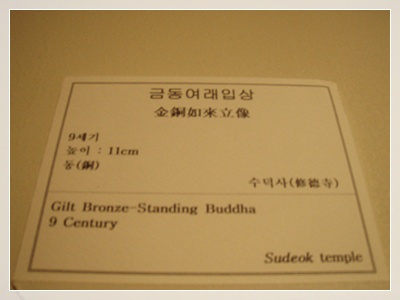



| 한겨레 필진네트워크 나의 글이 세상을 품는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