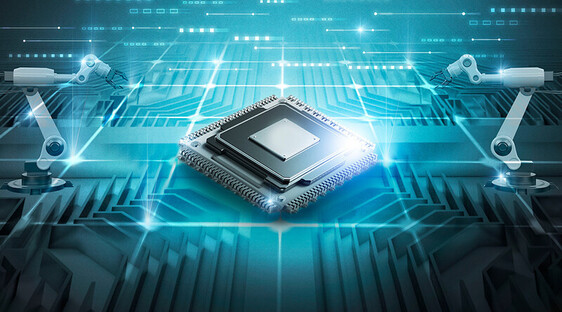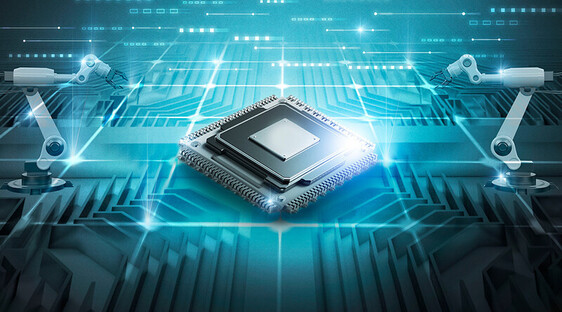한국 자동차 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소재·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60% 이상에 달해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차 출고 지연의 주범으로 꼽히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은 향후 2∼3년간 더 지속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미·중 분쟁과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중국 의존은 심화됐다”며 “한국 자동차 부품도 일본 의존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수입국 가운데 중국 비중은 2000년 1.8%에 그쳤지만, 올해 1∼4월 36.2%까지 늘어났다. 반면, 일본 비중은 2000년 45.5%에서 올해 1∼4월 11.1%로 줄었다.
조 연구위원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소재와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짚었다. 배터리 4대 소재 가운데 하나인 음극재는 83%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나머지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도 각각 60% 이상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 배터리 원재료인 흑연(100%), 망간(93%), 코발트(82%), 니켈(65%), 리튬(59%)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 연구위원은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중국 의존도가 강화되는 부분이 걱정스럽다”며 “국내 공급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 관련 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성수 숭실대학교 교수(정보통신전자공학부)는 “차량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차량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뒤 감산을 했는데, 차량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됐다”며 “현재 리드타임(주문 뒤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50∼80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발전 수요 확대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상황이 최소 2~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배터리 반도체는 그린에너지 분야 반도체와 생산 기반을 공유한다”며 “태양광, 풍력발전 분야에도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쪽 수요가 늘어나면 차량용 반도체가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용 반도체는 개발 난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아 새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엔엑스피(NXP·네덜란드), 인피니언(독일) 등 7개 업체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과독점 시장이다. 이 교수는 “차량용 반도체는 시장이 크지 않지만,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핵심 소재를 확보하는 것으로 여겼으면 한다”며 “수익성보다는 전략적 접근이 타당하다. 국내 자동차업체에 안정적으로 차량반도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생산 인프라를 국내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