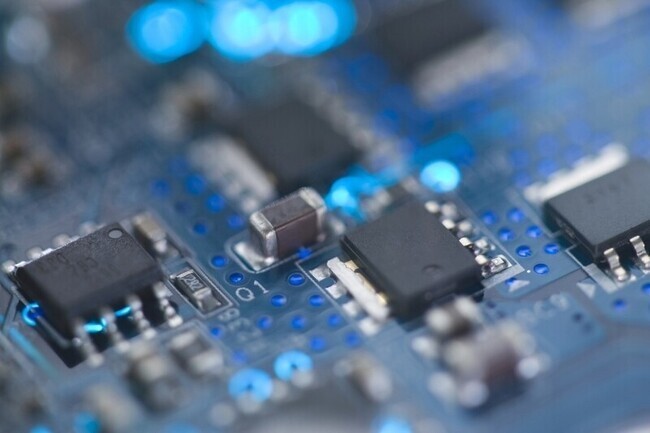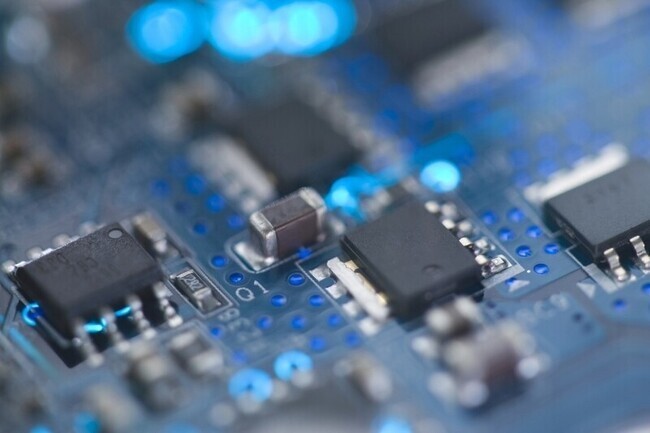한국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은 모두 ‘파격적 혜택’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엔 차이가 뚜렷하다.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이 돌봄’ 의무까지 부과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지원에 딸린 조건이 사실상 없다.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목표와 지원 조건 등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4일 미국 상무부 누리집을 보면,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은 지원 대상의 심사 기준과 의무 조항이 깐깐한 게 특징이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약 527억달러)과 세액공제(공제율 25%) 두 축으로 짜여 있다. 눈에 띄는 건 보조금 지원 요건이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를 활용해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을 금지했다. 또 10년간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 내 반도체 설비 증설 제한 등의 단서를 붙였다. 보조금이 주주들에게 돌아가거나 지원 조처가 미국의 대외 안보·경제 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또 보조금을 1억5천만달러(약 2천억원) 이상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는 직원과 건설노동자를 위한 보육 지원 계획 제출도 의무화했다. 여성과 소외계층의 노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아이 돌봄 비용을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직접 부담토록 한 셈이다.
또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데이비스-베이컨법’(DBA), ‘프로젝트 노동법’(PLA), ‘국가환경정책법’(NEPA) 등 연방정부 규정도 지켜야 한다. 디비에이법과 피엘에이법에 따라 반도체 공장 건설노동자들은 적정 임금을 보장받고, 건설 기간 한시적으로 기업과의 단체교섭 창구인 노동조합도 설립할 수 있다. 현지에선 미국 반도체법이 “사실상 노동·보육 정책 아니냐”는 평가까지 제기되어온 까닭이다.
나아가 보조금 지급 심사 땐 재생에너지 사용 등 기업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 의지, 여성·소외계층의 근무 기업과의 계약 여부까지 살핀다.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고 나서도 최소 6개월마다 자금 활용 내용을 상무부에 제출하고 기존 예상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올리면 보조금을 환수(초과이익 공유)당한다.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녹아 있는 셈이다.
한국 사정은 확연히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올해부터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미국과 같은 최고 25%로 상향된데다,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1천억원 등 반도체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약 38%(3200억→4400억원·일부 디스플레이 지원 예산 포함) 늘어났다.
그러나 지원을 받는 기업에 ‘투자 확대’ 외에 부과하는 조건은 사실상 전무하다. 한국의 지원 방식은 보조금보다는 투자 세액공제에 치우쳐 있는 탓이다. 투자액에 일정 비율로 세금을 빼주는 구조인 터라 별도의 조건을 달기 어려운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 예산과 관련해 “직접 혜택을 보는 건 기업이지만, (예산으로 구축되는) 인프라가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기업에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외려 대가 없는 지원을 더 늘리자는 요구도 적지 않다. 실제 한국의 ‘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난달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한병도·정일영(이상 더불어민주당)·김학용(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 9건이 무더기로 추가 상정됐다. 반도체와 같은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를 추가하고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정부안보다 높이자는 내용 등이다.
기재위 소속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미국과 다르게 우리 법안(반도체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나 조건 논의 없이 ‘묻고 더블로 가자’는 식으로 지원 대상을 (정부안보다) 외려 더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