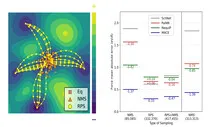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에서 한 투자자가 주식시황판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영국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쿠알라룸푸르/AFP 연합뉴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현실화로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와 거기에서 파생된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최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 전체로 볼 때 영국의 경제 규모가 대단한 수준은 아니지만 금융 불안 전파와 보호주의 대두 가능성, 가뜩이나 부진한 세계 경기를 고려하면 영국이 세계 경제를 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번 선택으로 1차적 피해를 입는 건 영국인 자신들이다. 60여년간 공들여 축성한 유럽연합(EU) 체제를 버리면서 유럽 대륙과 자유로이 오가던 무역·투자·이민 등의 흐름이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금융산업에 미칠 악영향도 불가피하다. 미국 뉴욕에 버금가는 국제 금융 허브인 런던에 둥지를 틀고 있는 제이피모건체이스 등 대형 금융업체들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업 근거지를 옮길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영국 밖 유럽연합 역내에서 아무 제한 없이 경제활동을 해온 영국인 120만명의 지위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앞으로 2년간 유럽연합과 탈퇴 조건과 기존 조약들의 변경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럽연합 소속이 아니어도 무관세 등 기존 조약 내용을 다른 이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영국에 유럽연합 국가들이 과거 같은 대우를 해주기는 어렵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브렉시트 이후 재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터다.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 투표가 가결되면 2년간 국내총생산(GDP)이 3.6~6.0% 축소되고 실업률은 1.6~2.4%포인트 높아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까지 영국 국내총생산이 5.5%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역내 2위 경제 규모를 지닌 영국이 떨어져나간 유럽연합도 교역량 축소 등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은 브렉시트 현실화 때 2018년 유럽연합 총생산이 0.2~0.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유럽연합 이외 지역 총생산은 0.2%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 폭락과 경제심리 위축 등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면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은 최근 의회에 나와 “브렉시트 투표는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24일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 금융·외환시장에 주는 리스크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기가 좋지 않은 점도 걱정을 보탠다. 지금은 유럽연합의 유로화 사용 지역인 유로존을 비롯해 세계 경제 전반이 부진한 상황이다. 세계 교역량은 공급 과잉과 원자재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다. 지난해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1.5%에 그쳤고, 실업률은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 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인들이 이민에 대한 반감에 터잡아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한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보호주의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1957년 설립된 유럽경제공동체(EEC)가 현재의 유럽연합으로 발전하면서 28개국을 품기까지 탈퇴한 국가는 없었다. 1948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에 162개 회원국이 가입하는 동안 역시 탈퇴국은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영국의 ‘일탈’이 세계 경제 조류를 정면으로 거스른 행동이라는 점이 더욱 도드라진다. 통합 일로를 걷던 세계 경제가 영국이 방아쇠를 당긴 보호주의와 분열, 대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각국이 이에 대처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점도 심각한 대목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이미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설정했다. 이제 경기가 다시 급강하하면 속수무책이 될 공산이 크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속보] 한은, 기준금리 3.00%로 동결 [속보] 한은, 기준금리 3.00%로 동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6/20250116500843.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