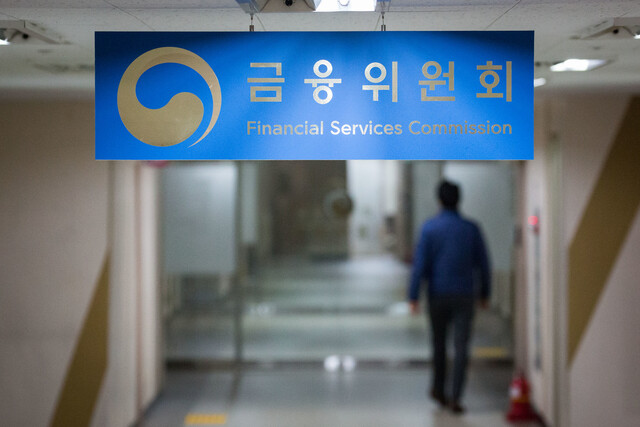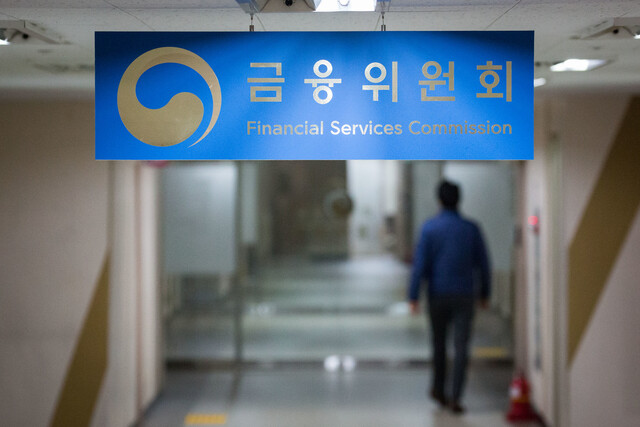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산하 회계 전문 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이 최근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이후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감리위원의 기업 사외이사 겸직은 감리 결과에 대한 공정성·신뢰도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감리위원을 맡은 ㄱ교수는 지난달 4대 그룹의 한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감리위원은 감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기업의 회계·감사가 적법하게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피는 자리다. 증선위의 최종 심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위치이기도 하다. 이런 터라 ㄱ 교수가 금융감독원의 감리 대상인 상장회사이기도 한 재벌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은 행위는 이해 충돌 논란으로 번질 공산이 짙다.
감리위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는 금융당국은 이런 논란에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현 규정상 감리위원의 사외이사 겸직은 허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ㄱ교수와 그가 사외이사를 맡은 기업 쪽은 모두 <한겨레>에 “사외이사 선임 당시 법률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으며 민간 감리위원이 기업 사외이사를 겸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현행 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선 감리위원에게 특정 사안에서만 회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감리위원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한다.
감리위 상위기구인 증선위는 민간(비상임) 위원의 기업 사외이사 겸직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임 증선위원들은 법·규정상 겸직 금지 의무는 없지만 관행으로 기업 사외이사를 맡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업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증선위원들의 사외이사 겸직이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처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감리위원회 주된 기능이 제재 심의인데 감리위원의 사외이사 겸직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아가 사외이사를 겸직한 감리위원이 정보 유출이나 로비 창구가 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감리위원의 사외이사 겸직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