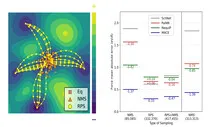황창규 케이티 회장이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티 제공
2013년 황창규 회장 선임 때는 45 대 1, 현재 선임 작업이 진행중인 차기 회장은 37 대 1. 케이티(KT) 회장 경쟁률이다. 케이티 회장 선임 때마다 도전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최정우 포스코 사장 선임 당시 경쟁률은 21 대 1이었다.
케이티 안팎에선 회장 선임이 ‘올림픽’에 비유되기도 한다. 도전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명분은 통신·경영 전문가이면서 통신의 공공·공익성에 대한 이해가 넓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들의 통신 이용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물밑 음모와 계략이 난무하기도 한다. 현 회장과 노조 등 회사 내부의 이해 관계자는 물론이고, 케이티 이사회 멤버들과 연결되는 인맥과 대통령 측근들까지 소환된다.
케이티 회장은 어떤 자리이길래 이렇게 경쟁률이 높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할까.
우선 케이티 회장은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3조4천억원과 1조2천억원(이상 2018년 연결기준)을 넘는 한국 대표 통신사의 최고경영자(CEO)다. 케이티는 계열사 40여개를 거느리고, 직원은 본사 2만3천여명에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6만여명에 이른다. 본사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지만, 회장실은 청와대가 내려다 보이는 서울 광화문 이스트사옥 24층에 있다.
“정치권과 정부까지 개입할 수 있어 올라가기도 쉽지 않지만, 앉으면 절대 스스로는 내려올 수 없다.” 케이티 사장(이석채 회장 이전 케이티 최고경영자들은 모두 사장이었음)을 지낸 한 인사는 케이티 최고경영자 자리를 이렇게 정의했다. 실제로 남중수 전 사장과 이석채 전 회장은 정권의 퇴진 ‘눈짓’에도 연임과 자리 유지를 고수하다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로 몰리기도 했다. 한 배를 탄 ‘측근’ 임원들도 회장이 자진 퇴진 용단을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른바 ‘오너’가 없는 케이티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영진이 회사 경영을 잘못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때 이사회가 나서야 하지만,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수십억원을 관련 재단에 기부한 것을 이사회가 사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는지를 노조(1노조 기준)가 따져물은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케이티 회장의 연봉도 이석채 전 회장 때 크게 높아졌다. 황 회장의 연봉은 2014년 5억원대, 2015년 12억원대, 2016년 24억원대, 2017년 23억원대, 2018년 14억원대였다. 5억원대의 급여에 성과급 성격의 ‘상여금’이 더해진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실적 악화 등으로 상여금이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석채 전 회장 이전에는 최고경영자 연봉이 상여금을 포함해 10억원을 넘지 않았다. 전직 케이티 사장은 “케이티 출신 최고경영자들은 10억원 넘는 연봉을 받을 생각조차 못했다. 이석채 전 회장이 이를 깨면서 지금은 20억원대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퇴직금도 높게 산정된다. 케이티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케이티 회장의 퇴직금은 이석채 전 회장 시절 근속연수에 5를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6년인 황 회장의 경우, 퇴직금이 월 급여의 30배에 달하는 셈이다. 사장의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3, 부사장은 2, 전무·상무는 1.5를 곱한다. 케이티 내부에선 황 회장 연임 뒤 퇴직 임원들에 대한 대우를 강화하면서 퇴직금 산정 방식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케이티 홍보실은 “최근 들어 퇴직금 규정을 바꾼 적이 없다. 황 회장을 포함해 임원 퇴직금 산정방식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퇴직금 외에 장기성과급도 받는다.
케이티 회장이 회삿돈으로 지인을 챙기는 일도 벌어진다. 이석채 전 회장 시절에는 회장 지인들을 케이티 본사는 물론이고 사업부문과 자회사의 ‘고문’, ‘자문역’ 등으로 위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 사람들이 많았는데, 당시 정보통신부 관료들과 안기부 간부들까지 포함됐다. 당시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케이티 사장은 “당시 회장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 대충 따져봐도 연간 200억원을 넘는다고 말이 많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케이티 회장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케이티 회장은 계열사까지 포함해 6만여명에 대한 인사권을 쥔다. 이석채 회장 시절 취업 청탁 비리도 따지고 보면 회장의 막강한 인사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황 회장은 2014년 취임하자마자 8300명의 직원을 정리하기도 했다. 전 정부의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청와대 근무 때부터 지인들에게 “공직을 마치면 케이티나 포스코의 회장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했다. 한 전직 임원은 “케이티 회장은 대통령 측근과 ‘거래’도 할 수 있는 자리다. 고문이나 자문역 위촉을 통해 대선 캠프 식구 100명 이상에게 취업 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 회장의 이런 권한과 영향력은 통신사인 케이티 경영을 잘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통신 이용 편익을 높이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회장이 이를 외면하거나 소홀히하면서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면, ‘도덕적 해이’의 ‘완결판’이 될 수도 있다. 케이티 이사회가 ‘통신·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췄으면서 통신의 공공·공익성에 대한 안목을 가진 인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