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2월23일 일본 도쿄 남쪽 해상의 화산섬 이오지마의 스리바치산 정상에 미국 성조기를 게양하는 미 해병 4사단28연대 군인들. 제2차대전 중 미국이 일본 본토 공습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 작은 섬을 탈환하는 과정에서도 일본군 2만여명과 미군 6000여명이 전사했다. 노스캐롤라인 디지털역사관 제공
[토요판] 정문태의 제3의 눈
<4> 2차대전 종전 68주년
<4> 2차대전 종전 68주년
제1, 2차 이라크 침공에 이어
아프간 침공과 코소보전쟁,
파키스탄·팔레스타인 낀
중동 묶으면 상시전쟁 체제
이름만 안 붙였을 뿐 3차대전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이
내부충돌로 3~4%나 사라진
최고 악질전쟁 2차대전
이를 포함해 미국 개입한
전쟁 희생자 최대 3천만명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세상 곳곳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려왔다. 올해 8월15일로 68번째다. 주로 승자들의 회상으로 메워왔지만, 이따금 패자들의 회한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승자도 패자도 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에 따라 시민 3천만~5천만명을 포함해 5천만~8천만명이 희생당했다는 추측만 나돌 뿐이다. 하여 기껏 68년 전 역사가 아직도 공백으로 남아 있다. 두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는 현대사에서 연구자에 따라 이처럼 엄청난 셈값 차이를 보인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셈값을 따르든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사에서 최대 희생자를 낸 최고 악질 전쟁이었다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는 1939년 세계 인구가 약 20억명이었던 것을 놓고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종의 생명체가 내부 충돌로 6년 만에 3~4%나 사라진 꼴이다. 생물학적으로도 충격적인 일이다. 이때쯤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다. “한 사람 죽음은 비극이지만 수백만명 죽음은 통계다.” 러시아 정치인 스탈린이 미국 대사 윌리엄 에이브럴 해리먼에게 했다는 말이다. 냉전기간 내내 스탈린의 대량 숙청을 비난할 때 미국 언론과 학자들이 즐겨 써먹는 유명한 문구가 됐다. 물론 러시아 정치 사료에서는 그런 문맥을 찾을 수 없어, 요즘도 심심찮게 연구자들끼리 부딪치는 논쟁거리다. 누가 옳은지는 연구자들 몫으로 남겨두고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최대 승자였던 미국식 ‘수백만명 죽음은 통계다’를 이야기해 보자. 아주 특별한 전쟁 전문 국가의 탄생 미국은 237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거치는 동안 시시콜콜 모든 기록을 남겼지만 유독 전쟁 기록만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미국은 거의 모든 전쟁에서 교전 상대국 희생자뿐 아니라 자국 희생자 수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미국 역사는 승리만 기록할 뿐이었고, 미국 정부는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온 가장 야만적인 정치 행위인 전쟁을 감춰왔다는 뜻이다. 그들은 베트남전쟁에서 적군 희생자 숫자를 매일 밝히는 이른바 ‘보디 카운트’(body count)를 했지만,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직면한다. 전쟁에서까지 패하면서 호된 비난을 받자 그 뒤의 전쟁에선 공식적인 집계를 포기했다고 한다. 1991년 제1차 이라크 침공에서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크인)의 보디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듯이 말이다. 하지만 237년 미국 역사를 훑어보면 그 보디 카운트를 하지 않은 건 최근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미국 안에서 자신들이 학살한 인디언 원주민 수마저도 자료나 통계가 없을 정도니. 그동안 미국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어림잡아 보자. 1776년 독립을 선언한 미국은 8년에 걸친 독립전쟁(1775~1783년)에서 미군 5만여명과 영국군 5만여명을 합해 모두 10만명 웃도는 희생자를 냈다. 이어 19세기 말까지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영토 확장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디언 원주민 300여만명을 학살했다. 그 사이 남북전쟁(1861~1865년)이라는 내전에서는 60만명 웃도는 희생자를 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독립전쟁 때 프랑스로부터 빌린 전비를 갚지 않겠다고 우기며 도미니카에 해병대를 파견해 프랑스 전함을 나포했던 이른바 준전쟁(Quasi-War 1798~1800년)을 시작으로 온 세상에 군대를 파견해 공격적인 국제정치의 발판을 깔았다. 미국은 지중해의 트리폴리 왕국을 공격한 제1차 바버리전쟁(1801~1805년), 제2차 브리티시-아메리카전쟁인 1812년전쟁(1812~1815년), 국경선 분쟁인 멕시코-아메리카전쟁(1846~1848년) 같은 굵직굵직한 전쟁을 벌이더니 1898년 스페인-아메리카전쟁을 통해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괌에서 스페인군과 충돌해 10만여명 희생자를 냈다. 이어 미국은 필리핀 독립전쟁이었던 필리핀-아메리카전쟁(1899~1902년)에서 100만명 웃도는 필리핀 시민을 학살했다. 그렇게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내전과 국제전을 동시에 치르면서 아주 특별한 전쟁 전문 국가로 성장했다. 미국의 무력 도발은 사연도 가지가지였다. 쿠바(1822년), 푸에르토리코(1824년), 그리스(1827년)를 해적 소탕 빌미로 공격했고, 수마트라(1832년), 일본(1853~1854년), 조선(1871년)엔 개방을 요구하며 쳐들어갔다. 그런가 하면 미국 탐험대나 선원, 외교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피지(1840년), 사모아(1841년), 포모사(1867년), 중국(1866년)을 침략했다. 또 아르헨티나(1852~1853년), 우루과이(1855년), 파나마(1856년), 앙골라(1860년), 이집트(1882년), 하와이(1889년), 칠레(1891년), 니카라과(1896년), 콜롬비아(1901년), 온두라스(1903년), 시리아(1903년), 터키(1912년)엔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미국 시민과 재산을 보호한다며 군대를 파견했다. 이렇듯 몇몇 본보기만 늘어놓았지만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미 전쟁의 이름으로 최소 500만명 웃도는 희생자를 냈다. 미국이란 나라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을 먹고 자랐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테러와의 전쟁, 왜 희생자 수 밝히지 않나 제2차 세계대전 뒤부터는 미국이 개입한 전쟁에서 희생자 수가 치명적으로 늘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미군이 개입한 첫 대규모 국제전인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250만명과 군인 55만명을 포함 최소 300만명이 사망했다. 이어진 베트남전쟁(1955~1975년)에선,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1965년부터 1975년 사이에만도 340만명(로버트 맥나마라 미국 전 국방장관 추산)에서 510만명(베트남 정부 발표, 1995년)에 이르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라오스를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를 막는 방파제라 부르며 1964년부터 1973년까지 50만톤 웃도는 각종 폭탄을 라오스에 쏟아부어 20만명에 이르는 시민을 학살했다. 이른바 비밀전쟁(Secret War)이라 불렀던 그 라오스 공습이 끝나고도 지난 40년 동안 2만여명이 집속탄을 비롯한 온갖 불발탄에 목숨을 잃었다. 마찬가지로 미군은 베트콩을 잡겠다며 1969~1973년 사이에 이웃 중립국 캄보디아에 폭탄 54만톤을 퍼부어 30만~80만명에 이르는 시민을 학살했다. 그 50만톤 폭탄이란 건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투하했던 16만톤을 3배나 웃도는 양이었다. 그 뒤로도 미국은 1980년대 소비에트가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히딘 지원을 비롯해 이란-이라크전쟁(1980~1988년), 엘살바도르(1981년), 레바논(1982~1983년) 전쟁에 개입했고 그레나다(1983년)와 파나마(1989~1990년)를 무력 침공했다. 이어 미국은 1991년 제1차 이라크 침공으로 군인과 민간인 포함 약 20만명을 살해했고, 대이라크 경제제재로 최소 56만명에 이르는 어린이를 의약품 부족과 기아로 숨지게 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12년째, 그리고 2003년 이라크를 제2차 침공해 10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선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는 이 두 전쟁에서도 희생자 수를 밝힌 적이 없다. 최근 브라운대학의 민간인 희생자 조사보고서가 아프가니스탄 1만6천~1만9천명, 이라크 13만4천명을 추산한 적이 있을 뿐이다. 미국이 개입한 전쟁의 희생자는 이렇게 제한적인 지면을 통해 어림잡아 보아도 1500만명을 웃돈다. 이건 미국의 중앙정보국을 비롯한 각종 스파이 조직들이 온 세상을 대상으로 벌여온 국지전이나 지역분쟁의 희생자를 제외한 수다. 참고로 전쟁사 연구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 그동안 미국이 전쟁에서 죽인 사람 수를 2천만~3천만명으로 꼽아왔다. 타이 1년 예산보다 많았던 아프간전쟁 비용 현대사를 들춰보면 제2차 세계대전 뒤 지구상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전쟁을 미국이 주도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이 드러난다. 이건 태생적으로 전쟁을 먹고 살아온 미국의 생존방식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경제 60~70%가 군산복합체와 연동된 상태에서 미국식 자본주의는 군사비 지출을 계속 늘리지 않고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이른바 군사케인스주의(Military Keynesianism)에 매몰당해 결국 전쟁 없인 굴러갈 수 없는 체제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비가 좋은 본보기 거리다. 예컨대 테러와 전쟁을 벌이기 전인 2000년 2890억달러였던 미국의 군사비가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에 이르면 6330억달러(약 681조원)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이건 세계 경제 지표에서 10위권을 오르내리는 한국의 2012년 정부 총예산 325조의 2배를 웃도는 엄청난 돈이다. 같은 기간 세계 군사비 총액이 1조7560억달러임을 놓고 보면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쏟아부은 군사비가 세계 전체 군사비의 40%에 이른다. 같은 기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투입한 전비만도 885억달러였다. 미국이 전쟁 하나에 투입한 비용이 타이, 말레이시아, 대만 같은 아시아 주요 국가 정부들의 1년 총예산을 웃돈다. 그렇게 미국은 12년째 전쟁을 벌여온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이미 약 6500억달러를 썼다. 10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 침공에서는 그보다 많은 8천억달러를 썼다. 그런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통해 현재 미국은 독일, 일본, 한국을 비롯한 63개국에 737개 해외 군사기지(펜타곤 발표로는 865개)를 두고 156개국에 25만명 웃도는 군인을 파견해 국제 사회를 통합전쟁시스템 아래 주무르며 전쟁과 경제라는 떨어질 수 없는 미국식 쌍발엔진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상시전쟁(permanent war) 체제에 들어선 상태다. 미국은 제1차 이라크 침공(1991년)에 이어 코소보전쟁(199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2001년~오늘), 제2차 이라크 침공(2003년~오늘) 같은 전지구적 규모의 전쟁을 줄줄이 벌여왔다. 이 전쟁들의 전비와 파괴력 그리고 동맹군 수는 제2차 세계대전 규모를 웃돈다. 여기에 파키스탄을 비롯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낀 중동전쟁을 묶으면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 미국은 이미 새로운 형태의 제3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 미국의 전쟁 제물이 바로 세계 시민사회였고 그 희생자가 바로 세계 시민이었다. 미국식 전쟁의 통계에 마저 잡히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 우리는 미국의 살림살이를 위해 오늘도 이 세상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전쟁판이 벌어져야 한다는 참혹한 시대를 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즈음에 미국을 다시 보면서, 그 미국의 전쟁을 반대하는 까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부쳐 아인슈타인이 미래의 전쟁을 예언하며 즐겨 썼던 말을 올린다. “제3차 세계대전에는 어떤 무기들로 싸울지 알 수 없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는 몽둥이와 돌을 들고 싸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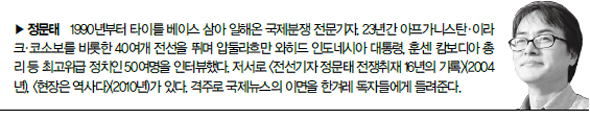 <한겨레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 보슬비 내리던 새벽이면, 그는 쇠몽둥이를 휘둘렀다
■ “박 대통령 사과하라” 전국 10만 촛불의 외침
■ 텐트 하나에 400만원…캠핑 온 거니? 장비 자랑 온 거니?
■ 영국 노동계급 쫓아내는 프리미어리그
■ [화보] 눈뜨고 못볼 4대강 후유증…깎이고 꺼지고
아프간 침공과 코소보전쟁,
파키스탄·팔레스타인 낀
중동 묶으면 상시전쟁 체제
이름만 안 붙였을 뿐 3차대전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이
내부충돌로 3~4%나 사라진
최고 악질전쟁 2차대전
이를 포함해 미국 개입한
전쟁 희생자 최대 3천만명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세상 곳곳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려왔다. 올해 8월15일로 68번째다. 주로 승자들의 회상으로 메워왔지만, 이따금 패자들의 회한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승자도 패자도 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에 따라 시민 3천만~5천만명을 포함해 5천만~8천만명이 희생당했다는 추측만 나돌 뿐이다. 하여 기껏 68년 전 역사가 아직도 공백으로 남아 있다. 두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는 현대사에서 연구자에 따라 이처럼 엄청난 셈값 차이를 보인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셈값을 따르든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사에서 최대 희생자를 낸 최고 악질 전쟁이었다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는 1939년 세계 인구가 약 20억명이었던 것을 놓고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종의 생명체가 내부 충돌로 6년 만에 3~4%나 사라진 꼴이다. 생물학적으로도 충격적인 일이다. 이때쯤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다. “한 사람 죽음은 비극이지만 수백만명 죽음은 통계다.” 러시아 정치인 스탈린이 미국 대사 윌리엄 에이브럴 해리먼에게 했다는 말이다. 냉전기간 내내 스탈린의 대량 숙청을 비난할 때 미국 언론과 학자들이 즐겨 써먹는 유명한 문구가 됐다. 물론 러시아 정치 사료에서는 그런 문맥을 찾을 수 없어, 요즘도 심심찮게 연구자들끼리 부딪치는 논쟁거리다. 누가 옳은지는 연구자들 몫으로 남겨두고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최대 승자였던 미국식 ‘수백만명 죽음은 통계다’를 이야기해 보자. 아주 특별한 전쟁 전문 국가의 탄생 미국은 237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거치는 동안 시시콜콜 모든 기록을 남겼지만 유독 전쟁 기록만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미국은 거의 모든 전쟁에서 교전 상대국 희생자뿐 아니라 자국 희생자 수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미국 역사는 승리만 기록할 뿐이었고, 미국 정부는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온 가장 야만적인 정치 행위인 전쟁을 감춰왔다는 뜻이다. 그들은 베트남전쟁에서 적군 희생자 숫자를 매일 밝히는 이른바 ‘보디 카운트’(body count)를 했지만,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직면한다. 전쟁에서까지 패하면서 호된 비난을 받자 그 뒤의 전쟁에선 공식적인 집계를 포기했다고 한다. 1991년 제1차 이라크 침공에서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크인)의 보디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듯이 말이다. 하지만 237년 미국 역사를 훑어보면 그 보디 카운트를 하지 않은 건 최근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미국 안에서 자신들이 학살한 인디언 원주민 수마저도 자료나 통계가 없을 정도니. 그동안 미국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어림잡아 보자. 1776년 독립을 선언한 미국은 8년에 걸친 독립전쟁(1775~1783년)에서 미군 5만여명과 영국군 5만여명을 합해 모두 10만명 웃도는 희생자를 냈다. 이어 19세기 말까지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영토 확장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디언 원주민 300여만명을 학살했다. 그 사이 남북전쟁(1861~1865년)이라는 내전에서는 60만명 웃도는 희생자를 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독립전쟁 때 프랑스로부터 빌린 전비를 갚지 않겠다고 우기며 도미니카에 해병대를 파견해 프랑스 전함을 나포했던 이른바 준전쟁(Quasi-War 1798~1800년)을 시작으로 온 세상에 군대를 파견해 공격적인 국제정치의 발판을 깔았다. 미국은 지중해의 트리폴리 왕국을 공격한 제1차 바버리전쟁(1801~1805년), 제2차 브리티시-아메리카전쟁인 1812년전쟁(1812~1815년), 국경선 분쟁인 멕시코-아메리카전쟁(1846~1848년) 같은 굵직굵직한 전쟁을 벌이더니 1898년 스페인-아메리카전쟁을 통해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괌에서 스페인군과 충돌해 10만여명 희생자를 냈다. 이어 미국은 필리핀 독립전쟁이었던 필리핀-아메리카전쟁(1899~1902년)에서 100만명 웃도는 필리핀 시민을 학살했다. 그렇게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내전과 국제전을 동시에 치르면서 아주 특별한 전쟁 전문 국가로 성장했다. 미국의 무력 도발은 사연도 가지가지였다. 쿠바(1822년), 푸에르토리코(1824년), 그리스(1827년)를 해적 소탕 빌미로 공격했고, 수마트라(1832년), 일본(1853~1854년), 조선(1871년)엔 개방을 요구하며 쳐들어갔다. 그런가 하면 미국 탐험대나 선원, 외교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피지(1840년), 사모아(1841년), 포모사(1867년), 중국(1866년)을 침략했다. 또 아르헨티나(1852~1853년), 우루과이(1855년), 파나마(1856년), 앙골라(1860년), 이집트(1882년), 하와이(1889년), 칠레(1891년), 니카라과(1896년), 콜롬비아(1901년), 온두라스(1903년), 시리아(1903년), 터키(1912년)엔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미국 시민과 재산을 보호한다며 군대를 파견했다. 이렇듯 몇몇 본보기만 늘어놓았지만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미 전쟁의 이름으로 최소 500만명 웃도는 희생자를 냈다. 미국이란 나라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을 먹고 자랐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테러와의 전쟁, 왜 희생자 수 밝히지 않나 제2차 세계대전 뒤부터는 미국이 개입한 전쟁에서 희생자 수가 치명적으로 늘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미군이 개입한 첫 대규모 국제전인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250만명과 군인 55만명을 포함 최소 300만명이 사망했다. 이어진 베트남전쟁(1955~1975년)에선,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1965년부터 1975년 사이에만도 340만명(로버트 맥나마라 미국 전 국방장관 추산)에서 510만명(베트남 정부 발표, 1995년)에 이르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라오스를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를 막는 방파제라 부르며 1964년부터 1973년까지 50만톤 웃도는 각종 폭탄을 라오스에 쏟아부어 20만명에 이르는 시민을 학살했다. 이른바 비밀전쟁(Secret War)이라 불렀던 그 라오스 공습이 끝나고도 지난 40년 동안 2만여명이 집속탄을 비롯한 온갖 불발탄에 목숨을 잃었다. 마찬가지로 미군은 베트콩을 잡겠다며 1969~1973년 사이에 이웃 중립국 캄보디아에 폭탄 54만톤을 퍼부어 30만~80만명에 이르는 시민을 학살했다. 그 50만톤 폭탄이란 건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투하했던 16만톤을 3배나 웃도는 양이었다. 그 뒤로도 미국은 1980년대 소비에트가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히딘 지원을 비롯해 이란-이라크전쟁(1980~1988년), 엘살바도르(1981년), 레바논(1982~1983년) 전쟁에 개입했고 그레나다(1983년)와 파나마(1989~1990년)를 무력 침공했다. 이어 미국은 1991년 제1차 이라크 침공으로 군인과 민간인 포함 약 20만명을 살해했고, 대이라크 경제제재로 최소 56만명에 이르는 어린이를 의약품 부족과 기아로 숨지게 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12년째, 그리고 2003년 이라크를 제2차 침공해 10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선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는 이 두 전쟁에서도 희생자 수를 밝힌 적이 없다. 최근 브라운대학의 민간인 희생자 조사보고서가 아프가니스탄 1만6천~1만9천명, 이라크 13만4천명을 추산한 적이 있을 뿐이다. 미국이 개입한 전쟁의 희생자는 이렇게 제한적인 지면을 통해 어림잡아 보아도 1500만명을 웃돈다. 이건 미국의 중앙정보국을 비롯한 각종 스파이 조직들이 온 세상을 대상으로 벌여온 국지전이나 지역분쟁의 희생자를 제외한 수다. 참고로 전쟁사 연구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 그동안 미국이 전쟁에서 죽인 사람 수를 2천만~3천만명으로 꼽아왔다. 타이 1년 예산보다 많았던 아프간전쟁 비용 현대사를 들춰보면 제2차 세계대전 뒤 지구상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전쟁을 미국이 주도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이 드러난다. 이건 태생적으로 전쟁을 먹고 살아온 미국의 생존방식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경제 60~70%가 군산복합체와 연동된 상태에서 미국식 자본주의는 군사비 지출을 계속 늘리지 않고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이른바 군사케인스주의(Military Keynesianism)에 매몰당해 결국 전쟁 없인 굴러갈 수 없는 체제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비가 좋은 본보기 거리다. 예컨대 테러와 전쟁을 벌이기 전인 2000년 2890억달러였던 미국의 군사비가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에 이르면 6330억달러(약 681조원)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이건 세계 경제 지표에서 10위권을 오르내리는 한국의 2012년 정부 총예산 325조의 2배를 웃도는 엄청난 돈이다. 같은 기간 세계 군사비 총액이 1조7560억달러임을 놓고 보면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쏟아부은 군사비가 세계 전체 군사비의 40%에 이른다. 같은 기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투입한 전비만도 885억달러였다. 미국이 전쟁 하나에 투입한 비용이 타이, 말레이시아, 대만 같은 아시아 주요 국가 정부들의 1년 총예산을 웃돈다. 그렇게 미국은 12년째 전쟁을 벌여온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이미 약 6500억달러를 썼다. 10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 침공에서는 그보다 많은 8천억달러를 썼다. 그런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통해 현재 미국은 독일, 일본, 한국을 비롯한 63개국에 737개 해외 군사기지(펜타곤 발표로는 865개)를 두고 156개국에 25만명 웃도는 군인을 파견해 국제 사회를 통합전쟁시스템 아래 주무르며 전쟁과 경제라는 떨어질 수 없는 미국식 쌍발엔진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상시전쟁(permanent war) 체제에 들어선 상태다. 미국은 제1차 이라크 침공(1991년)에 이어 코소보전쟁(199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2001년~오늘), 제2차 이라크 침공(2003년~오늘) 같은 전지구적 규모의 전쟁을 줄줄이 벌여왔다. 이 전쟁들의 전비와 파괴력 그리고 동맹군 수는 제2차 세계대전 규모를 웃돈다. 여기에 파키스탄을 비롯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낀 중동전쟁을 묶으면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 미국은 이미 새로운 형태의 제3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 미국의 전쟁 제물이 바로 세계 시민사회였고 그 희생자가 바로 세계 시민이었다. 미국식 전쟁의 통계에 마저 잡히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 우리는 미국의 살림살이를 위해 오늘도 이 세상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전쟁판이 벌어져야 한다는 참혹한 시대를 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즈음에 미국을 다시 보면서, 그 미국의 전쟁을 반대하는 까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부쳐 아인슈타인이 미래의 전쟁을 예언하며 즐겨 썼던 말을 올린다. “제3차 세계대전에는 어떤 무기들로 싸울지 알 수 없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는 몽둥이와 돌을 들고 싸울 것이다.”
■ 보슬비 내리던 새벽이면, 그는 쇠몽둥이를 휘둘렀다
■ “박 대통령 사과하라” 전국 10만 촛불의 외침
■ 텐트 하나에 400만원…캠핑 온 거니? 장비 자랑 온 거니?
■ 영국 노동계급 쫓아내는 프리미어리그
■ [화보] 눈뜨고 못볼 4대강 후유증…깎이고 꺼지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