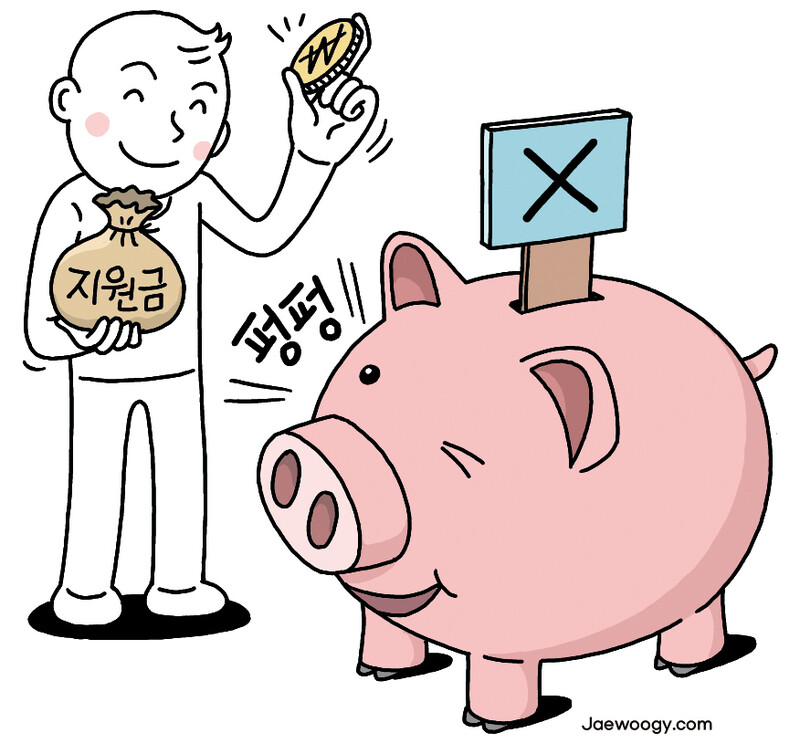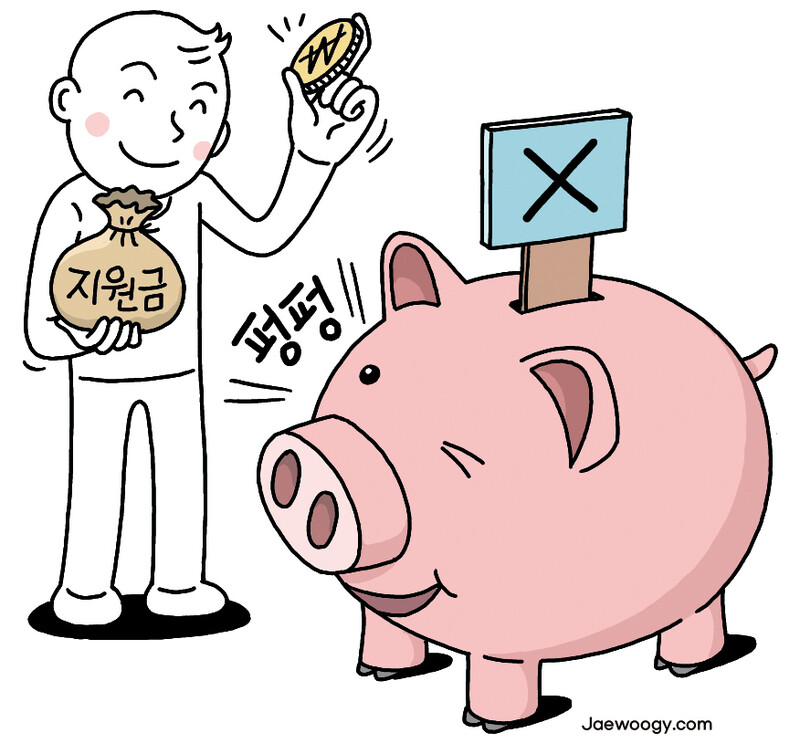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통찰한 것 가운데 ‘저축의 역설’(the paradox of saving)이란 게 있다. 개인의 입장에선 소비를 절제하고 저축을 늘려 부를 쌓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움직이면 소비가 줄고 경제가 불황에 빠져 모두가 손해를 보는 일을 말한다. 실제 불경기 때 그런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저축의 유인을 줄이고, 정부는 나랏돈을 풀어 소비를 늘림으로써 생산과 투자, 고용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돈 적이 없다. 활발한 소비가 성장을 이끈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2018년 경제성장률 2.9%, 민간소비 증가율 3.2%로 13년 만에 역전이 이뤄졌는데, 딱 한해에 그쳤다. 2019년 들어 다시 뒤집혔고,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5%나 줄었다.
2010년대의 민간소비 부진에는 가계부채 증가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적잖이 작용하고 있다. 가계가 주택 매입을 위해 부채를 늘리면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2020년 이후에도 코로나19 위기 속에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이제는 금리도 상승 추세라, 가계부채의 소비 여력 잠식은 앞으로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발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에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했다. 14조2천억원을 썼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맞벌이·1인 가구 가운데 178만 가구를 더해 전체의 88%인 2034만 가구 447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11조원이다.
정책의 성패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기존 소비에 더해 얼마나 더 쓰느냐에 달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차 지원금의 경우 매출이 4조원밖에 늘지 않아, 소비 진작 효과가 30% 안팎에 그쳤다고 밝혔다. 빚 많은 가계가 이번에는 더 쓸까?
정남구 논설위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