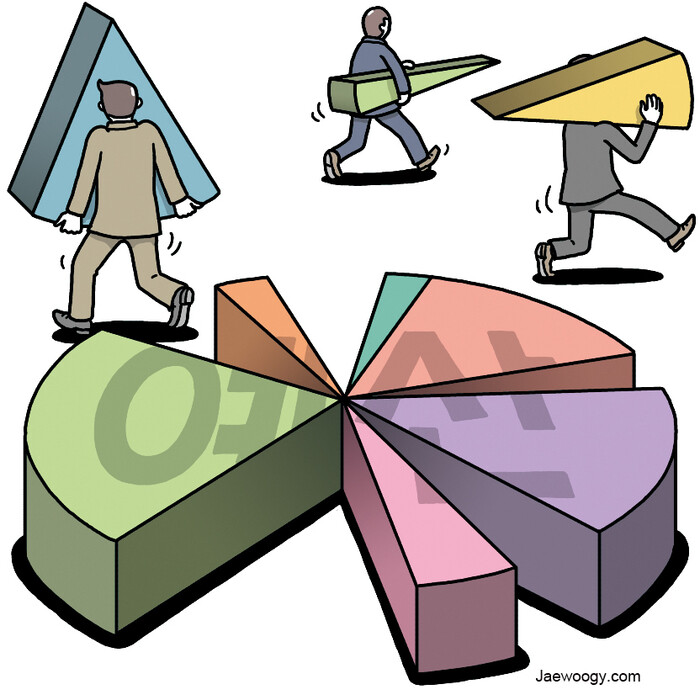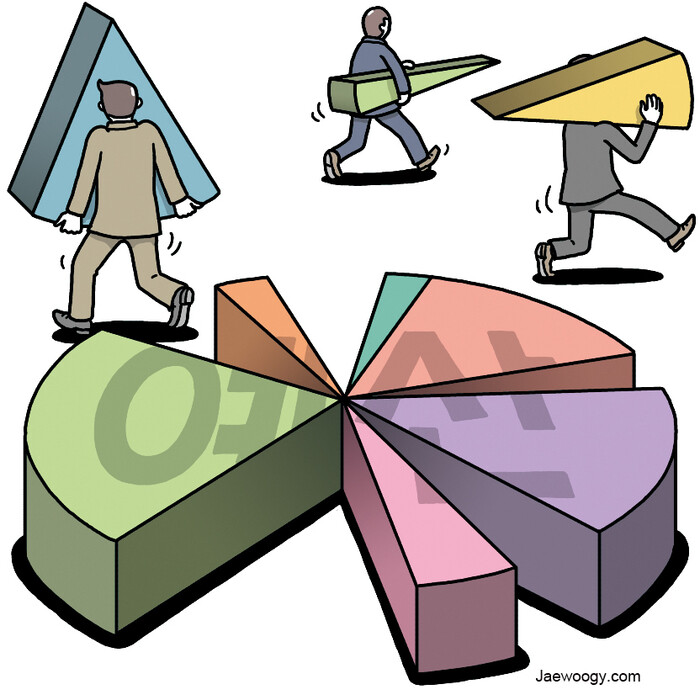나라 살림인 예산안이 막판에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 창구에서 결정되는 관행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의해야 하는데, 그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상 정부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는 예산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다. 헌법 제54조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12월2일로 못박고 있다. 그러나 이 시한을 지키는 해는 많지 않았다. 엄격한 심의를 위해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노력한다고 봐줄 수도 있을 것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한이 지나면 여야 합의에 따라 협상은 비공식 협의 창구로 넘어간다. 이때 등장하는 기구가 이른바 ‘예산 소소위’다. 공식 기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축소해 교섭단체 여야 간사들만 참여한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로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는다. 참석자들이 입을 다물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도리가 없다. 의원들이 막판에 지역구 예산을 챙길 ‘쪽지 예산’을 밀어 넣는 통로로 활용되는 이유다.
지난해의 경우, 이 소소위에서 정부 원안에 없는 사업 76개가 추가됐다. 여기엔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눈에 띄었다. 예산이 100억원씩 똑같이 불어난 도로·철도 사업도 7개나 됐는데, 정치적 배분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소소위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여야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원내대표까지 참여한 ‘3+3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모두 비공식 창구다. 밀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근대 유럽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전제 군주의 방만한 재정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의회의 투쟁에서 출발했다. 군주가 무리한 사업이나 전쟁, 사치스러운 행사 등에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통제함으로써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의 기틀을 세웠다.
요즘 우리 국회 모습을 보면, 과연 제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의원들이 예산안을 수정할 때 사업 타당성이나 시급성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비공식 창구의 협의 내용도 속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박현 논설위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