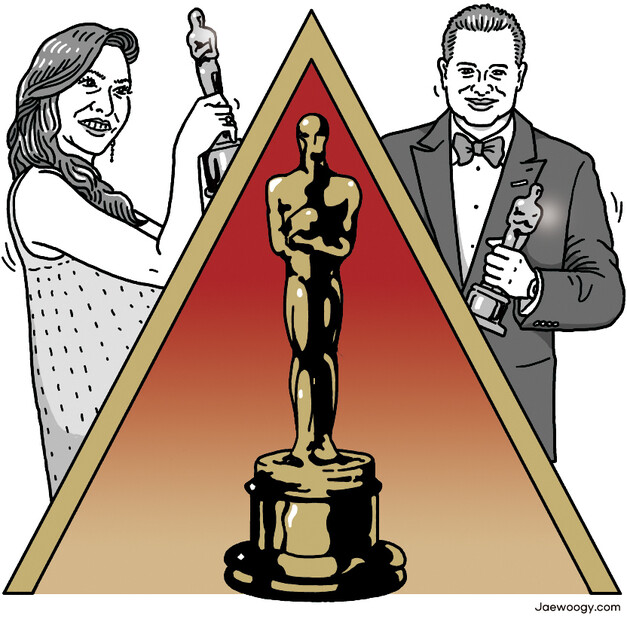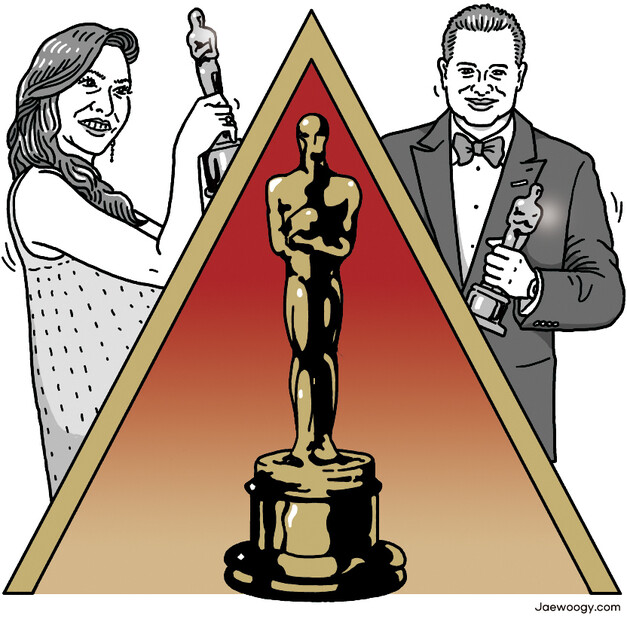레드카펫을 없앤 2023년 아카데미 시상식. 김재욱 화백
지난 13일(한국시각) 열린 제95회 아카데미상(오스카상) 시상식장에선 화려한 수상자들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사건’이 일어났다. 몇년 전 배우 윤여정도 밟았던 ‘레드카펫’이 사라진 것이다. 대신 샴페인색 카펫이 주인공들을 맞았다. 레드카펫을 화려한 이벤트의 대명사로 쓰기가 어렵게 됐다. 시상식을 주최한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노을이 지는 해변처럼 부드러운 색깔을 원해서”라고 밝혔다. 카펫이 가볍고 차분한 색상으로 바뀌자 배우들의 개성 넘치는 차림새가 오히려 빛났다.
발치에 깔린 붉은 피륙을 신성한 ‘왕의 길’로 묘사한 서술은 기원전 458년 그리스 극작가 아이스킬로스가 쓴 <아가멤논>에 처음 등장한다. 이후로 오랜 기간 유럽에서 왕족의 색으로 통했고, 중남미 아즈텍·마야 문명에서도 최소한 귀족 정도라야 입거나 걸칠 수 있었다. 염료가 귀해서 비싼데다,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빨간색 색소는 몸길이 3~5㎜인 암컷 연지벌레를 말린 가루에서 얻었다. 중남미 선인장에 붙어 사는 이 곤충에서 추출한 염료를 ‘코치닐’ 또는 ‘카민’이라고 불렀는데, 18세기 후반 합성염료가 개발되기 전까지 빨간색의 유일한 원천으로 쓰였다.
레드카펫이 오늘날과 같이 ‘특급대우’(Red-Carpet Treatment)라는 의미를 얻게 된 것은 1902년 미국에서다. 당시 뉴욕의 그랜드센트럴역에서 시카고역까지 고속 운행하던 ‘20세기 특급열차’의 1등석 손님은 푹신한 진홍색 카펫을 밟고 객차에 오르는 특전을 누렸다. 이를 눈여겨본 연극계의 거물 시드 그라우먼이 1922년 할리우드 최초의 시사회인 <로빈후드> 행사장에 레드카펫을 깔았고, 주연을 맡은 더글러스 페어뱅크스는 붉은 런웨이를 걸은 최초의 스타라는 기록을 남겼다.
오스카상 시상식에 레드카펫이 출현한 것은 1961년이지만, 컬러텔레비전 시대가 열린 1964년에야 ‘붉은’ 색상이 온전히 전파를 탔다. 이후 전세계로 퍼져나간 레드카펫은 부와 권위, 환대와 선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배우는 물론 온갖 ‘셀럽’들을 순식간에 ‘현대판 왕족’으로 꾸며주는 이 마법의 양탄자가 늘 찬사만 누린 것은 아니다. 5만제곱피트(4600여㎡)에 이르는 카펫은 설치하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렸으며, 행사가 끝난 뒤 처리 방법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62년 만에 레드카펫을 들어낸 아카데미의 변신을 칸 등 다른 영화제가 따라 할지도 관심사다.
강희철 논설위원
hck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