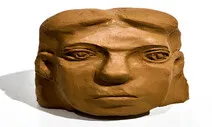오철우 기자
유레카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인 헬륨(He)의 핵은 양성자 둘과 중성자 둘이 결합해 이뤄져 있다. 중성자 하나가 빠진 동위원소도 있다. 헬륨-3(³He)이다. 이 동위원소는 1939년 발견됐지만 근래에 널리 알려졌다. 여러 나라의 달 탐사 경쟁이 불붙으면서 헬륨3은 우주시대의 미래 에너지원으로 떠올랐다.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융합해 엄청난 전기에너지를 얻고자 한창 개발 중인 핵융합 기술이 더 발전하는 먼 미래에, 헬륨3이 삼중수소를 대신할 이상적 우주자원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계산법을 따르면 30~40t의 헬륨3이면 미국의 한 해 전력소비량을 다 댈 수 있다고 한다.
아쉽게도 헬륨3은 지구에 거의 없다. 달 표면엔 수백만t이나 묻혀 있다. 태양풍을 타고 날아오는 헬륨3 입자들이 대기권 없는 달에 그대로 쏟아져, 티탄철석 입자들 사이에 대량으로 포집돼 있다. 그러니 달 공장을 세워 헬륨3만 뽑아 가져와 핵융합 발전에 쓸 수 있다면 지구 행성의 에너지 위기도 풀 수 있다고 한다. 헬륨3에 대한 관심은 우리 과학계에서도 일어왔다. 지질자원연구원의 2004년 보고서는 달 탐사 경쟁에 담긴 속셈이 결국 ‘헬륨3 자원 선점’에 있다며 우리도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촉구한다.
헬륨3의 활용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냉정한 분석도 많다. 한 연구자는 “헬륨3 핵융합 반응을 제어할 기술은 반세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핵융합 전문가들의 전망”이라고 전한다. 그렇더라도 헬륨3은 ‘왜 달에 가는가’라는 물음에 응대하는 달 탐사 계획의 열쇳말이 되고 있다. 언젠가 쓰일지 모를 우주자원 확보는 요즘 우주 개발의 목표다. 며칠 전 카이스트 연구팀이 무인탐사용 달 착륙선의 개발 모형을 우리 기술로 제작했다. 헬륨3을 가져올 탐사선의 개발이 최종 목표라 한다. 헬륨3이란 말이 국내에서도 더 자주 쓰일 것 같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때리면 반칙, 20년 형동생의 약속대련 논쟁 [유레카] 때리면 반칙, 20년 형동생의 약속대련 논쟁 [유레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24/53_17060843105029_20240124503317.jpg)


![[사설] 딥시크 충격, 한국도 빠른 추격으로 기회 살려야 [사설] 딥시크 충격, 한국도 빠른 추격으로 기회 살려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31/20250131502173.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