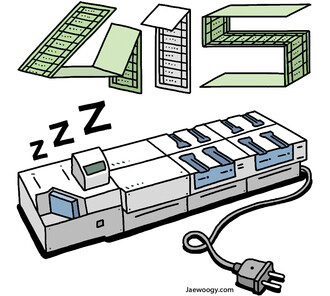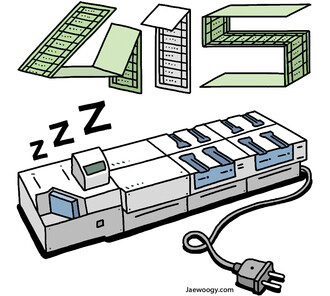전자개표 시대를 연 ‘투표지 분류기’는 2002년 6월13일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유권자의 선택이 담긴 투표지를 투입하면 광학센서가 기표 내용을 인식해 후보자별로 적재함에 모아, 그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기표 오류 등으로 미처리함에 쌓인 투표지는 개표 요원이 직접 눈으로 검표·분류한다.
당시 분당 220장, 시간당 1만3200장의 처리 속도를 갖춘 분류기 973대는 1948년 이후 익숙한 개표장 풍경을 확 바꿨다. 개표 요원들이 밤을 지새우며 하나하나 손작업으로 진행한 정당별·후보자별 투표지 분류·합산 작업을 대체했다. 그 뒤 선거를 거듭하면서 분류기는 진화해 왔다. 2014년 6·4 지방선거 땐 분류 장치, 제어용 컴퓨터, 개표 결과 출력 프린터를 한데 묶은 일체형이 등장했다. 고해상 광학센서를 탑재해 분당 340장, 시간당 2만400장의 투표지를 분류했다.
전자개표에 자신감을 얻은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10월 한국형 전자투표 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을 개발했다. 투표소에 직접 가서 버튼을 누르는 기표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휴대폰으로도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선관위는 현재 기업 주주총회는 물론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도 케이보팅을 서비스한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 같은 공직선거엔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엄두도 못 낸다. 코로나19로 확진자, 격리자,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하자 이를 막을 대안으로 전자투표가 거론됐지만 선관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해킹 위험, 원격투표 때 명의도용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도입 18년을 맞는 분류기조차 여전히 전산 조작 의심에 시달리고 있는 탓이다.
선관위는 2002년 분류기를 처음 도입할 때 ‘전자개표, 전산개표’라고 홍보한 게 실책이었다며 공식 명칭을 투표지 분류기로 바꿨다.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 여러 단계의 감시·검증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홍보 만화, 동영상도 만들어 배포했다. 2014년엔 검찰에서 분류기 시연까지 했고 30여차례 관련 소송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수단체와 극우 논객들은 지난해부터 4·15 총선에서 분류기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고 최근 ‘전자개표 반대 청원’에는 21만여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뜻밖의 이유로 투표지 분류기가 4·15 총선에서 부분적으로 작동을 멈추게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비롯해 무려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48.1㎝에 이른 탓이다. 최대 34.9㎝, 24개 정당까지 처리할 수 있는 분류기가 무용지물이 됐다.
신승근 논설위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