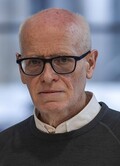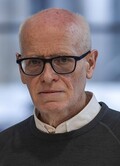로버트 페이지 ㅣ 영국 버밍엄대 사회정책학과 교수
토마 피케티의 최근 책 <자본과 이데올로기>(2020)는 불평등한 경제와 사회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이데올로기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케티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노동자나 무산자들의 이익보다 자본가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지 탐구했다. 그는 이전 저서 <21세기 자본>(2014)에서는 더 큰 평등과 진보적인 과세체계를 요구하는 사회민주적 이상으로 돌아가는 ‘이념적 전환’을 주장했다.
마거릿 대처는 자유시장 이념을 20세기 후반 영국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만들었다. 1979년 영국의 첫 여성 총리로 당선된 대처는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이념에 도전했다. 그는 세금을 깎고 노조를 개혁하고, 공공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다. 1951~1979년 작동했던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를 공격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보수당이 17년이나 집권했다는 사실에 동요될 만했지만, 대처는 흔들리지 않았다.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대처와 그의 참모들은 복지국가가 득보다 실이 많아,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국가의료서비스 분야에 경쟁이 없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사회보장제도는 청년들이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이 일터로 갈 수 있게 하는 도전적인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 분야를 개혁하려 한 대처의 시도가 성공했는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그가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이념적 승리를 거둔 것만은 틀림없다. 그의 재임 기간 중, 복지 분야에는 사적이고 자발적인 영역이 매우 늘었고, 국가 공급 측면에서는 선택과 경쟁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됐다. 특히 1997~2010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이 집권한 새 노동당 정부 때도 대처의 개혁을 되돌리거나 이른바 ‘대처리즘’에 도전하려는 노력이 제한적이었다. 블레어는 대처리즘과 구분하기 위해 ‘제3의 길’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대처의 유산에 도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오랜 기간 집권하지 못했던 보수당은 대처리즘으로부터 거리를 뒀다. 복지 분야에 대한 대처의 가혹한 개혁이 1997~2010년 보수당의 선거 패배 요인이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과 테리사 메이가 연이어 총리가 됐지만, 이들은 자신을 ‘개입주의자’로,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길 원하는 ‘일국 보수주의자’라고 규정했다. 2019년 보수당 당수로 총리가 된 보리스 존슨 역시 자신을 ‘일국 보수주의자’라고 선언하며 이런 흐름을 따르고 있다.
이런 이념적 변화가 대처리즘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대처리즘의 가혹한 면을 완화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보수당 총리였던 캐머런과 메이의 엄격한 경제정책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짓게 했다.
존슨 정부는 대처리즘과 결별할 수 있을까?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 리즈 트러스 국제통상장관 등 존슨 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처리즘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것을 보면, 대처리즘은 현 정부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쉴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과연 이 정부가 긴축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국가 개입과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일단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을 시작하면, 자유시장 이념으로 금세 되돌아갈 수 있다.
보수당이 예전과 달리 북부 잉글랜드 노동 계층의 지지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일국 보수당’의 깃발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정말로 영국이 ‘포스트 대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결과 사회민주주의 원리들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다. 심대한 이념적 전환은 아니더라도, 실제 대처리즘의 후퇴를 의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