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이 더 아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누구도 대들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는 누구도 그날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마치 아카시아 숲에 비밀을 묻어두고 나온 것처럼. 그 숲을 지나 세상에 나오고 보니, 사람들은 모두들 더 큰 일만 말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더 크다고 하는 것들.
이상헌 ㅣ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덥다. 산자락 언저리에 자리해서 늘 서늘한 이곳도 찜통이다. 바짝 날 세운 햇볕이 피부와 땅을 찔러댄다. 기어코 쩍 하고 벌어진 틈을 만들겠다며 필사적이다. 추워지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니, 유럽에서는 땡볕에도 바이러스가 맹렬하다. 더위를 못 견뎌 바깥으로 몰려나온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탓이라고 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다. 여름휴가가 없는 세상은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만큼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벌금을 매기고 운전사가 소리를 쳐도 마스크 한장이 가져다주는 불편함을 거부하고도 당당한 사람들이 있다. 어느 더운 여름날, 나는 버스를 내리면서 “조그만 일에 분개”한다. 그래서 더 덥다.
더우면 매미 소리가 들린다. 내가 사는 곳은 매미가 없다. 하지만 독기 품은 햇볕에 살아 있는 것들이 모두 지쳐가서 숨소리마저 버거운 오후, 실 같은 바람 하나가 옅은 구름 하나를 겨우 밀어낼 때, 매미 소리가 들린다. 어릴 적 징그럽게 더웠던 날에 들었던 소리다.
10살 정도 되던 때였다. 늘 그랬던 것처럼, 여름에는 시골에 갔었다. 개울에서 물놀이하다가 물때가 되면 바다로 나갔다. 고둥, 게, 새우 등 닥치는 대로 잡아 오면, 할머니는 저녁거리를 해 왔다며 조그만 접시에 담아 저녁상 모퉁이에 올려주셨다. 모두 칭찬했지만, 아무도 먹지는 않았다.
낮은 개천에서 놀자면 크고 작은 돌로 물을 막아야 했다.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리면 목 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물은 깊어졌다. 너나없이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딴에는 계획과 조정이 필요했다. 나이가 많고 거친 남자애가 나섰다. 요령도 좋고, 필요한 장비도 ‘수완’을 발휘하여 슬쩍 훔쳐 왔다. 큰 돌이 필요하면, 논물 대려고 막아둔 돌을 거침없이 빼 왔다. 논 주인이 알아채고 한바탕 야단을 치면, 그는 별일 없다는 듯이 그 돌을 빼다가 제자리에 되돌려 두었다. 논 주인이 더 따지면, 그는 아예 눈을 흘겨댔다. 이렇게 그는 우리의 ‘지도자’이자 ‘영웅’이 된 것이다.
그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커졌다. 누가 뭘 해야 되고, 누가 언제 물놀이를 할 수 있는지도 정했다. 다그치기도 하고 야단도 쳤다. 자신은 물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홀딱 벗기도 하고, 구멍 숭숭한 팬티만 입고 개헤엄을 배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레이저 광선처럼 날씬하고도 멀리 침을 뱉는 연습에 열중이었다. 그와 눈이 마주치면 우리는 박수를 쳤다.
매미가 유난히 많이 울던 날이었다. 개울의 물 깊이가 낮아졌다. 돌이 무너진 탓이었다. 그는 모두를 불러 모았다. 개울 옆, 일본인들이 심었다는 아카시아 숲으로 갔다. 숲 안은 서늘했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그를 보자 우리는 한기마저 느꼈다.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다짜고짜 그는 팬티를 다 벗으라고 했다. 다들 멈칫하자, 그는 아카시아 줄기를 다듬어 만든 작대기를 땅에 내려쳤다. 모두 벌거숭이가 되었다. 물속에서 너나없이 벗고 놀았지만, 지금은 오줌 지린 팬티를 들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자니, 공기를 가로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매질이었다. 엉덩이도 종아리도 아닌, 공포에 바싹 쪼그라든 고추였다. 매년 조금씩 커진다고 낄낄대던 곳에 빨간 선이 그려졌다. 신체의 ‘비밀’을 알 듯 모를 듯 한 나이였지만, 아픔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섰다. 부끄러움이 더 아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눈망울은 붉어졌지만,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공기마저 텅 비어버린 듯, 적막하고 공허했다. 숲속을 내려다보던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매미만 죽을 듯이 소리 내고 있었다. 매미는 울지 않는다. 그저 한없이 소리를 지를 뿐이다.
발갛게 부어오른 부위를 손에 쥐고 개울 속에 오랫동안 앉았다가 집에 가까워져 오니, 그제야 눈물이 났다. 할머니를 보자 눈물이 터졌다. 이유를 묻는 할머니에게는 맞았다고만 했다. 할머니는 어딜 맞았는지를 묻지 않았다. 대신 고구마를 삶아주었다. 할아버지는 ‘남자가 그런 일로 우나’라고 했다. 그다음 날부터는 나는 물놀이를 가질 않았다. 옷 챙겨 입고 홀로 자유로운 갯가에 갔다. 그곳에는 매미도 울지 않았다.
나는 워즈워스의 벅찬 시구절, “저 하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를 믿지 않는다. 어릴 적 가슴이 뛴 적도 없고, 무지개를 닮았던 아카시아 숲의 서늘한 기억만 남았다. 그래서인지 나는 워즈워스가 청년 혁명가로서 프랑스혁명을 열렬히 옹호했다는 것에 심통스러워한다. 혁명의 이유를 공감하기보다는 혁명의 열기에 가슴이 뛰었을 것이다. 그가 곧 꼰대 같은 보수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에 더 수긍한다.
이렇게 남을 타박이라도 해야 속이 편한 연유는 따로 있다. 왜 나는, 아니 십여명이 되었던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한명씩 아프게 맞았어야 했을까. 같이 도망이라도 갔으면 될 일이었다. 누구도 대들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는 누구도 그날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마치 아카시아 숲에 비밀을 묻어두고 나온 것처럼. 그 숲을 지나 세상에 나오고 보니, 사람들은 모두들 더 큰 일만 말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더 크다고 하는 것들. 나의 조그만 고추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김수영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옹졸’한 것이고 남자가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반항은 사소했다. 그 아카시아 숲 사내의 비극적인 삶을 전해 듣고, 나는 잠시 놀라는 척만 했다. 마치 내가 그때 마음속으로 퍼부었던 저주가 수십년 동안 매미의 목청이 되어 세상을 깨어나게 한 듯 뿌듯해했다.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는 것, 알고 있다.
시인 김수영이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하고 일갈할 때, 그 특정 부위를 포함하여 나의 모든 신체 부위는 쪼그라들었다. ‘큰일’에 분개하려 했다. 그렇다고 ‘조그만 일’은 그저 사소하다는 뜻은 아닐 테다. 시인의 구차하리만큼 사소한 생활투쟁이 입증하는 바다. ‘큰일’로 ‘조그만 일’을 막아서도 안 된다. ‘조그만 일’은 어떤 이에게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나서 자신을 타박했다. 그런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 자신을 미워하면서 그가 정작 설렁탕집 주인에게도 미안했는지 궁금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얘기다. 모래, 바람, 먼지, 풀보다도 작은 얘기를 또 기억해내고 오늘에야 적어두는 것은, 덥기 때문이다. 여긴 매미도 없는데, 너무 덥기 때문이다.
(인용 구절은 모두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 왔다.)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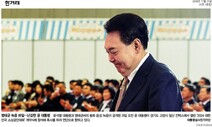

![다시 전쟁이 나면, 두 번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연철 칼럼] 다시 전쟁이 나면, 두 번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연철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027/20241027501439.jpg)
![이미 예견됐던 ‘채식주의자’ 폐기 [한겨레 프리즘] 이미 예견됐던 ‘채식주의자’ 폐기 [한겨레 프리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028/20241028500119.jpg)
![‘지지율 필연적 하락의 법칙’과 윤 대통령 [유레카] ‘지지율 필연적 하락의 법칙’과 윤 대통령 [유레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028/202410285024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