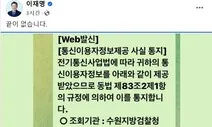1975년 4월8일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사형 등을 확정하는 판결문을 읽고 있다. <보도사진연감>
박근혜 ‘인혁당 두개의 판결’ 발언 논란
1·2차 인혁당사건 어떻게 다른가
1·2차 인혁당사건 어떻게 다른가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두 가지다. 1964년 1차 사건은 ‘국가 변란’을 꾸미려 인혁당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1974년 2차 사건은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이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인혁당 재건위가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것이다.
1차 인혁당 사건은 ‘한일협정 굴욕 외교’와 관련이 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협정 체결에 반발하는 학생 시위로 위기를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1964년 6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검거령을 내렸다. 중앙정보부는 같은 해 8월14일 학생과 언론인 등 41명을 검거하고 “북한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혁당을 조직해 국가 사변을 기획했다”고 발표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펴낸 <인혁당 사건, 그 진실을 찾아서>를 보면,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전창일씨는 “(중정이) 한 학생 집을 수색하면서 발견된 일기장에 선배들에 대한 존경 등의 내용이 적힌 것을 단서로, 일기장에 적힌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을 색출해 검거했다”고 회고했다.
당시 41명이 구속됐으며, 16명은 수배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13명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1965년 9월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 등 4명이 사건 처리를 두고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 사표를 내기도 했다. 이 사건이 1차 인혁당 사건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사건은 1974년 발생한 2차 인혁당 사건으로, 흔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불린다. 박 전 대통령이 1972년 10월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선포하자 다음해부터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됐다. 1974년 1월에는 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개헌을 청원하는 사람을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대통령긴급조치 1호가 선포됐다. 같은 해 4월3일에는 유신반대 운동에 나선 민청학련 관련자 검거의 일환으로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됐고, 중정은 4월25일 민청학련의 배후 조종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가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구속된 도예종씨 등 8명은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나머지 15명은 징역 15년~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